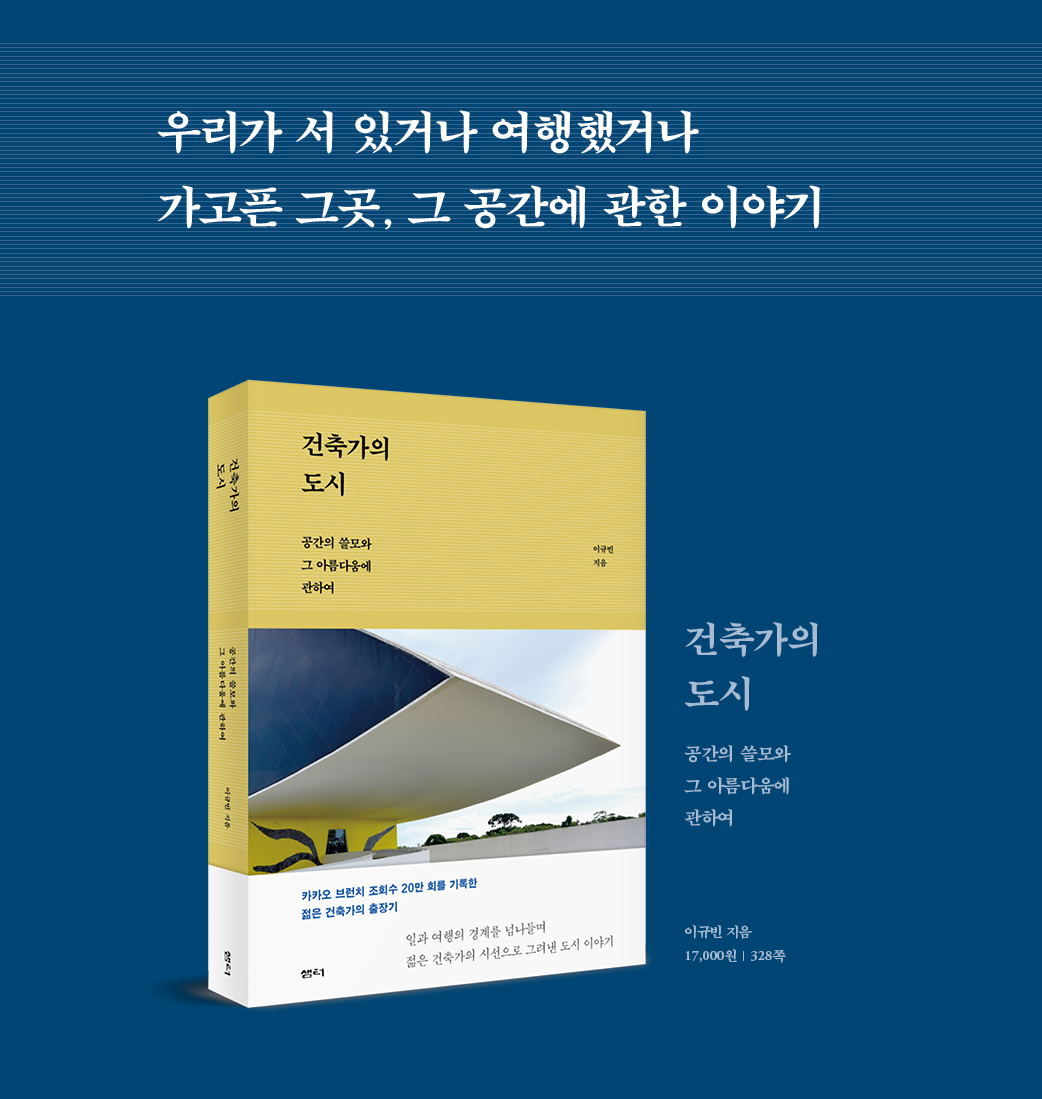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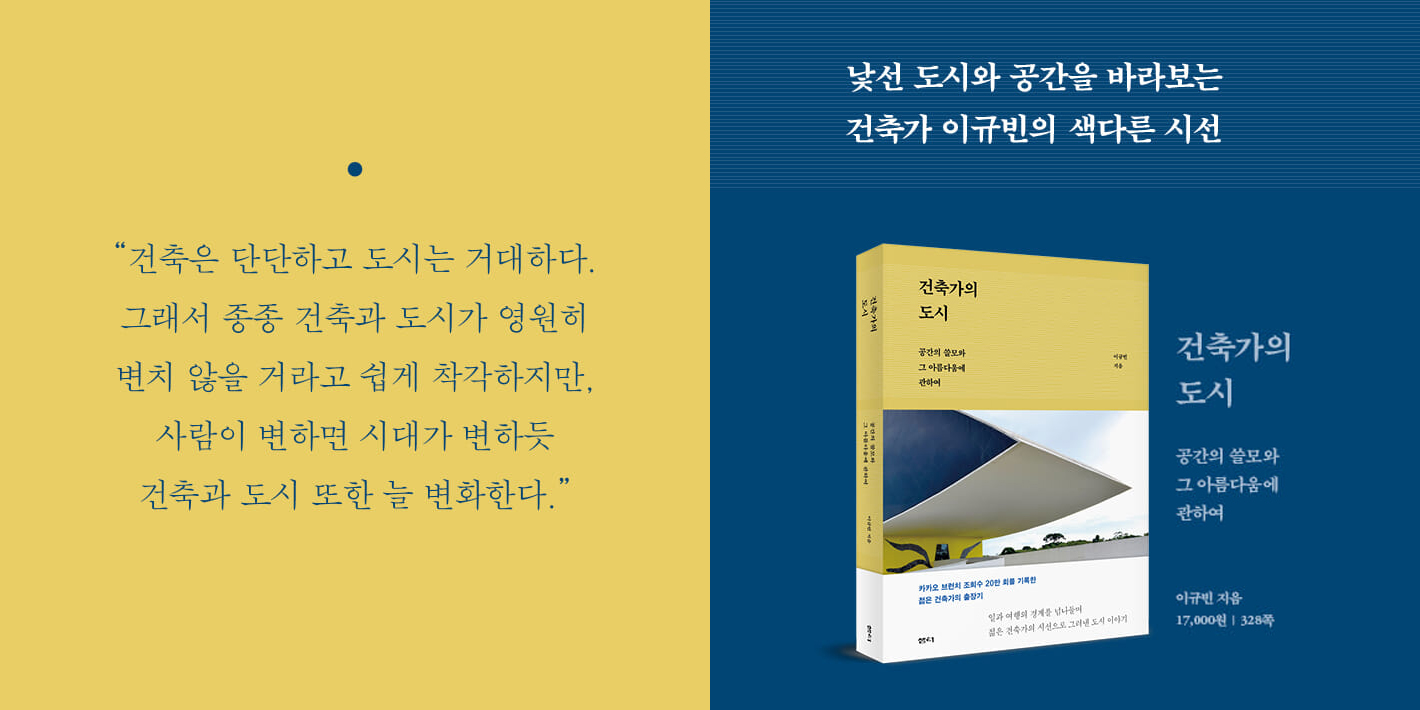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만들며 그렇게 살아간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했던가.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며 옷깃을 스치는 수많은 이름모를 사람들 조차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먼 이국땅에서 여행을 하며 만났던 사람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인연일까... 내가 그곳에 가게되고 또 그곳에 그 사람이 있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고, 떠들고...
짧다고 생각하면 너무 짧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만남이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 경험해보는 여행지에서의 새로운 문화와 수많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그곳 사람들과 만나서 했던 대화들, 그들의 생각들이야말로 여행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이지 않을까.
올해 초, 개인 포트폴리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내 명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물론 내가 아직 사업을 하는 사람도, 회사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지만 왠지 하나쯤 있으면 좋을것 같았다.
수많은 디자인을 생각해보고, 프린트로 인쇄도 해보며 결국 이와같은 디자인으로 결정되었다.
전화번호도, 주소도, 이메일도 없는 말 그대로 이름만 있는 '네임카드'인 셈이다. 앞면에는 사진한장이, 그리고 뒷면에는 내 이름으로 된 홈페이지 도메인이 써있는게 전부인 심플한 명함이다.
간단한 명함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나름대로의 생각을 담았다. 앞면의 사진은 대학생활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학교 디자인 스튜디오 내 자리의 사진이다. 정리도 안된 책상이며 벽에 덕지덕지 붙은 도면들이 더러워 보이지만 나를 소개할 수 있는 단 한장의 사진으로 이 사진을 선택했다.
사진 속 내 자리는 빈 의자로 남겨뒀는데, 그 빈 자리의 주인은 바로 지금 명함을 건네주는 나이기때문에 내 얼굴을 일부러 빼버렸다.
명함 용지를 선택하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크래프트지로 결정했다. 칙칙한 황토빛 종이가 어딘지 이상해보이지만 사실 건축 모형을 만드는 재료로 내가 가장 즐겨 사용했던게 바로 이 크래프트지다. 특히나 까끌까끌한 표면이 손에 닿는 그 느낌이 참 좋아서 이렇게 만들었다.
올해 여름 인도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며 가방에 명함을 30장 정도 챙겼다.
한달간의 여행을 계획했으니 적어도 하루에 한명씩은 친구를 만들고 이 명함을 주며 나를 소개해야겠다는 나름 야심찬 계획이었던것 같다. 물론 30장을 모두 쓰고 오지는 못했다.
여행을 하며 나를 소개할때 공책을 쭉 찢어서 내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는것 보다는 이렇게 나름 기념품이 될 수 있는 명함이 하나 있다는게 의외로 괜찮은 아이디어였던것 같다.
내 이름은 이규빈이다. 영어로는 kyubin Lee로 표기한다.
한국사람들이야 그렇게 어려운 발음이 아니겠지만 여행을 하다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발음을 힘들어 한다.
한글자 한글자 발음을 말해주는게 번거로워서 유럽을 다닐때는 그냥 이름을 Q(kyu)라고 소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명함이 있으니 내 소개를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알파벳으로 써있는 내 이름을 보여주며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설명해주면 곧잘 따라하곤 하더라.
몇번 따라읽으며 웃음짓는 사람들을 보며 가져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외국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두가지다.
우리가 외국인들의 얼굴만 보고 나이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 처럼, 그들 역시 한국 사람의 얼굴만 보고는 쉽게 나이를 맞추지 못한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 나이를 말해주면 놀라는 사람들도 많았다.
학생이라고 나를 소개하면 대개 그다음 질문은 무슨 과목(subject, major)을 전공하는 지를 묻는다.
하지만 건축학이 정확히 어떤 학문인지 한국사람들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마당에 외국인들에게 Architecture라고 한단어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두리뭉실한 감이 있다.
명함 속의 사진이 내 스튜디오이고 나는 건축물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거리며 알아듣는다. 사람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흥미를 가졌던게 바로 이 사진이었던것 같다.
간단한 인사와 소개정도만 하고 지나친 사람도 꽤 많았지만, 짧게는 한시간씩 길게는 몇일동안 만나며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에 남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내가 그들의 문화에 대해 궁금해 하는 만큼,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다들 참 많더라. 이야기를 계속 할 수록 점점 더 심오한 질문까지 받게 되는데 한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한 질문으로 화제가 넘어가게 되면 대화가 힘들어진다. 한글로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내가 알고있는 지식도 얕은데 그걸 영어로 설명하려니 땀이 삐질삐질 흐른다.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면 언젠간 꼭 한번 들리겠노라 약속을 하곤 한다. 물론 빈말일수도 있겠지만 어쨋든 그런 사람들에게 나역시 한국에 오면 내가 서울에서 가이드가 되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해준다.
말로만 끝나는 약속이라면 의미가 없겠지만 내 명함을 주며 이메일 주소를 함께 알려주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메일을 써주고, 간단한 이야기들을 한국에 돌아온 후에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가볍게 스쳐지나간 한 여행자로 기억에서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그들과 친구가 되고 더 긴 인연을 만들어 나가는 건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게 아닐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많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들에게는 한국을 기억하고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하나 쥐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진다.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귀여운 인형이 달린 핸드폰 키 홀더를 선물하곤 했는데 명함도 함께 주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라 한다.
나름 디자인을 신경썼다는걸 알아주기라도 하는듯, 명함이 예쁘다며 한장씩 달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명함은 형식적인 작은 종이 조각이 아니라 추억을 담는 좋은 선물이 된다.
돌아와서 여행을 추억해 보며, 이런 생각을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후회도 가끔 한다.
유럽여행중 롱샹성당을 가는 기차에서 만나 건축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히로시라는 일본인 친구가 생각이 난다. 런던 AA 스쿨에서 유학을 하며 공부를 하고 있다던 히로시는 참 말이 잘 통하던 친구였는데 결국 지금은 연락이 끊어져버렸다. 그때 명함이 있었더라면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낼 수 있었을텐데...
여행은 계속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앞으로 만나겠지.
다음 여행에서는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준비해보려한다. 명함과 함께 그날 함께 찍은 사진을 즉석에서 쥐어준다면 아마도 더 오랬동안 나를 기억하고 그날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을까.
잠시동안의 일탈로 끝났을지도 모를 여행이지만,
몇년이 지나도 내 머리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떠올리면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이유이다.
'여행 > '09 인도배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그림 그리기 좋은 도시, 푸쉬카르 가트에 앉아... (22) | 2009.11.17 |
|---|---|
| 인도에서 운전하는건 미친짓이다? 릭샤를 직접 몰아보다 (24) | 2009.11.10 |
| 채식도시 푸쉬카르, 고기 없이도 너무나 맛있는 요리들 (24) | 2009.11.04 |
| 메와르왕조의 슬픔이 담긴 한폭의 수채화, 치토르가르 (12) | 2009.11.02 |
| 인도사람들의 과잉친절, 과연 진심일까 의심했던 나 (11) | 2009.10.30 |
| 악명높은 에어인디아의 기내식을 깨끗이 먹어치우다 (24) | 2009.10.22 |
| 인도의 별, 우데뿌르에서 여유를 스케치하다 (18) | 2009.10.16 |
| 마운트 아부는 언제나 신혼여행 중 (8) | 2009.10.12 |
| 끝없는 자신과의 싸움, 낙타로 인도의 사막을 건너다 (20) | 2009.10.09 |
| 아! 제썰메르, 사막위의 아름다운 황금빛 모래성을 만나다 (22) | 2009.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