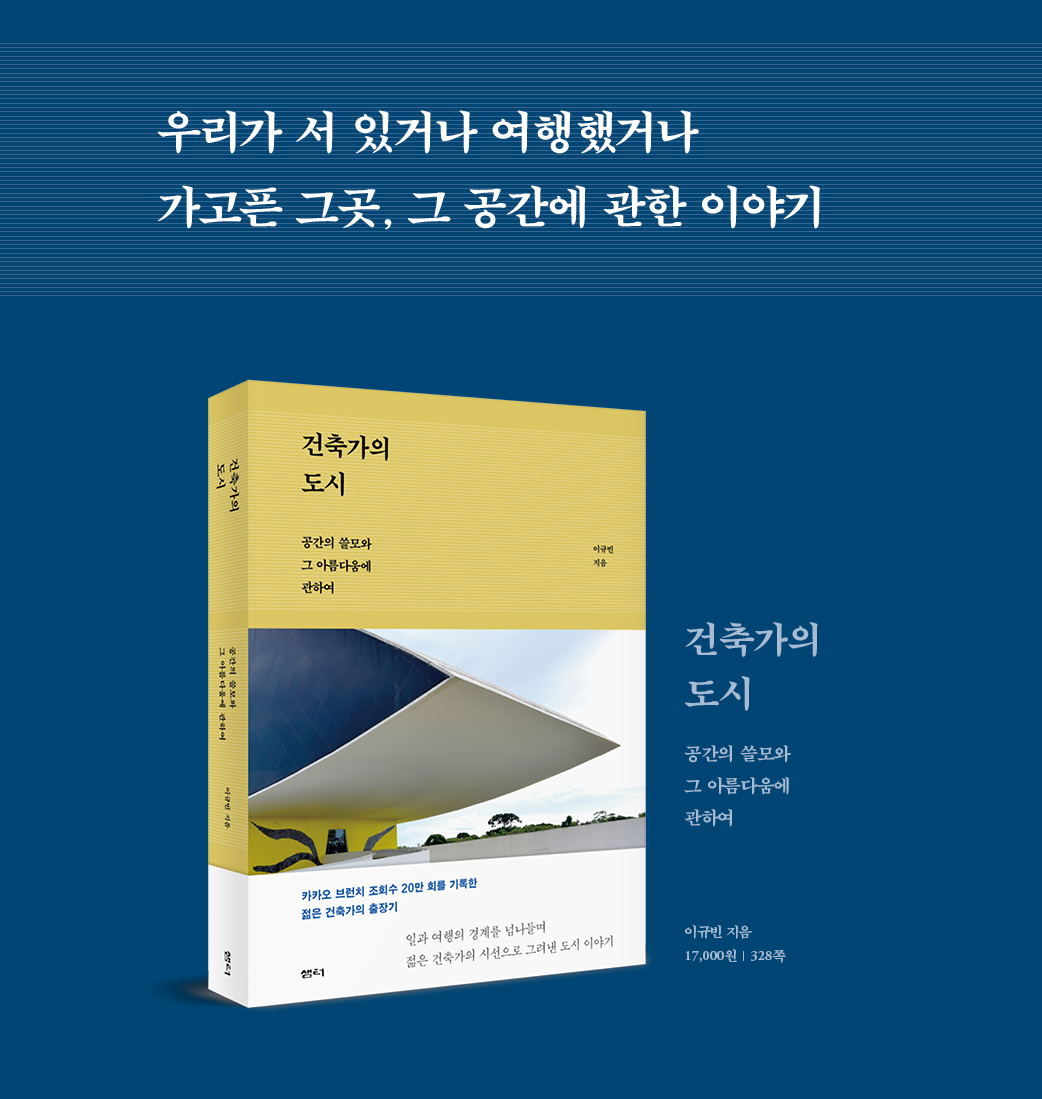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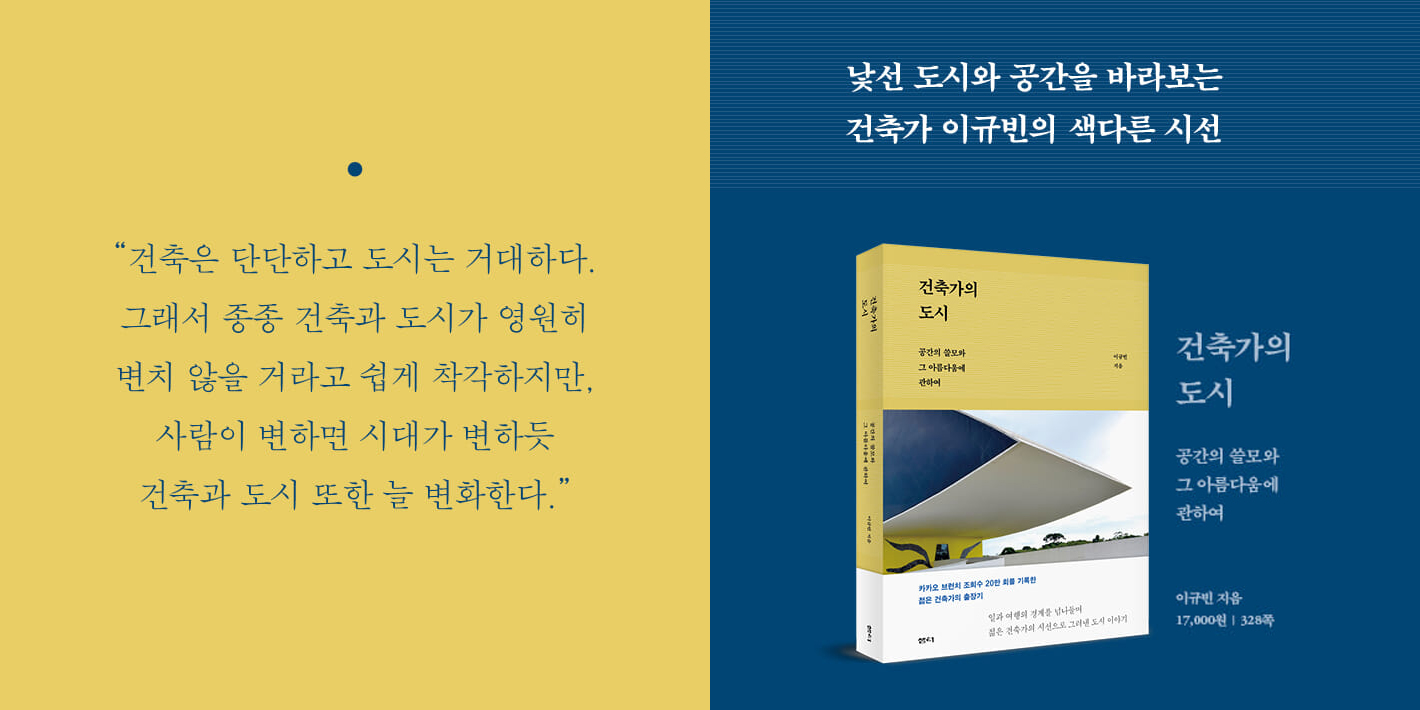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아침 7시, 졸린눈을 비비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바라본 하늘은 다시 한번 나를 실망시켜버렸다. 유럽에서의 둘째날 역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시작되었다. 다행히도 첫날만큼은 호텔에서 잘 수 있었기에 아침은 뷔페식으로 거하게 먹을 수 있었다.
간만에 배불리 먹고 밖으로 나왔으나 여전히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 도대체 비싼 돈주고 사온 내 썬그라스는 언제쯤이나 필요하게 될런지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아보인다.
매주 금요일은 암스테르담 옆의 조그만 도시인 알크마르(Alkmaar)에서 '치즈시장'이 열리는 날이다. 비가오는 날에도 시장이 열릴지는 의문이었지만 일단 알크마르행 열차에 지친 몸을 맡겼다.
암스테르담에서 알크마르까지는 약 45분정도 걸린다. 열차밖으로 보이는 양과 소들. 유럽의 이국적인 전원은 아름다웠으나 이놈의 하늘만은 도저히 예뻐해줄 수가 없다. 알크마르까지 가는 그 짧은 시간동안에도 비가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다.
알크마르는 내가 예상했던것 보다 꽤 큰 도시같았다. 운하와 자전거도로가 시내 곳곳에 얽힌 암스테르담보다는 차도가 잘 닦여있는 알크마르의 모습은 훨씬 정돈되어 있는 것 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이른 시간이고 비가오고 있어서 그런지 거리에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정표를 따라서 치즈시장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사람들도 많아지고 흥겨운 노랫소리도 들려온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는 옛날 전통방식 그대로 치즈를 나르고 무게를 재며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실 이곳에 온 이유는 '치즈 시장'을 보고싶어서 라기보다는 '치즈'가 보고싶어서 였다. 유럽의 치즈라면 아무래도 톰과제리에서 제리가 먹던 구멍이 숭숭뚤린 치즈를 생각해서 였을까.
시장 한켠에 마련된 치즈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주시는 시식용 치즈를 한입 맛보고는 그자리에서 바로 점심때 빵과 함께 먹을 치즈 3조각을 사버렸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는 것도 모르고 나름 낭만을 즐기겠답시고 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운하 옆 벤치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그게 실수였다.
치즈와 모닝빵 3개라는 궁색한 점심을 채 다 먹기도 전에, 가랑비는 곧 장대비로 바뀌어 결국 우리는 건물 지붕아래로 숨어야 했다. 미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짐들은 안쓰럽게 비를 쫄딱 맞아야한 했다.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들른 곳은 '꼬잔디크 역'에 위치한 '잔세스칸스', 바로 풍차마을이다. 네덜란드의 객관적인 상징인 풍차와 튤립. 비록 튤립은 꽃시장에서 본 씨앗이 전부지만 잔세스칸스에서 본 풍차들의 모습을 후에 떠올릴 수 있다면 그래도 네덜란드에 가봤다 라고 어디가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추억이라면 추억이라 할 수 있는 이틀간의 여정을 정리하며, 비내리는 암스테르담 중앙역을 뒤로한 채 우리는 벨기에 브뤼셀 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3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브뤼셀의 첫인상은 나를 다시한번 가슴뛰게 만들었다.
여행계획을 세우면서, 사실 브뤼셀은 빼버릴까 하는 생각도 했었다. 벨기에가 워낙 작은 나라인데다 특별한 볼거리도 없다고 다들 말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만약 벨기에를 들르지 않았더라면 아마 평생을 두고 후회했을 지도 모른다.
우리는 브뤼셀 중앙역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인 한분의 도움으로 쉽게 그랑플라스까지 찾아갈 수 있었다.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광장'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 '그랑플라스'. 좁고 아기자기한 골목을 지나가는 동안 벨기에의 명물 '와플'과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을 쉽게 마주칠 수 있었다.
골목이 끝남과 동시에 내 눈앞에 펼쳐진 그랑플라스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내 가슴속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화려한 건물들과 아기자기한 조그만 레스토랑들, 그리고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북적임, 그 활기. 그랑플라스의 매력에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다.
네덜란드에서의 이틀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 때문인지, 벨기에는 너무나 편안하고 풍요롭게만 느껴졌다.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시간은 얼마 없지만 그래도 이왕 온거 벨기에의 대표 음식은 맛보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와플도 사서 한입씩 맛보고, 초콜렛도 사고 하면서 짧은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
오늘의 저녁식사는 야간열차를 타기 전 간단하게 샌드위치를 만들어먹기로 했다. 미리 암스테르담에서 올 때 장을 봐 온걸 가지고 그랑플라스 바로 뒷골목의 분위기 좋은 노천카페에 앉아서 벨기에를 대표하는 맥주인 '스텔라'를 한잔씩 시켰다.
맥주한잔씩 달랑 시켜놓고, 그자리에서 빵에다가 햄과 야채를 넣고 궁상맞게 저녁식사를 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겐 조금 웃겨 보였을지 모르지만 아무렴 어때! 우리는 돈없고 불쌍한 배낭여행객인데 뭐^^;
한창 분위기에 취해 오랜만에 즐기고 있는 때마침, 골목을 따라 걸으며 연주를 하던 거리의 예술가가 내앞에서 공연을 해주기 시작했다. 에이~ 기분이다 하면서 무려 4 €나 쥐어주고 말았다.
브뤼셀에서의 잠깐의 행복했던 시간을 뒤로한 채 뮌헨으로 가는 야간열차를 타기 위해 서둘러 midi 역으로 향했다. 뮌헨으로 가는 야간열차는 파리 nord 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브뤼셀에서 파리까지는 우리나라 ktx에 해당하는 고속열차 THALYS를 타고 가야한다. 우리의 난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막상 THALYS에 타고보니 우리자리에는 이미 사람이 있었다. 표도 좌석번호와 일치하기에 단순히 표를 끊어줄때 자리를 헷갈려서 직원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표는 오늘날짜 표가 아니라 내일날짜가 쓰여있는 표. 우리는 억울하게도 무임승차라는 죄목을 뒤집어쓰고는 1인당 25 €씩이나 벌금을 내야했다. 파리에서 환불을 받으려 했으나 우리가 도착한 11시경에는 이미 창구가 모두 문을 닫은 상태.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야간열차에 몸을 실었다. 다행히 컴파트먼트 빈자리가 있어서 우리모두 비교적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뭔가 정신없고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 하루였다. 뮌헨으로 가는 야간열차의 덜컹거리는 리듬에 몸을 맡겨 잠을 청한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
야간열차 예약비 23.20 €
초콜렛 7 €
맥주 3잔 10.20 €
공중화장실 0.5 €
거리의 예술가에게 적선 4 €
탈리스 열차 벌금 25 €
total 69.9 €
'여행 > '07 유럽배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물의 도시 베네치아, 알록달록 예쁜 마을 부라노 (8) | 2008.07.02 |
|---|---|
|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그 심장을 찾아, 오스트리아 빈 (6) | 2008.06.27 |
| 낮과 밤의 두얼굴, 두가지 매력의 비오는날의 프라하 (2) | 2008.06.26 |
| 유럽여행중, 야간열차에서 쫓겨난 사연 (4) | 2008.06.24 |
| 어린시절 동화책속에만 있던 꿈의 마을을 찾아서, 독일 로텐부르크,뉘른베르크 (15) | 2008.06.24 |
| 자연속에 공존하는 모차르트의 도시,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0) | 2008.06.23 |
| 맥주의 도시, 여행자의 낭만을 찾아서, 독일 뮌헨 (6) | 2008.06.21 |
| 암스테르담 홍등가 이야기 (2) | 2008.06.21 |
| 작지만 아름다운 운하의 도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0) | 2008.06.17 |
| 여는글 _30일간 펼쳐질 스무살의 유럽 여행을 시작하며... (2) | 2008.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