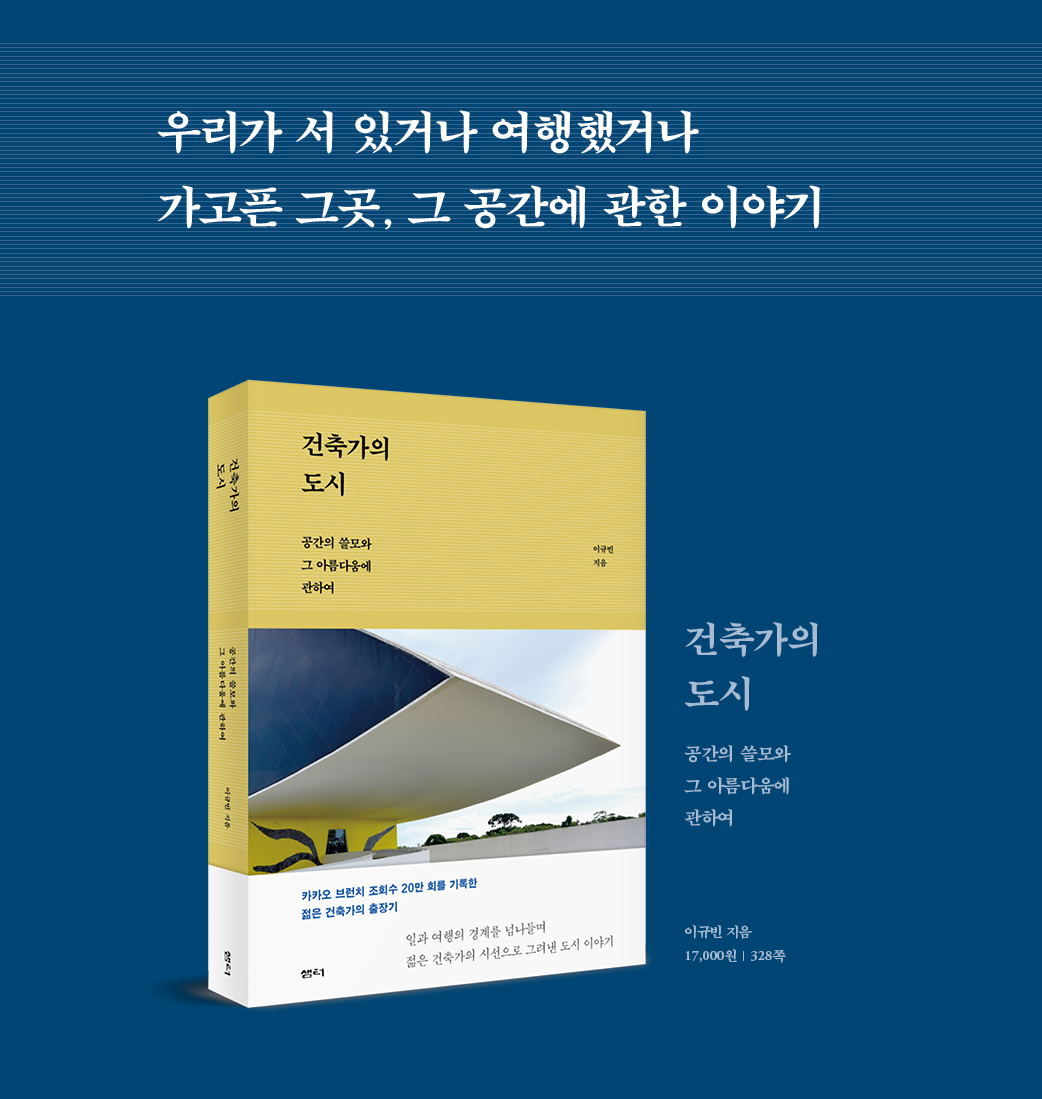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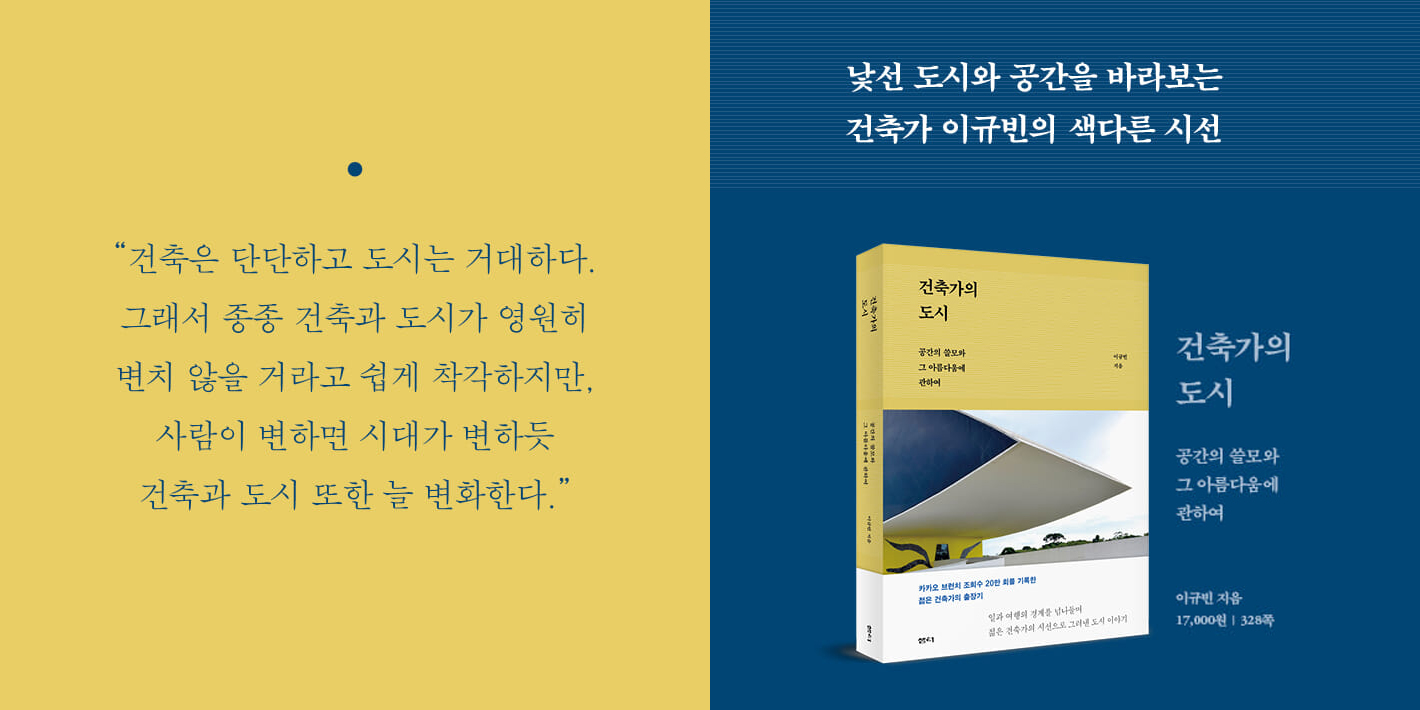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지독한 고독, 혼자만의 사색에 잠겨보는 시간들이야 말로 긴긴 배낭여행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 서울땅에서 이리저리 부대끼며 살다보면 가만히 앉아 고민과 사색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 밖에 없었다. 설령 시간이 지나 그때의 그 고민이 쓸데없는 잡생각이었다는 후회가 들더라도 말이다.
비행기를 타고 잠시 눈을 붙이고 나면 어느새 나는 지구 반대편에 와있는, 그런 세상이다. 두 발로 찬찬히 한발씩 내 딛으며 여행을 하다보면 이따금씩 내가 어디에 있는걸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들기도 하는데, 그럴때면 난 허리를 숙여 내 발을 카메라에 담는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지금 두 발로 밟고 서 있는 바로 그곳의 좌표를 기억하는 일종의 혼자만의 의식인 셈이다.

와장창! 치토르가르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났을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손톱만한 작은 메모리카드에 담겨있던 수많은 사진들, 그 사진들이 없어진다고 해서 내 여행의 추억과 기록이 정말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걸까. 무슨 사진이 담겨있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여행했다면 어련히 찍었을법한 그런 사진들이었음이 틀림 없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무거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똑같은 사진을 계속 담아야할 의무같은건 산산조각난 카메라와 함께 과감히 버려도 좋지 않을까.

똑같은 구도로, 똑같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곳이 아무리 유명한 유적지, 멋진 도시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여행의 기억이 무의미하게 카메라와 머리속에 되풀이 될 뿐이다. 처음 밟아보는 낮선 땅에서 내 몸과 그 곳이 유일하게 맞다는 접점, 그건 분명 내 두 발바닥이다. 울퉁불퉁한 돌자갈길인지, 아니면 고운 사막의 모래사막이었는지... 얇은 슬리퍼 바닥위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느낌이야말로 내가 어디에 있었고,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 몸으로 느끼고 기억하게 만드는 자극이고 매개체다.
내 발을 찍기위해서는 몇초만이라도 그 자리에 꼭 멈춰서야만 한다. 무거운 짐을 지고 바쁘게 움직여야하는 와중에 잠깐 한숨 돌릴 수 있는, 스스로에게 좋은 핑계가 되기도 했다.
인도의 사원이나 가트같은 곳에서는 신발을 신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늘 슬리퍼만 신고 다니다가 문득 신발을 벗은 내 발을 내려다보는데 꼴이 가관이다 정말. 햇볕에 그을린건 고사하고 맨발로 돌아다니며 까만 때가 묻어서 내 발이 아닌것만 같다. 꼭 멋진 작품사진이 아니라도 이 한장의 사진은 그때 내 기분, 그 소리, 그 촉감 모든걸 떠올리기에 충분했다. 그땐 더러운 내 발이 참 부끄러웠지... 하면서 이렇게.
매끈한 대리석바닥 아니면 아스팔트 포장이 일색인 한국에서, 그것도 두꺼운 깔창깔린 신발을 신고다니다 보면 발끝으로 느껴지는 바닥의 촉감이라는데 무색해지기가 쉽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돌길인지, 아니면 포장이 안된 흙길인지. 그렇게 많이 걸어다닌적도 물론 없었지만, 걸으며 발바닥을 쿡쿡 찔러오는 촉감을 그렇게 즐겨본 기억도 또 없지 않을까.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지저분하지만 그순간 난 살아있음을, 여기 내가 서 있음을 비로소 느낀다.
똑같은 구도로만 발을 찍은건 아닌 모양이다. 사진속에 내 모습은 없지만 카메라를 들고 완전히 축 늘어져 앉아있었을 내 모습이 충분히 상상된다. 아마 아그라 칸트역에서 연착된 기차를 기다리다가 지쳐있던 때였지 않을까. 델리보다 더 유난을 떨던 시끄러운 장사꾼들과, 사람들이 가득차 너무 붐볐던 타지마할에서의 하루가 너무 힘들었는지 서있을 기운도 없었던것 같다. 기차역 플랫폼에 털썩 주저앉아 지친 와중에도 발을 찍는걸 잊지 않아준 나에게 너무 고맙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금새 까먹었을테니.
인도를 여행하며 들렀던 가장 작고 외진 마을이었던 오르차. 힘들게 기억해내려 하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과는 확연히 다르다. 뒤죽박죽 마음대로 자라난 잡초들 하며, 포장안된 흙길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지네들. 아마도 오르차 시내에서 간즈빌리지로 들어가는 외진 시골길을 걷고있을때인것 같다. 길 위에 얼마나 벌레가 많던지 피하려고 피하려고 눈에 불을키고 바닥을 보며 걸었는데도 숙소에 돌아와보니 슬리퍼 밑창에 벌레 시체들이 엉켜붙어서 뒤범벅이 되어있었다.
그러고보니 사진속에 바지가 몇벌 없다. 인도 전통의상과는 그다지 큰 관계가 없다던 알라딘바지를 델리에서 구입하고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다른 바지를 입을 생각을 할 수 없었다. 결국 카주라호에서 다른 색깔 바지를 한장 더 사버렸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자주 입을줄 알았는데 지금은 장롱 어디쯤 처박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사진은 오토릭샤를 처음 운전해보고 목적지인 르네폭포에 도착해 떨리는 마음으로 내 발을 찍었다. 한국에서도 운전한번 해본 적 없는 나지만 내 두발로 페달을 밟아가며 이 먼길을 왔다는 생각에 스스로 대견한 생각이 들었나보다. 하지만 역시 긴장했었는지 사진속에는 아직까지 살짝 움츠린 내 발이 보인다.

한비야씨의 책을 읽다보면 유난히 '발'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나역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 튼튼할 뿐 아니라 쉽게 까지거나 베이지도 않는 강철같은 다리를 부모님께서 물려주신걸 보면 여기저기 두 발로 열심히 다니라는 뜻은 아니었을까 하는 조금은 황당한 생각을 가끔 하기도 했다.
탐험가들이 지도위에서 자신의 좌표를 찾아 깃발을 세우고, 항해사들이 망망대해를 건너며 별자리를 보고 위치를 찾듯이, 나는 조심스럽게 내 발이 딛고 선 그곳을 사진에 한장 한장 담으며 나의 여행의 기록을 남긴다. 물론 가끔씩, 그리 잘생기지도 않은 투박한 내 발, 매일 보는 그 발을 그 먼 여행지까지 가서 왜 찍어대냐며 한마디씩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여행을 몸으로 기억하는 하나의 의식이며 습관이다. 촉감을 담아낼 수 없는 사진이라는 기록에서 부터 그때의 느낌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여행 > '09 인도배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파테푸르 시크리, 무굴 제국이 남긴 찬란한 폐허에 앉아서 (6) | 2010.05.18 |
|---|---|
| 여행과 사진, 그 미묘한 관계에 대하여 (26) | 2010.01.13 |
| 조금은 색다른 인도의 버스여행 문화? (16) | 2010.01.04 |
| 그림을 그릴줄만 알던 나, 인도 소녀에게 그림을 선물받다 (32) | 2009.12.23 |
| 인도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까? (18) | 2009.12.22 |
| 인도에서 온 편지, 행복을 주는 가게의 민수씨? (14) | 2009.12.09 |
| 멀리 인도땅에서 맛보는 한국음식 이야기 (19) | 2009.12.08 |
| 인류 최고의 건축물 타지마할, 공짜로 들어간 사연은? (23) | 2009.12.07 |
| 너무 달아도 좋아, 인도에서 먹어본 군것질 Best 10 (23) | 2009.12.04 |
| 인도사람들, 비가오면 밖으로 뛰쳐나가는 이유는? (10) | 2009.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