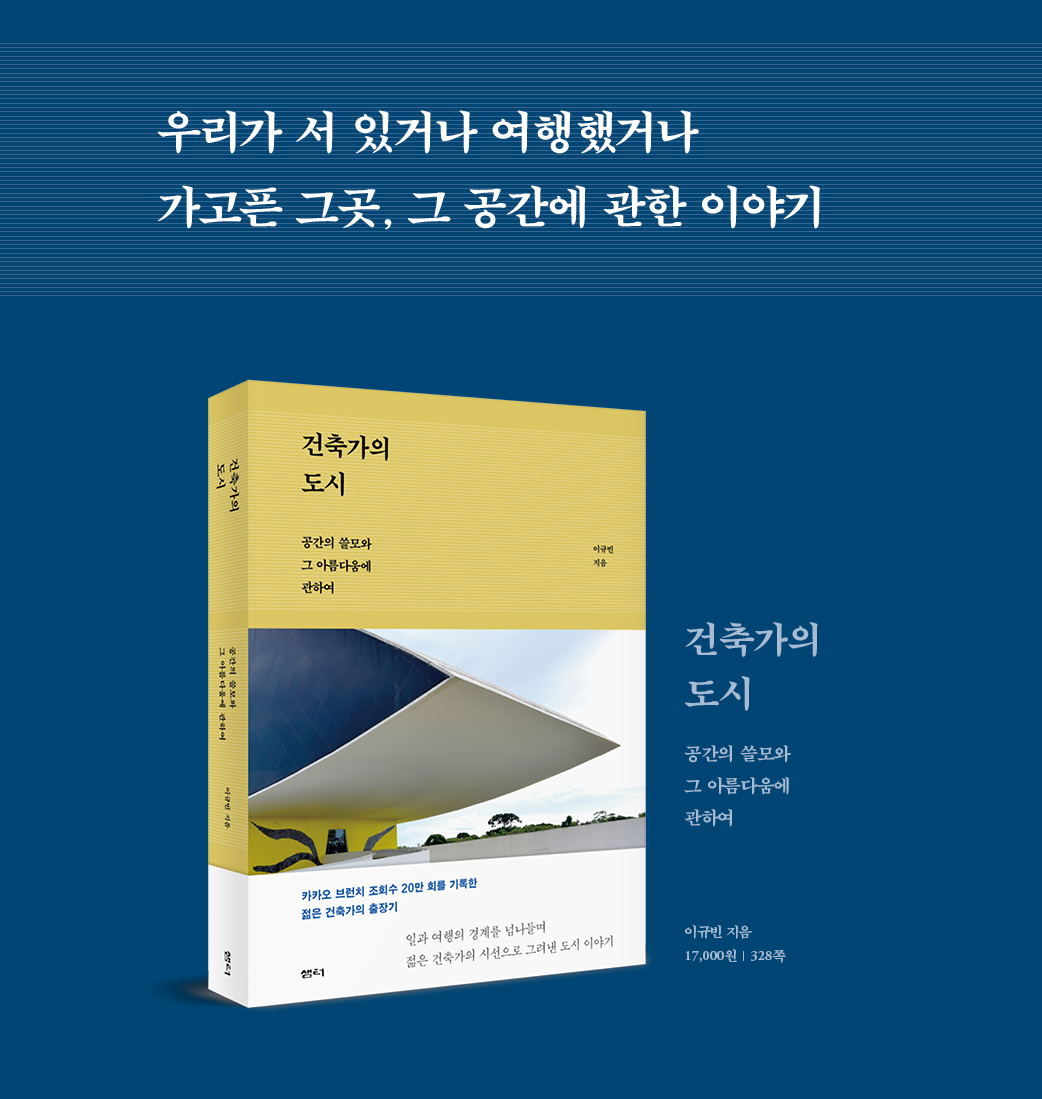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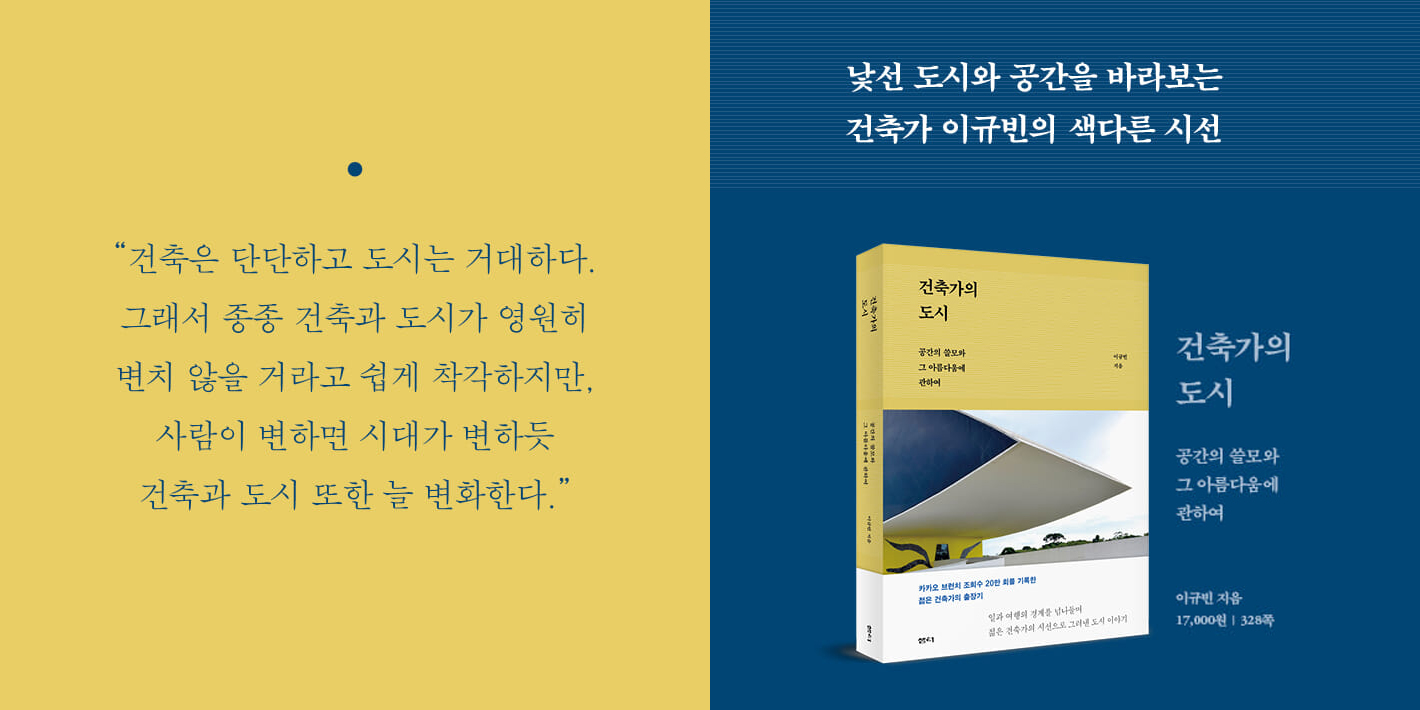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크리스마스, 스키장, 쾰른여행 그리고 방 한구석에 쌓여있는 빈 맥주병들. 뒤셀도르프에서의 꿈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우리는 12월 29일 베를린으로 향했다. 유럽에서 '사는 것'과 '여행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교통비가 아닐까. 유레일 패스가 있으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기차 탑승은 늘 예상치 못한 초과 지출을 불러온다. 더군다나 뒤셀도르프에서 베를린까지는 거리가 꽤 되는지라 걱정을 좀 했었다. 다행히 파울이 찾아낸 기가막힌(?) 대안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싼 가격으로 기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갈 수 있었다.

오전 11 54분, 우린 뒤셀도르프 Hbf에서 완행열차에 올랐다. 베를린 도착 예정 시간은 무려 오후 8시. Düsseldorf Hbf -> Minden(Westf) -> Hannover Hbf -> Wolfsburg Hbf -> Stendal -> Rathenow -> Berlin Hbf. 이렇게 무려 여섯번이나 환승을 해야 하는 긴 여정이다.

꼭 빠르게 움직이는 것 만이 좋은 건 아니다. 느릿느릿 움직이며 여러 도시에서 환승하다보면 잠깐의 찰나를 이용해 관광(?)을 할 수도 있다. 위 사진은 볼스부르크(Wolfsburg)에 도착했을때 잠깐 내려 둘러본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의 패노 과학관(Phaeno Science Center). 친한 건축과 동기 하나가 '건축과 컴퓨터'라는 과목때 이 건물을 3D로 올리며 고생하던 기억이 나서 더욱 반가웠다. 그러고보니 예전에 런던 디자인 박물관에서는 '자하 하디드 특별전'을 관람하며 이 건물에 대한 스터디 모델과 드로잉을 본 적도 있었다. 비록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는 멀치감치서만 봐도 꽤 반가운 건물이었다. 이처럼 느린 여행에는 예상치 못한 작은 재미들이 숨어있다. 덕분에 8시간 동안의 긴 기차여행은 생각만큼 지루하진 않았다.

2011년의 마지막 밤 까지 우리가 베를린에서 머물 집은, 파울의 친구 토비네 아파트. 토비가 연말을 보내기 위해 다른 도시로 잠깐 놀러간 사이 우리가 아파트를 통째로 빌렸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열쇠를 맡아준 윗집 제시까지 모두 모여 맥주와 함께 가벼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어느새 12월 30일이다. 근처 슈퍼에서 사온 빵과 간단한 샐러드로 아침을 먹고 본격적인 베를린 투어에 나섰다.

우리가 묵고있는 토비의 아파트는 구 동베를린에 속한 지역이다. 독일이 통일된지도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파울 말에 의하면 심지어 베를린 안에서 조차 아직까지 동과 서 분위기에 확연한 차이가 있단다. 우리가 베를린 여행을 시작한 알렉산더 플라츠(Alexander Platz) 역시 구 동베를린의 중심지였다. 광장 주변으로는 어쩐지 무표정하고 위압감을 주는 건물들이 가득 들어서 있어 과연 동베를린의 분위기를 실감케 한다.

파울이 잠깐 카메라 필름을 사러 들어간 사이, 광장에서 소세지를 파는 아저씨를 한참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 파울은 나에게 스페인어로 '무이 알레만(Muy aleman, 매우 독일스러운 것)'이라고 귀뜸해줬다. 과연 내가 독일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이지 독일 사람들은 소세지를 집에서 먹는것도 모자라 길에서도 꾸준히 '섭취'한다. 특히나 사진 속 아저씨는는 직접 가스통과 불판을 짊어진 채로 열심히 소세지를 구워 판다. 말 그대로 정말 '독일스러운' 재미난 풍경이다.

얼마후 파울의 오랜 친구 마누와 그의 여자친구까지 합세해서 우린 다섯명이 되었다. 잠깐 같이 박물관(Altes Museum)에 들어갔다가 나와 다시 둘로 갈라져 다니기로 했다.

번화가를 따라 한참을 걸어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에 도착했다. 쉽게 말하면 한국의 광화문 광장쯤 되는 곳이다. 옆으로는 국회 건물도 보이고 대통령 사저도 붙어 있다. 하루 뒤로 바짝 다가온 신년맞이 행사대문에 광장은 벌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다. 조금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브란덴부르크 문 뒤로 이미 큰 무대가 세워져 있고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어느새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었다.

아까 독일의 소세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도 하나씩 먹고 가기로 했다.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대통령 사저 쪽으로 조금만 가면 이 자그마한 소세지 가게가 나온다. 평범해 보이는 소세지 가게지만 독일 대통령이 자주 찾는 곳으로 알려져 유명세를 탄 곳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먹는 작은 소세지 하나와 글루바인(Glühwein,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와인)으로 허기를 달랬다. 확실히 독일 소세지는 길가에서 이렇게 사먹어도 참 맛있더라.

북적거리는 광장을 벗어나 조금만 걸으면 기묘한 형상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Holocaust Monument)을 맞닥뜨리게 된다. 꽤 넓은 대지를 가득 메운 어마어마한 크기의 돌들은 마치 커다란 미로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도입부에서는 겨우 무릎까지 올까말까한 낮은 높이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록 바닥이 낮아져 가장 깊은 곳에서는 머리위로 하늘 조금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우리가 찾았을땐 벌써 어두운 밤이라 미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무서운 느낌이 들 정도. 이런 종류의 메모리얼들에 관심이 좀 있는 편인데, 특별한 장치나 인공적인 조형미 없이도 '스케일'만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게 마음에 와 닿았다.

포츠다머 플라츠(Potsdamer Platz)에도 들렀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베를린 다운 장소'가 바로 이 곳이다. 광장 한가운데 남겨져 있는 베를린 장벽의 조각 너머로 날카롭게 날이 선 최신식 고층 빌딩이 대조를 이룬다. 독일 베를린은 어딘가 무표정한듯 하면서도 담겨진 이야기가 참 많은 도시다. 다만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닌 밤중의 베를린 투어(?)는 계속 됐다. 포츠다머 플라츠에서 조금 더 걸어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들렀다. 공연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거의 문 닫을 시간이라 잠깐 들어갔다 나온게 전부. 기회가 되면 독일에서 공연 한 번 보는것도 참 좋았을텐데 조금 아쉽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나면 저 멀리 아주 익숙한 건물이 하나 보인다. 바로 건축가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뉴 내셔널 갤러리(Neue National Galerie)'다. 일반 사람들에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같은 건축학도들에겐 수업시간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바로 그 건물이다. 지붕은 외부에서 단 8개의 십자모양 기둥으로 고정되고 실내 공간에는 그 어떤 벽도 없는 완벽한 오픈 플랜(Open plan, 열린 평면)의 건물. 지금이야 대부분의 건물이 이런식이지만 건축사적으로는 매우 가치 있는 건물이다. 역시나 시간이 늦어서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오픈 플랜 건물의 특성상 밖에서 안을 훤히 둘러볼 수 있었다.

이날 저녁은 파울의 친형인 필립네 집에서 함께 '찜닭'을 해 먹었다. 물론 오늘의 요리사는 나와 우린이. 필립은 뒤셀도르프에서 우리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낸 후 베를린에 있는 여자친구네 집에 머무르는 중이다. 그때도 닭볶음탕을 그렇게 좋아하더니만 찜닭 역시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 식사가 끝나갈 무렵 파울의 친구들까지 모두 합세해서 두런두런 이야기 꽃을 피우며 그렇게 12월 30일 밤을 흘려 보냈다.

12월 31일 베를린. 이제 정말 2011년이 단 하루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을 외국에서 보내본 적이 한 번도 없기에 새해를 준비하는 독일 사람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마냥 신기했다. 지난 밤, 오랜만에 만난 독일 친구들과 회포를 푸느라 피곤해하는 파울을 놔두고 오늘은 우린이랑 둘이서만 밖에 나왔다. 오늘 저녁엔 파티도 가야하고 불꽃놀이도 해야해서 가볍게 걸어서 돌아다니기로 했다.

베를린 도심 여기저기를 그냥 돌아다녔다. 중간에 바우하우스(Bauhaus Museum)에도 들리고 어젯밤 봤던 미스 반 데어 로에(Mies van der Rohe)의 뉴 내셔널 갤러리(Neue National Galerie)도 다시 찾았다.

2011년의 마지막 날, 베를린 여행의 마지막 종착역은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의 유태인 박물관(The Jewish Museum)이다. 미스 반 데어 로에 보다는 훨씬 더 최신(?) 건축물이지만 역시나 책에서 수도 없이 봤던 바로 그 건물이다. 해체주의적인 표현방식으로, 말 그대로 조금은 직설적으로 유태인에 대한 추모의 생각을 담은 건물이다.

찟겨지고, 조각나고, 파헤쳐진 건물. 실제 실내에 들어가봐도 외피의 느낌과 비슷한 공간감이 느껴진다. 구체적인 설계 컨셉을 들여다보면 각 건물의 축이 지하에서부터 2층까지 이어지고, 각 축마다 의미하는 바가 연결되어 전시 구성까지 이어진다는 식인데 사실 전시보다는 건물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서 잘 느끼지는 못했다. 내부 사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데, 당연히 내부에선 촬영 금지일줄 알고 가방을 맡기며 카메라도 같이 맡겨버린게 실수였다.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건물이라 그런지 조금 실망스런 부분도 있었다. 특히나 건물의 디테일이 좀 엉성해서 전체적인 완성도마저 떨어뜨리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해서 2011년의 마지막 날,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여행까지 무사히 마쳤다. 해가 지기가 무섭게 거리에는 폭죽소리가 하나 둘 들려오기 시작한다. 우리도 얼른 집으로 돌아가 2012년을 맞이할 준비를 슬슬 해보기로 했다.
'여행 > '12 유럽배낭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중해의 보석을 찾아 베네치아에서 친퀘떼레(Cinque terre)까지 (8) | 2012.04.06 |
|---|---|
|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이 깃든 도시, 이탈리아 베로나 (4) | 2012.03.19 |
| 5년 만에 다시 찾은 베네치아, 옛 사진 속의 장소를 찾아서 (13) | 2012.03.15 |
| 밀라노행 라이언에어(Ryanair) 기착지, 베르가모(Bergamo)를 여행하다? (9) | 2012.01.20 |
| 새해 첫 날, 이탈리아에서 세계일주 여행자 신현재를 만나다 (14) | 2012.01.18 |
| 독일 베를린에서의 새해맞이, 2012년을 맞이하는 그들만의 방법? (3) | 2012.01.17 |
| 대성당을 바라보며 사랑의 서약을, 독일 쾰른(Köln) (9) | 2012.01.15 |
| 독일에서의 크리스마스 (3), 실내 스키장(Skihalle)에 가다 (3) | 2012.01.14 |
| 독일에서의 크리스마스 (2), 크리스마스 이브의 만찬, 그리고 (6) | 2012.01.13 |
| 독일에서의 크리스마스 (1), 마드리드에서 뒤셀도르프(Düseldorf)로 (6) | 2012.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