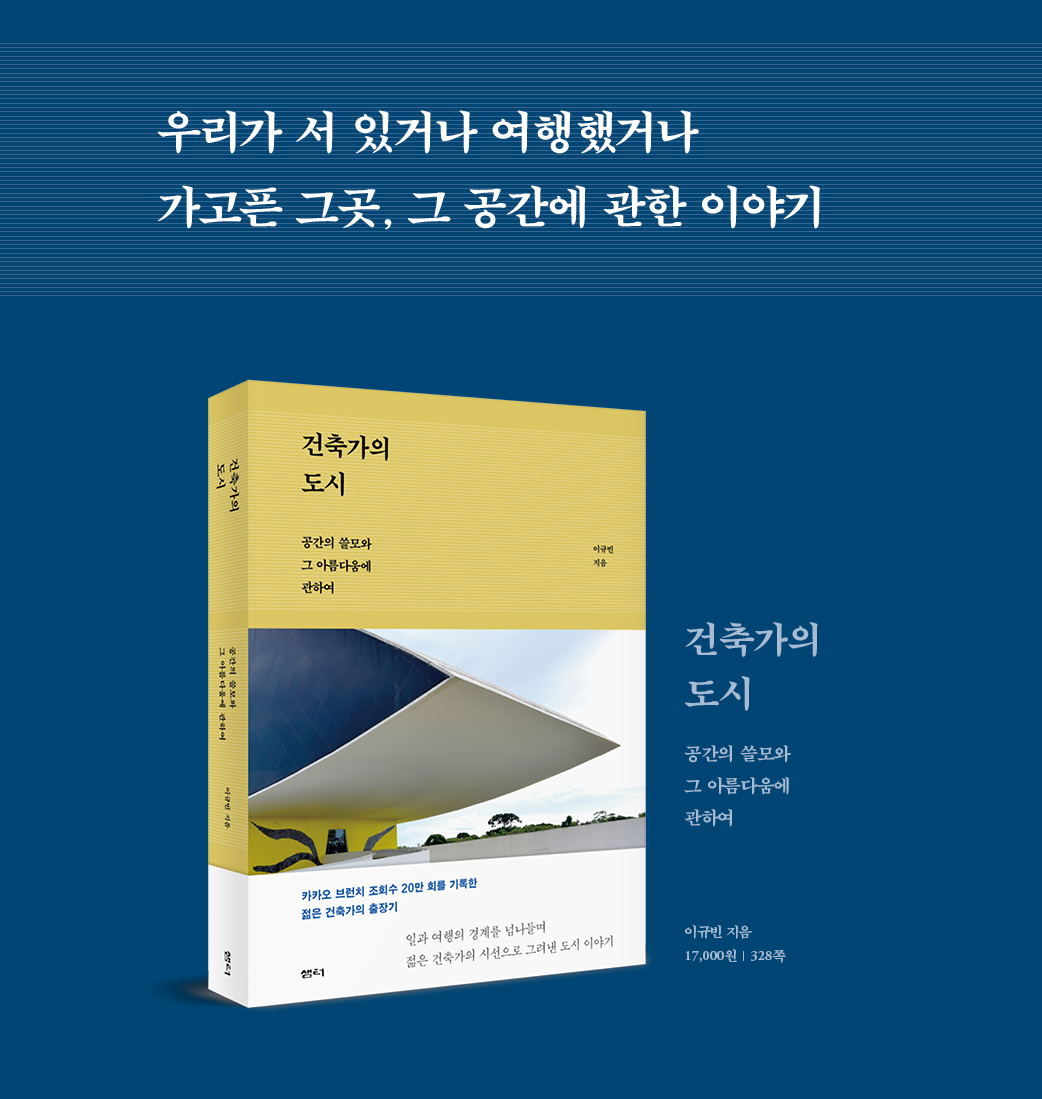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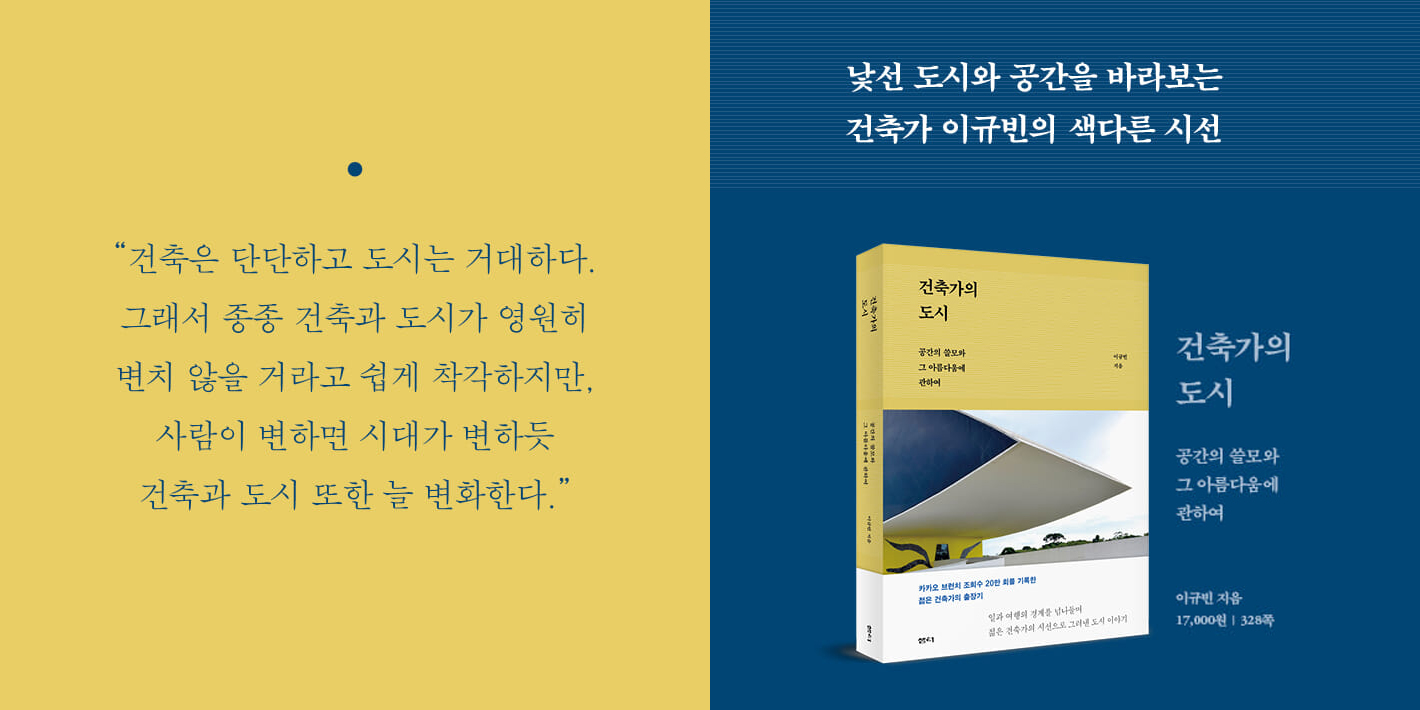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내 여행의 출발은 늘 혼자였다. 누군가 함께하지 않으면 금세 외로워질게 뻔함에도 마음 내키는 대로 어디든, 언제든 훌쩍 떠나버리는 나였다. 하지만 공항에서, 기차역에서, 숙소에서, 혹은 레스토랑에서 나는 늘 사람들을 만났고, 어울렸고, 함께했다. 그러다 마음이 맞는 친구를 사귀면 하루, 혹은 일주일, 때로는 한 달 가까이 함께 여행하기도 했다.
여행이란 목적지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르는 과정에 더 가깝다. 길 위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사연이 있다. 그 사연들이 차곡차곡 모여 이루어지는 것이야 말로 곧 여행의 본질이 아닐까 종종 생각하곤 했었다.

라가주오이 산장(Rifugio Lagazuoi)에서 묵기로 한 날, 나는 네 명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탈리아에서 온 마라(Mara), 노르웨이에 온 린(Lin)과 아가(Haga), 그리고 스웨덴에서 온 소피아(sofia)였다. 우리는 그날 저녁 식사를 한 테이블에서 함께 했다. 국적도, 나이도, 하는 일도 모두 달랐지만 우린 모두 알타비아를 걷고 있다는 공통점 하나만으로 금세 친구가 되었다. 그러고 보니 다섯 명 중 나만 유일한 남자였다. 이런 상황이 그리 어색하지는 않았다. 언제나 여행지에선 남자보다는 여자들과 더 쉽게 친해지고 잘 어울리는 편이기 때문이다. 확실히 나는 여복(女福)이 좀 있는 편이다.



다음날 아침 일찍, 산장을 떠날 준비를 하는 나에게 마라와 소피아가 찾아왔다. 남쪽으로 길을 떠날 계획이면 함께 하자고 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다.
알타비아에는 지름길도 갈림길도 없다. 그저 먼저 걷는 사람과 나중 걷는 사람만이 있을 뿐이다. 마침 지난 이틀간의 지독한 고독으로 사람이 그리워지던 차였는데 반가운 동행이 생겼다.


마라(Mara)는 이탈리아 사람이다. 태어나 자란 곳은 바다와 가까운 베네치아지만 등산과 여행을 좋아해 여름이면 늘 이렇게 유럽의 산들을 찾아다닌다고 했다. 160cm가 채 안돼 보이는 작은 체구였지만 구릿빛 피부와 질끈 묶은 긴 머리가 다부진 인상을 풍겨왔다. 몸집에 비해 버거울 정도로 무겁고 큰 배낭을 메고도 씩씩하게 앞장서 걷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소피아(Sofia)는 스웨덴에서 왔다. 나와 마라에 비하면 눈부실 정도로 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지만 운동이나 산을 좋아하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외레브로(Örebro)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는 중인 그녀는 오래전부터 알타비아를 한 번 걸어보는 게 꿈이었다고 했다. 원래 함께 하기로 했던 친구가 갑자기 일이 생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혼자 이곳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혼자 걷던 길을 셋이 함께 걷게 되었다. 무엇보다 제일 좋았던 건 말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점이었다. 길을 걸으며 우린 서로의 여행 경험과 알타비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표가 잘 되어있는 알타비아지만 가끔은 길이 헷갈려 멈춰 설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도 혼자서 고민하는 것보단 셋이 머릴 맞대는 쪽이 나았다. 마라의 종이지도와, 소피아의 가이드북과, 나의 스마트폰 앱을 한데 모으니 결론을 내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아침 일찍 정상에서 출발한 우리는 늦은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골짜기 아래에 도착했다. 해발 2,700m에서부터 해발 1,900m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거리를 걸어서 내려온 셈이었다. 이야기하며 걸어서인지 예상보다 빨리 도착해 약간의 시간 여유가 생겼다. 우리는 근처에 레스토랑을 겸하는 산장에 들러 멋진 경치를 배경 삼아 천천히 점심 식사를 즐겼다.
다시 짐을 챙겨 출발하려는데 별안간 셋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다. 계속해서 남쪽의 '친퀘토리(Cinque Torri)'로 가는 방법은 걷는 것과 케이블카를 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는 케이블카를 타자고 제안했지만 마라와 소피아는 반대했다. 알타비아를 제대로 완주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발로 걸어야만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둘이었다. 결국 우리는 반나절의 짧았던 동행을 여기서 마치고 헤어지기로 했다.


케이블카는 산 아래에서부터 약 400m의 고도를 가파르게 올랐다. 솔직히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걷기 싫어서 택한 길은 아니었다. 다만 내일이면 알타비아를 반절까지만 걷고 돌아가야 하는 나로서는 완주의 진정성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더 우선시 하고팠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완주를 목표로 하는 마라와 소피아의 생각은 달랐다. 갑작스러운 헤어짐은 아쉬웠어도 각자의 생각은 존중받아야 마땅하기에 달리 방도가 없었다.


친퀘토리(Cinque Torri)는 이탈리아어로 '다섯 개의 봉우리'라는 뜻이다. 트레치메와 함께 돌로미티를 대표하는 관광명소 중 한 곳으로, 주변으로 높은 고원 한가운데에 마치 조각상처럼 우뚝 솟은 크고 작은 다섯 개의 기암괴석이 장관을 이룬다. 꼭 걷는 사람들만이 아니어도 자동차, 버스, 케이블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근처 도시에서 이곳을 찾는 사람로 언제나 붐비는 곳이다.
반나절의 짧은 동행이었지만 오랜만에 느꼈던 사람 냄새가 진하게 남았던 모양이다. 쿨하게 작별하고 케이블카에 오른 나였지만 혼자가 되고 나니 비로소 아득한 외로움이 밀려왔다. 제아무리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이라고 한들 이런 나에겐 그저 돌은 돌이요, 나무는 나무일 뿐이었다. 한 바퀴 빠르게 둘러보고는 기념사진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길을 나섰다.

나의 루트는 친퀘토리를 지나 남쪽으로 파소 팔짜레고(Passo Falzarego)를 향해 계속 이어진다. 오늘 밤 묵을 숙소는 고갯길을 넘기 전 삼거리에서 빠져나와 정상을 향하는 막다른 길 끝에 있었다.
고개 위에 올라서자 양 쪽으로 걸어온 길과 걸어야 할 길이 한눈에 들어왔다. 한참을 감상에 젖어 서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열심히 손을 흔들며 나에게 걸어오고 있었다. 마라와 소피아였다.


알타비아에는 먼저 걷는 사람과 나중 걷는 사람만 있다 하지 않았던가! 우리 셋은 길 위에서 자연스럽게 재회했다. 비록 예약한 숙소가 서로 달라 곧 다시 헤어질 운명이었지만 말이다. 해가 지기까진 여유가 있어 조금 더 시간을 같이 보내기로 했다.
마라와 소피아는 각자 숙소에 체크인을 마친 후, 내가 묵을 산 꼭대기의 누볼라우 산장(Rifugio Nuvolau)까지 산책 삼아 나를 바래다주기로 했다.


'누볼라우(Nuvolau)'는 이탈리아어로 '구름'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산꼭대기 높은 곳에 위치한 산장은 과연 구름과 가까워 보였다.
정상에 올라섰다는건 곧 다시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루 동안의 짧은 인연을 추억하며 우리는 각자가 좋아하는 음료를 시켜 오늘의 산행이 무사히 끝난 것을 자축했다. 마라는 맥주, 나는 와인, 소피아는 커피였다. 역시나 취향 또한 확고한 우리들이다.

길 위에서의 만남은 언제나 무겁지 않아 좋았다. 각자가 살아오던 일상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길 위의 이야기에만 오롯이 집중한채 만나고, 또 헤어진다. 그럼에도 어떤 인연들은 다음 여행으로, 혹은 더 길게는 평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만남은 쿨하지만, 헤어짐은 결코 가볍지 않은 까닭이다.
소피아는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펜과 함께 나에게 내밀었다. 그것이 작별의 신호라는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적고 이를 찍어 나눠 가졌다.
그녀는 스웨덴에 오게 되면 꼭 연락하라는 뻔하지만 듣기좋은 인사말도 잊지 않았다. 내가 스웨덴에 가게 될 일이 있을까? 아니, 살면서 다시 소피아를 만날 일이 있을까? 솔직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할 것도 없었다. 언제가 생각지도 못한 여행지에서 그녀와 재회하고, 또 한 번 같은 방향으로 걸을 수 있을진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여복(旅福)도 꽤 많은 사람이니깐. (계속)
--

'여행 > '15 이탈리아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말러의 오두막에서 꼬르뷔제를 생각하다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10) (0) | 2020.09.08 |
|---|---|
| 알타비아 넷째날, 외로운 백조와 장미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9) (0) | 2020.09.03 |
| 알타비아 둘째날, 해발 2700m에서의 하룻밤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7) (0) | 2020.07.28 |
| 알타비아 첫째날: 지독하게 고독한 길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6) (0) | 2020.07.21 |
| 건축가가 산으로 간 까닭은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5) (4) | 2020.06.22 |
|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4) (2) | 2020.06.16 |
| 한 편의 전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3) (0) | 2020.06.09 |
| 밀라노의 심장에 소쇄원을 세워라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2) (0) | 2020.06.02 |
| 다시 유럽에 갈 수 있을까?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1) (7) |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