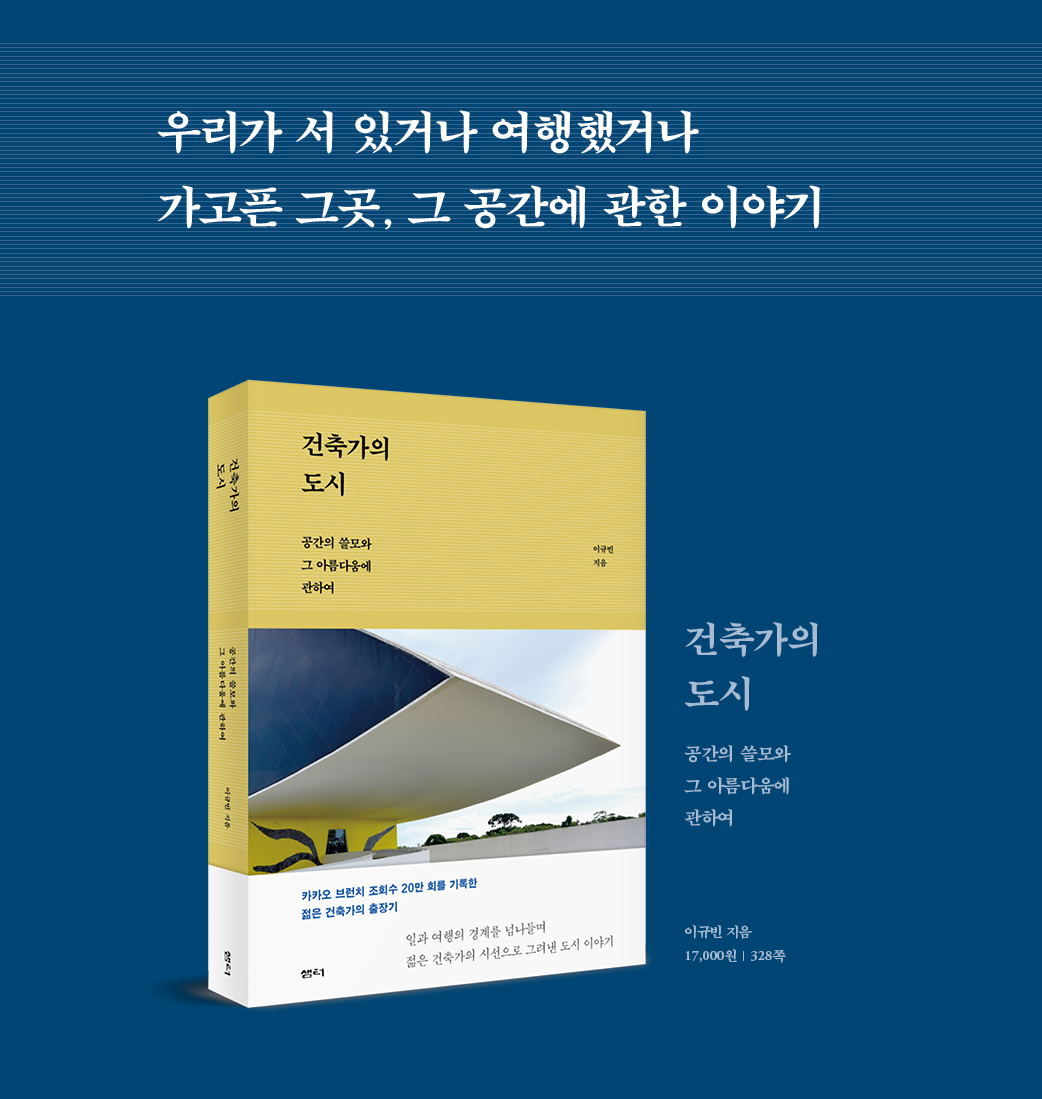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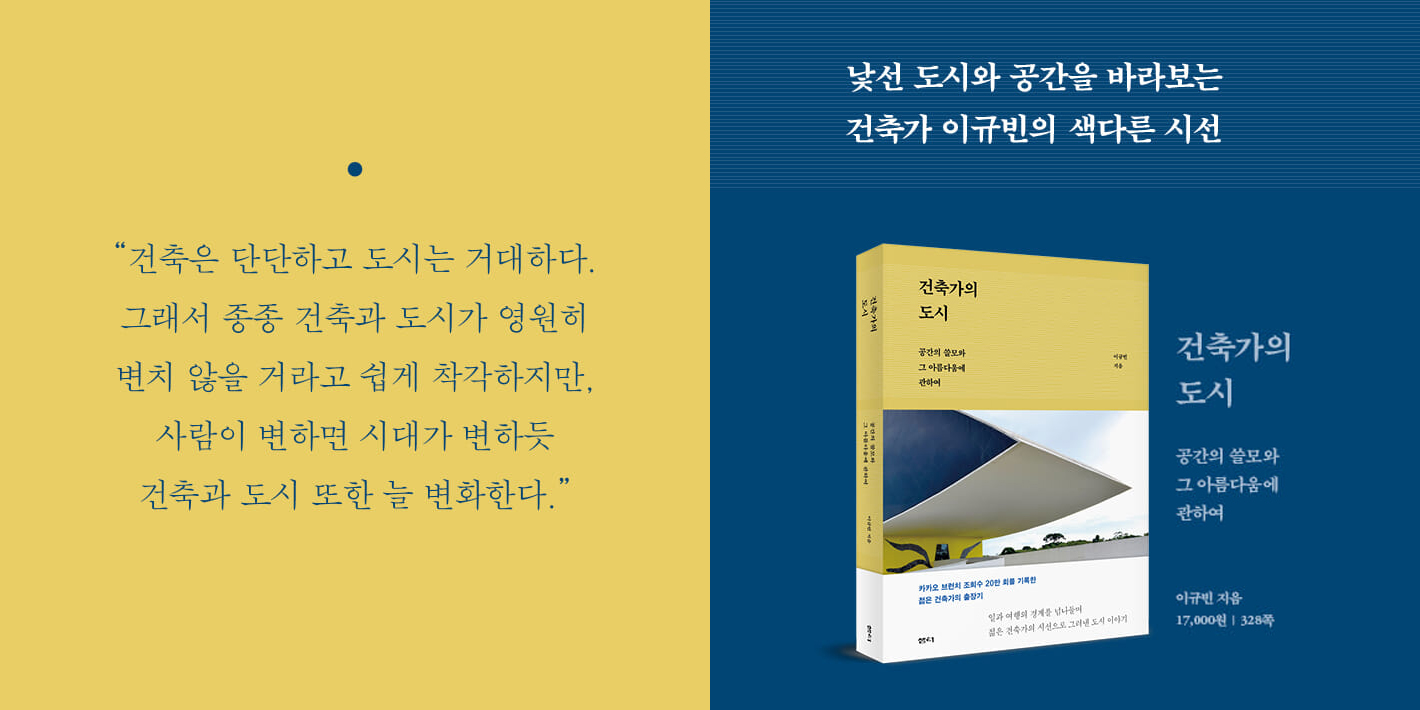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내가 렌즈의 기계적인 성능이나 수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필름 카메라를 쓸때만 해도 싸구려 필터에 기름 범벅을 해놓고도 신이 나서 셔터를 눌렀던 것 같고, 최근에 디지털 바디로 넘어와서도 색수차니 선예도니 하는 말들은 나와는 상관 없는 말이라도 치부해버렸었다. 사진은 카메라로 찍는게 아니라 눈으로 찍는거라는 믿음이 강해서 였을까.
그런데 최근들어 렌즈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생겼다. 나야 상관없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일명 '샘플샷'을 찍어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그럴 수 밖에. 결정적으로 77리밋을 일주일 정도 대여해서 써보는 사이에 처음으로 '색수차'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망쳐버렸던 사건이 발생한게 계기가 되었다. 야외에서 흰 상의 입은 모델을 77리밋으로 촬영하는데, 거짓말 1% 보태서 어깨에 보라색 날개가 달린것 처럼 나오는게 아닌가. 렌즈에 문외한이었던 초보 사진사가 그렇게 '색수차'에 눈뜨는 순간이었다. 렌즈의 광학적/기계적 성능이라는게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사진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걸 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서론이 조금 길었다. 어쨌거나 그렇게 몸으로 부딛혀가며 렌즈의 좋고 나쁨(엄밀히 말하면 나쁘다는 단어는 조금 맞지 않는것기도 하지만)을 차차 배워가고 있던 중, 우연히 손에 자이스 2.8/21mm 렌즈를 쥐어볼 기회가 생겼다. 사실 스스로 헝그리 유저라고 말하고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나같은 사람에게 자이스 렌즈는, 말 그대로 마운트해볼 기회도, 탐내볼 여유도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헌데 렌즈를 미처 받아보기도 전,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었다. 꿈의 렌즈라느니, 평생의 로망이라느니, 하는 온갖 수식어들이 등장했다. 대체, 이 렌즈가 뭔데 그래?

대충 검색해보니 렌즈 가격만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AF 지원조차 안되는 수동렌즈, 그것도 단렌즈가 내 카메라 바디보다 비싸도 한참 비싸다. 아, 그래도 내 카메라는 한 회사의 플래그쉽 바디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게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일까. 꽤 까칠한 가격에 비해 포장은 수수한 첫인상을 풍겼다. 렌즈의 광학적 설계도와 이름, 그리고 자이스 라는 파란 마크가 붙은게 전부다. 박스를 개봉해보니 두꺼운 스티로폴 안에 렌즈 본체와 후드만 달랑 들어있었다. 조심스레 꺼내서 손에 쥐어보는데 생각보다 꽤 묵직했다.

필자는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써, 디자인의 완성도는 전체적인 형태보다는 마지막 디테일에서 판가름난다고 굳게 믿는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자이스 2.8/21mm의 완성도는 그동안 만져본 렌즈들 중에 단연코 최고가 아닐까 싶다. 금속을 깎아서 통으로 만든 경통부는 펜탁스 리밋 렌즈 시리즈와 첫 인상이 비슷하지만 훨씬 단단하고 묵직했다. 수동렌즈인 만큼, 조작이 가능한 부분은 줌링과 포커스링 단 두개. 둘 다 미끈하게 잘 돌아 가다가도 정확한 위치에서 떨림 없이 착 하고 멈춘다. 참 사진찍는 '맛'이 있을 것 같은 괜찮은 녀석이다. 조리개링도 끊어지거나 부정확한 움직임 없이 똑 부러지게 넘어간다. 그 손맛이라는게 말로는 다 표현 못하지 싶다.


후드 체결부위 역시 완성도가 기가막히다. 꽃무늬 후드임에도 각이 진 디자인은 조금 아니다 싶지만, 얼음위를 미끄러져 나가는 스케이트날 마냥 철컥 하면서 마치 한 몸이었던것 처럼 체결된다. 후드 내부에는 빛의 난반사를 막기위해 벨벳 처리가 되어있다. 렌즈의 특성상 대물렌즈가 앞으로 많이 튀어 나와있는데, 80mm가 넘는 구경 때문에 필터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아 보인다.
사실 렌즈의 외관이나 디자인이 사진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다.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조리개링이나 포커스링의 조작감은 렌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디테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간단한 개봉기 형식으로 첫 인상에 대해 살짝 이야기 하기로 하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리뷰를 쓸 생각이다.


자이스 렌즈의 선예도는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언급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오죽하면 '칼'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랴. 리사이징 사진에서는 잘 안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잎 표면의 미세한 솜털들이나, 그 자리에서는 미처 못봤던 작은 진드기와 개미 친구들도 사진 속에는 모두 담겨있다. 2.8/21mm는 최소 조점거리도 나름 짧은 편이라 이런 자연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담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렌즈라는 생각이 든다. 칼 같은 선예도는 중앙부는 물론이고 주변부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며, 조리개 최대 개방시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자이스 2.8/21mm는 이번에 ZK(펜탁스) 마운트로 처음 발매되었다. 어쩌면 타사 마운트보다 펜탁스 마운트가 더 어울리는 렌즈일지도 모르는데, 이제서야 발매된게 조금 얄밉기도 하다. 사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펜탁스만 고집하는 골수 유저 입장에서 볼 때, 확실히 펜탁스는 동적인 인물이나 스포츠 사진보다는 정적인 풍경에 초점이 맞춰진 브랜드다. 물론 다소 느린 AF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의도된'것이라고 하기에는 억지가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풍경이나 멈춰진 사진을 주로 찍는 사진가에게는 느린 AF에도 큰 불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이번에 발매된 645D에서는 아예 로우패스필터를 생략하기도 했다. 실내 스튜디오 사진보다는 풍경을 찍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브랜드라는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645D에 추가된 '리버설 필름 모드'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자이스 2.8/21mm는 그래서 펜탁스에게 더욱 반갑고 잘 어울리는 렌즈다. 크롭 환산 31.5mm가 보여주는 세상은 과장되지도, 생략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비슷한 화각대의 렌즈로 DA 21 리밋 렌즈가 있지만, 리밋 렌즈들은 '경박단소'라는 펜탁스의 철학에 맞추어 경량화에 초점을 둔 렌즈이기에 아무래도 성능 비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펜탁스 K-7 실버(일명 은칠이)로 기변을 한 이후로, 요즘에는 이런 구도의 사진들을 즐겨 찍는다. 정확한 대칭과 평면적인 화면 구성,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진속 텅 빈 공간은 도시의 혼잡함 대신 마음의 휴식을 준다. 자이스 2.8/21mm는 그런 면에서 풍경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감히 단언해 본다. 주변부에서도 흔들림 없는 깨끗한 화질은 화면 전체 구성에 있어서 균형잡힌 표현을 가능케 하고, 최대 개방에서 또렷한 화질은 사진가에게 더욱 다양한 표현의 기회와 사진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




지난 주말 덕수궁에서 찍은 사진이다. 원본에서는 화면에서 왼쪽 아래 치우친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선명한 묘사가 되어 있었다. 수동으로 포커싱을 하다보면 한 컷을 찍기까지 시간이 자연스레 더 오래 걸리기 마련인데, 그러한 불편함이 꼭 사진에 방해가 되는것은 아니다. 머릿속으로 사진의 구도를 결정하고, 뷰파인더에 눈을 붙이고, 링을 돌려 뿌연 화면이 또렷해지는 순간, 이게 아니다 싶어 다시 카메라를 내린다. 그러기를 여러번 반복하고 또 반복. 문득 뜨거운 한낮의 태양 아래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서 있다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그동안 내가 너무 빠른 것만을 좆았던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선예도가 뛰어난 렌즈의 장점은 비단 뛰어난 묘사력뿐만이 아니다. 화면에서 원경과 근경이 만나는 접점을 정확하게 분리해 내어 조리개를 많이 열지 않고도 자연스러우면서도 공간감 있는 화면을 만들어낸다. 위는 덕수궁 앞 수문장 교대식에서 찍었던 사진이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적당한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힘겹게 자리를 잡고 서도 포커스링을 돌리다 보면 금새 인파들이 앞을 가려버리기 일쑤였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끝에 힘들게 몇 장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날 망원계열 줌 렌즈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사진들을 다시 보니, 망원 렌즈로 편하게 찍었던 사진보다는 수동으로 찬찬히 찍은 사진들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왜 일까. 다시 렌즈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사진속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원색 표현이야 바디 세팅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 넘어가기로 하고, 자세히 보면 옷이 미끈한 천이 아니라 세밀한 무늬가 있는게 보인다. 막상 사진을 찍는 당시에는 눈여겨 보지 않았었는데, 찍어온 사진 속에는 생동감 있는 질감의 표현 덕분에 사진에서 또 다른 표정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왜곡 억제 성능과 수차제어를 보여준다는 자이스 2.8/21mm지만,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수차가 보일때도 있었다. 하지만 크게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던 77리밋 렌즈로 같은 장면을 찍었으면 아마도 흰색 꽃이 아니라 보라색 꽃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물론 색수차라는건 어디까지나 디지털 바디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77리밋 역시 디지털에서는 심한 색수차 때문에 저평가 받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만, 필름 바디에서는 탁월한 선예도와 성능을 보여준다.
자이스 2.8/21mm 렌즈 역시 풀프레임 대응 렌즈다. 디지털에서는 크롭바디의 특성상 렌즈의 위력을 제대로 느껴보기가 어려웠지만, 다른 유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필름 바디에 물렸을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고 한다. 현존하는 광각계열 렌즈들 중에서는 풀프레임 주변부의 왜곡 억제나 수차 억제, 선예도에 있어서 가히 최고의 성능을 가졌다는데... 서랍 한구석에서 조심스레 MX를 꺼내어 포트라 160NC 필름을 장전해 본다. 이번 주말에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필름을 써보고 싶을 것만 같은 예감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렌즈 리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수치들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성이 생겼다. 나야 상관없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 일명 '샘플샷'을 찍어야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그럴 수 밖에. 결정적으로 77리밋을 일주일 정도 대여해서 써보는 사이에 처음으로 '색수차'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드는 사진을 망쳐버렸던 사건이 발생한게 계기가 되었다. 야외에서 흰 상의 입은 모델을 77리밋으로 촬영하는데, 거짓말 1% 보태서 어깨에 보라색 날개가 달린것 처럼 나오는게 아닌가. 렌즈에 문외한이었던 초보 사진사가 그렇게 '색수차'에 눈뜨는 순간이었다. 렌즈의 광학적/기계적 성능이라는게 단순한 숫자놀음이 아니라 사진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걸 전에는 미처 몰랐었다.

절제된 디자인과 은색 후드 마운트 부위는 자이스 렌즈의 트레이드 마크다
서론이 조금 길었다. 어쨌거나 그렇게 몸으로 부딛혀가며 렌즈의 좋고 나쁨(엄밀히 말하면 나쁘다는 단어는 조금 맞지 않는것기도 하지만)을 차차 배워가고 있던 중, 우연히 손에 자이스 2.8/21mm 렌즈를 쥐어볼 기회가 생겼다. 사실 스스로 헝그리 유저라고 말하고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나같은 사람에게 자이스 렌즈는, 말 그대로 마운트해볼 기회도, 탐내볼 여유도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닌가. 헌데 렌즈를 미처 받아보기도 전, 사람들의 반응이 참 재미있었다. 꿈의 렌즈라느니, 평생의 로망이라느니, 하는 온갖 수식어들이 등장했다. 대체, 이 렌즈가 뭔데 그래?

조금은 수수한 느낌의 포장을 열고 렌즈를 꺼냈다
대충 검색해보니 렌즈 가격만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AF 지원조차 안되는 수동렌즈, 그것도 단렌즈가 내 카메라 바디보다 비싸도 한참 비싸다. 아, 그래도 내 카메라는 한 회사의 플래그쉽 바디인데...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게 바로 이런걸 두고 하는 말일까. 꽤 까칠한 가격에 비해 포장은 수수한 첫인상을 풍겼다. 렌즈의 광학적 설계도와 이름, 그리고 자이스 라는 파란 마크가 붙은게 전부다. 박스를 개봉해보니 두꺼운 스티로폴 안에 렌즈 본체와 후드만 달랑 들어있었다. 조심스레 꺼내서 손에 쥐어보는데 생각보다 꽤 묵직했다.

600g이 조금 넘는 묵직한 무게에서 오는 당당함
필자는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써, 디자인의 완성도는 전체적인 형태보다는 마지막 디테일에서 판가름난다고 굳게 믿는 한 사람이기도 하다. 그런 관점에서 볼때, 자이스 2.8/21mm의 완성도는 그동안 만져본 렌즈들 중에 단연코 최고가 아닐까 싶다. 금속을 깎아서 통으로 만든 경통부는 펜탁스 리밋 렌즈 시리즈와 첫 인상이 비슷하지만 훨씬 단단하고 묵직했다. 수동렌즈인 만큼, 조작이 가능한 부분은 줌링과 포커스링 단 두개. 둘 다 미끈하게 잘 돌아 가다가도 정확한 위치에서 떨림 없이 착 하고 멈춘다. 참 사진찍는 '맛'이 있을 것 같은 괜찮은 녀석이다. 조리개링도 끊어지거나 부정확한 움직임 없이 똑 부러지게 넘어간다. 그 손맛이라는게 말로는 다 표현 못하지 싶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후드의 디자인, 그래도 완성도 하나는 일품이다
후드 체결부위 역시 완성도가 기가막히다. 꽃무늬 후드임에도 각이 진 디자인은 조금 아니다 싶지만, 얼음위를 미끄러져 나가는 스케이트날 마냥 철컥 하면서 마치 한 몸이었던것 처럼 체결된다. 후드 내부에는 빛의 난반사를 막기위해 벨벳 처리가 되어있다. 렌즈의 특성상 대물렌즈가 앞으로 많이 튀어 나와있는데, 80mm가 넘는 구경 때문에 필터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것 같아 보인다.
사실 렌즈의 외관이나 디자인이 사진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니다.하지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조리개링이나 포커스링의 조작감은 렌즈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디테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간단한 개봉기 형식으로 첫 인상에 대해 살짝 이야기 하기로 하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리뷰를 쓸 생각이다.


자이스 렌즈의 선예도는 너무나 유명해서 따로 언급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오죽하면 '칼'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랴. 리사이징 사진에서는 잘 안보이지만, 확대를 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잎 표면의 미세한 솜털들이나, 그 자리에서는 미처 못봤던 작은 진드기와 개미 친구들도 사진 속에는 모두 담겨있다. 2.8/21mm는 최소 조점거리도 나름 짧은 편이라 이런 자연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담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렌즈라는 생각이 든다. 칼 같은 선예도는 중앙부는 물론이고 주변부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며, 조리개 최대 개방시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자이스 2.8/21mm는 이번에 ZK(펜탁스) 마운트로 처음 발매되었다. 어쩌면 타사 마운트보다 펜탁스 마운트가 더 어울리는 렌즈일지도 모르는데, 이제서야 발매된게 조금 얄밉기도 하다. 사진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펜탁스만 고집하는 골수 유저 입장에서 볼 때, 확실히 펜탁스는 동적인 인물이나 스포츠 사진보다는 정적인 풍경에 초점이 맞춰진 브랜드다. 물론 다소 느린 AF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의도된'것이라고 하기에는 억지가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풍경이나 멈춰진 사진을 주로 찍는 사진가에게는 느린 AF에도 큰 불편이 아니라는 말이다. 게다가 이번에 발매된 645D에서는 아예 로우패스필터를 생략하기도 했다. 실내 스튜디오 사진보다는 풍경을 찍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가까운 브랜드라는걸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645D에 추가된 '리버설 필름 모드'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자이스 2.8/21mm는 그래서 펜탁스에게 더욱 반갑고 잘 어울리는 렌즈다. 크롭 환산 31.5mm가 보여주는 세상은 과장되지도, 생략되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풍경이다. 비슷한 화각대의 렌즈로 DA 21 리밋 렌즈가 있지만, 리밋 렌즈들은 '경박단소'라는 펜탁스의 철학에 맞추어 경량화에 초점을 둔 렌즈이기에 아무래도 성능 비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펜탁스 K-7 실버(일명 은칠이)로 기변을 한 이후로, 요즘에는 이런 구도의 사진들을 즐겨 찍는다. 정확한 대칭과 평면적인 화면 구성,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사진속 텅 빈 공간은 도시의 혼잡함 대신 마음의 휴식을 준다. 자이스 2.8/21mm는 그런 면에서 풍경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감히 단언해 본다. 주변부에서도 흔들림 없는 깨끗한 화질은 화면 전체 구성에 있어서 균형잡힌 표현을 가능케 하고, 최대 개방에서 또렷한 화질은 사진가에게 더욱 다양한 표현의 기회와 사진의 다양성을 줄 수 있다.




지난 주말 덕수궁에서 찍은 사진이다. 원본에서는 화면에서 왼쪽 아래 치우친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선명한 묘사가 되어 있었다. 수동으로 포커싱을 하다보면 한 컷을 찍기까지 시간이 자연스레 더 오래 걸리기 마련인데, 그러한 불편함이 꼭 사진에 방해가 되는것은 아니다. 머릿속으로 사진의 구도를 결정하고, 뷰파인더에 눈을 붙이고, 링을 돌려 뿌연 화면이 또렷해지는 순간, 이게 아니다 싶어 다시 카메라를 내린다. 그러기를 여러번 반복하고 또 반복. 문득 뜨거운 한낮의 태양 아래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서 있다보니 그런 생각이 든다. 그동안 내가 너무 빠른 것만을 좆았던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선예도가 뛰어난 렌즈의 장점은 비단 뛰어난 묘사력뿐만이 아니다. 화면에서 원경과 근경이 만나는 접점을 정확하게 분리해 내어 조리개를 많이 열지 않고도 자연스러우면서도 공간감 있는 화면을 만들어낸다. 위는 덕수궁 앞 수문장 교대식에서 찍었던 사진이다. 구경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적당한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었는데, 힘겹게 자리를 잡고 서도 포커스링을 돌리다 보면 금새 인파들이 앞을 가려버리기 일쑤였다. 이런저런 시도를 해본 끝에 힘들게 몇 장을 건질 수 있었다.


이 날 망원계열 줌 렌즈도 함께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 와서 사진들을 다시 보니, 망원 렌즈로 편하게 찍었던 사진보다는 수동으로 찬찬히 찍은 사진들이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왜 일까. 다시 렌즈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사진속 빨간색이나 파란색 같은 원색 표현이야 바디 세팅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 넘어가기로 하고, 자세히 보면 옷이 미끈한 천이 아니라 세밀한 무늬가 있는게 보인다. 막상 사진을 찍는 당시에는 눈여겨 보지 않았었는데, 찍어온 사진 속에는 생동감 있는 질감의 표현 덕분에 사진에서 또 다른 표정이 느껴지는 것만 같다.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탁월한 왜곡 억제 성능과 수차제어를 보여준다는 자이스 2.8/21mm지만,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느정도 수차가 보일때도 있었다. 하지만 크게 눈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앞에서 이야기 했던 77리밋 렌즈로 같은 장면을 찍었으면 아마도 흰색 꽃이 아니라 보라색 꽃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물론 색수차라는건 어디까지나 디지털 바디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이다. 77리밋 역시 디지털에서는 심한 색수차 때문에 저평가 받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만, 필름 바디에서는 탁월한 선예도와 성능을 보여준다.
자이스 2.8/21mm 렌즈 역시 풀프레임 대응 렌즈다. 디지털에서는 크롭바디의 특성상 렌즈의 위력을 제대로 느껴보기가 어려웠지만, 다른 유저들의 말을 들어보면 필름 바디에 물렸을때 비로소 진가를 발휘한다고 한다. 현존하는 광각계열 렌즈들 중에서는 풀프레임 주변부의 왜곡 억제나 수차 억제, 선예도에 있어서 가히 최고의 성능을 가졌다는데... 서랍 한구석에서 조심스레 MX를 꺼내어 포트라 160NC 필름을 장전해 본다. 이번 주말에는 아무래도 오랜만에 필름을 써보고 싶을 것만 같은 예감이다.
'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작은 카메라에서 얻은 소중한 가르침, <나는 똑딱이 포토그래퍼다> (13) | 2010.09.02 |
|---|---|
| 여자친구 모델 만들기 대작전 w/TAMRON 70-200mm F/2.8 (31) | 2010.09.01 |
| [10문10답] Fujifilm FinePix F300EXR, 너에게 묻는다 (0) | 2010.09.01 |
| Carl ZEISS Distagon T* 2.8/21mm ZK, 제주에 가다 (12) | 2010.08.13 |
| 이젠 사진도 3D 시대다, 펜탁스 STEREO ADAPTER 3D 체험기 (8) | 2010.07.22 |
| 나의 첫번째 렌즈 : TAMRON SP AF 17-50mm F/2.8 (16) | 2010.07.13 |
| 진한 초콜렛 향기, 리미티드의 매력 속으로 - 헤링본 더 초콜렛 시덕션 리미티드 에디션 2010 (2) | 2010.07.09 |
| 야경 사진이 더 매력있는 다섯 가지 이유 (12) | 2010.06.09 |
| 어안렌즈(PENTAX DA 10-17)로 본 세상, 캠퍼스의 초여름 풍경 (16) | 2010.05.28 |
| 스티브 맥커리 사진전, 진실의 순간에 그들과 눈을 맞춰라 (10) | 2010.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