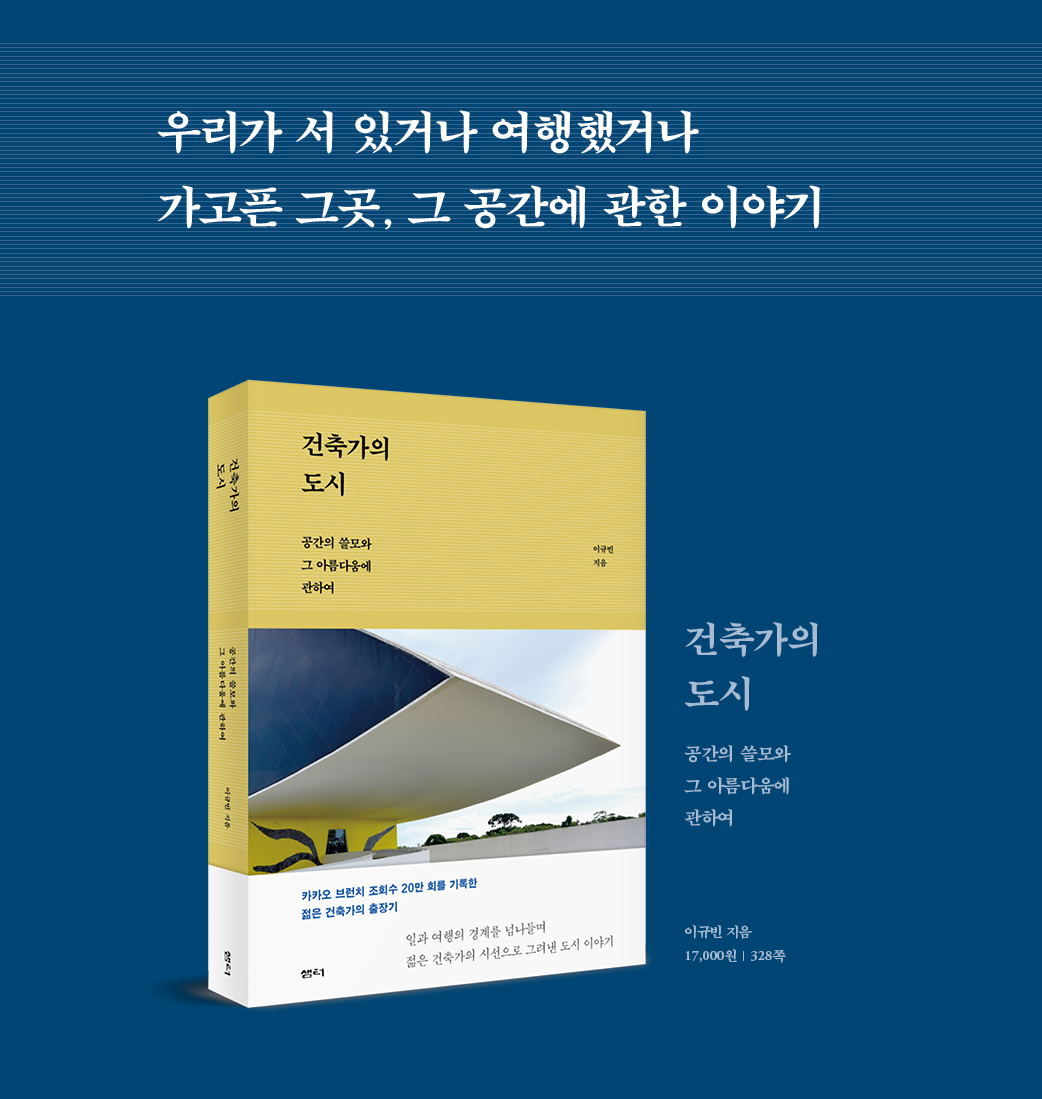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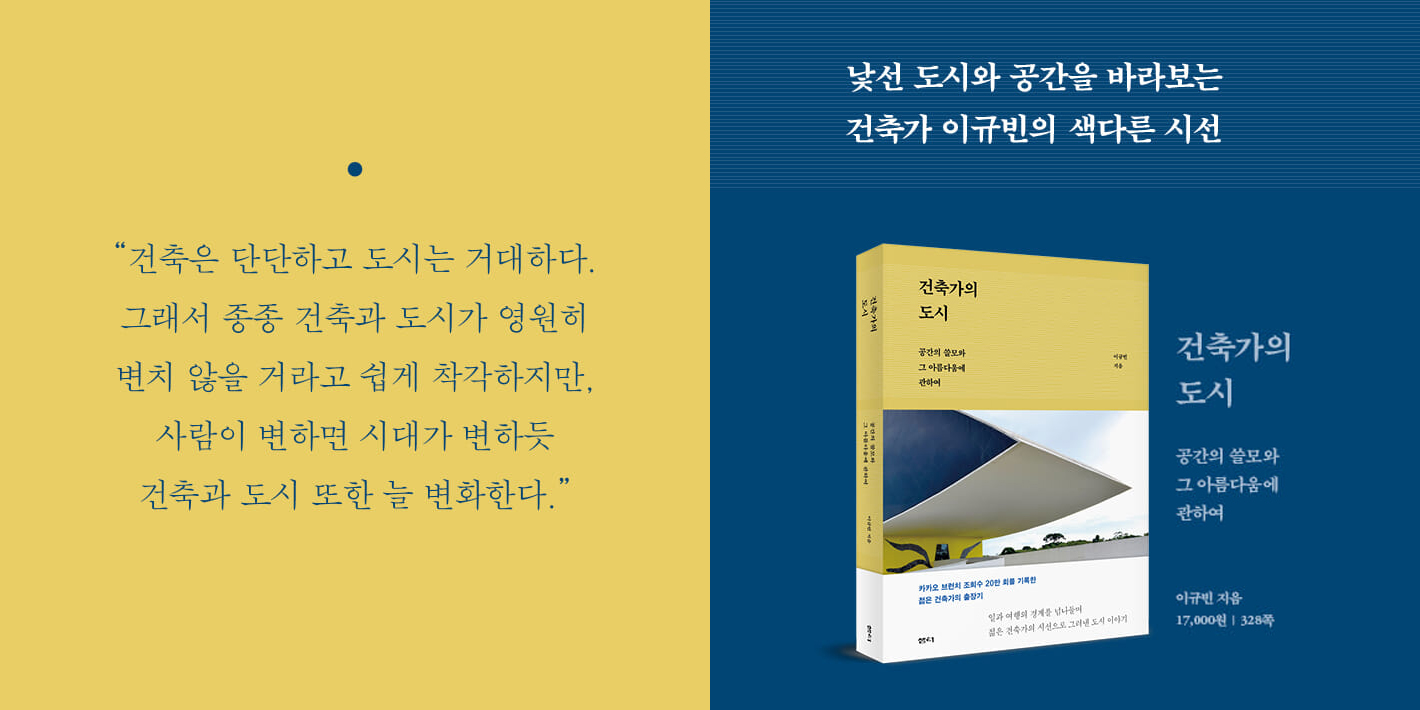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아프간 소녀'라는 이름의 사진 한 장. 어딘가 음침한 듯한 초록빛 배경과 대비되는 붉은 천을 얼굴에 두른 소녀. 아름다운 풍경도, 멋진 순간도 아니지만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느껴지는 것만 같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표지를 장식했던 이 사진 한장으로 대표되는 사진작가, 스티브 맥커리. 지금 그의 사진전이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미 전시가 막바지에 이르렀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모양이다. 가야지, 가야지 하며 통 타이밍을 못잡다가 지난 주말에서야 뒤늦게 혼자 사진전에 다녀왔다. 작은 규모의 소소한 사진전들은 몇 번 관람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큰 사진전은 난생 처음이다. 사진을 제대로 감상할 줄도 모르고, 아직 남의 사진을 비평할 정도의 깜냥도 안되지만 너무 좋았고, 또 인상 깊었기에 짧게나마 몇 글자 적어보려 한다.

(출처:www.stevemccurry.com)
똑같은 프레임 속에 담겨있는 그가 본 세상
그 유명한 '아프간 소녀' 사진. 사진 비평에 조예가 깊지 않은 나조차 얼핏 본 기억이 날 정도인걸 보면 그 파급효과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 할 수 있다. 조금은 어두컴컴한 전시장에는 수많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있다. 헌데 대부분의 사진들이 모두 같은 크기의 프레임 속에 들어가있다. 가로사진은 대부분 150x100, 세로사진은 100x75로 하나같이 일정한 규격이다(드물게 아닌 경우도 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다. 사진이라는게 인화하는 크기가 달라지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을텐데 왜 굳이 똑같은 프레임을 고집했을까.
그의 사진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마지막 사진에 이르러 뒤를 다시 돌아봤을때 어렴풋이나마 그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사진 속에 담긴 세상, 그가 본 세상은 화려함이나 꾸밈이 없는 자연스러움 그 자체다.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한 풍경, 마을, 도시, 그리고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는 하나같이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직시 하는 듯 했다. 일정한 규격으로 걸려있는 수 많은 사진들은 그가 찍은, 그가 발견한 세상 속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다. 과장되거나 강조되지 않은 진실이 담긴 사진들. 심지어 '아프간 소녀'사진은 다른 수많은 포트레이트들 사이에 한 장으로 전시되어 있을 뿐이다.

(출처:www.stevemccurry.com)

(출처:www.stevemccurry.com)
그의 사진은 프레임 속에 없었다
사진은 잘라내기의 미학이다. 모두가 똑같이 바라보는 둥근 지구위에서 어느 부분을 잘라 네모 프레임 속에 담을지를 결정하는 예술이다. 그래서 프레임 속에 담긴 대상이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보다는 프레임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상력이 사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의 사진 속 피사체는 분명 프레임 안에 담겨 있지만, 그가 말하고자 했던건 피사체가 아니라 그 주위를 둘러싼 사회, 문화, 환경, 그리고 사건들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전쟁, 기아, 유아노동. 이 모든 것들은 함축된 채로 피사체를 통해 추측만이 가능할 뿐이지만, 이를 통해 프레임 밖에 펼쳐져 있었을 더 많은 이야기들은 사진과 함께 자연스레 보는이의 가슴으로 전해져온다.

(출처:www.stevemccurry.com)

(출처:www.stevemccurry.com)
진실을 이야기하는 역설적인 도구, 색
일전에 매그넘 사진전을 관람할 기회가 있었다. 너무도 평범한 구도와 피사체들, 일상의 풍경을 있는 그대로 컴팩트 카메라에 담았던 그들의 사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평범하지 않았던 사진의 인상은 오래도록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었다. 맥커리의 사진 역시 비슷한 느낌을 준다. 다만 그의 사진에 힘을 더해주는 유일한 도구는 색. 인도에서 작업한 사진들이 많았던 만큼, 그의 사진 속에서 강렬한 색과 대비가 자주 등장한다. 그는 사진에 담고자 했던 세상의 이면, 알려지지 않은 무채색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오히려 강렬한 색채를 통해 말하고 있었다.

(출처:www.stevemccurry.com)
세상을 뒤집어 보는 전혀 다른 시선
그의 사진들은 한 번 보고는 특별한 감상이 떠오르질 않는다.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사진을 들여다 봤을때 비로소 사진 속 이야기들이 꿈틀꿈틀 머릿속에 그려진다. 사람들은 사진속의 인물이 어떻게 서있는지, 또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만을 읽어내려 한다. 하지만 그의 사진을 바라보다 보면, 가끔 이 사진을 찍은 작가는 대체 어디에 어떤 자세로 서 있었던 걸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의 대표작인 '몬순'시리즈도 그랬다. 목까지 잠길 정도로 불어난 강물,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기위해 노력했을 작가의 모습은 실로 경이롭기까지 하다.
아무도 생각치 못했던,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 그의 사진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출처:www.stevemccurry.com)
진실의 순간, 그들과 눈을 맞춰라
가지런하게 빗은 까만 머리칼.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꺼먼 얼룩이 묻어버린 셔츠.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어 권총을 머리에 들이대고있는 꼬마 아이. '페루 소년'이라는 이름의 이 사진 한장은 전시장을 나서면서 까지 자꾸만 나를 뒤돌아 보게 만드는 사진이었다. 눈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이 걸린 이 사진 앞에서, 한동안 발길을 뗄 수가 없었다. 저 아이는 대체 무슨 사연에서 저렇게 울고 있는걸까. 머리에 바짝 대고 있는 권총과 방아쇠를 당기기 직전의 손가락. 커다랗게 인화된 사진 속에서 아이의 눈동자는 너무나 맑고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사진과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다.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찍힌 아이의 사진 한장. 사람들에 떠밀려 점점 멀어지는 내 뒷통수가 자꾸만 따가왔다.
스티브 맥커리의 사진 속, 아이들의 눈에는 영혼이 살아 있었다. 비록 종이위에 인쇄된 사진일지언정, 그들과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교감할 수 있었고, 가슴속이 뜨거워지는걸 느꼈다.
'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칼자이스 Distagon 2.8/21mm ZK, 가볍게 써보는 개봉기 (8) | 2010.07.20 |
|---|---|
| 나의 첫번째 렌즈 : TAMRON SP AF 17-50mm F/2.8 (16) | 2010.07.13 |
| 진한 초콜렛 향기, 리미티드의 매력 속으로 - 헤링본 더 초콜렛 시덕션 리미티드 에디션 2010 (2) | 2010.07.09 |
| 야경 사진이 더 매력있는 다섯 가지 이유 (12) | 2010.06.09 |
| 어안렌즈(PENTAX DA 10-17)로 본 세상, 캠퍼스의 초여름 풍경 (16) | 2010.05.28 |
| 사진사의 섬세한 감정마저 담는다, 돔케DOMKE F-5XB Navy (4) | 2010.05.17 |
| 언니들의 로망, 펜탁스 옵티오 I-10 속사 케이스 - PENTAX Optio I-10 (8) | 2010.05.06 |
| 내가 찍은 필름 첫 롤에는 어떤 사진이 담겨 있었을까 (12) | 2010.04.29 |
| 사진을 즐기는 그대에게 바치는 토이 카메라, Holga 135BC TLR (10) | 2010.04.26 |
|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어주는 가방, 탐락 Aero45 #3345 사용기 (6) | 2010.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