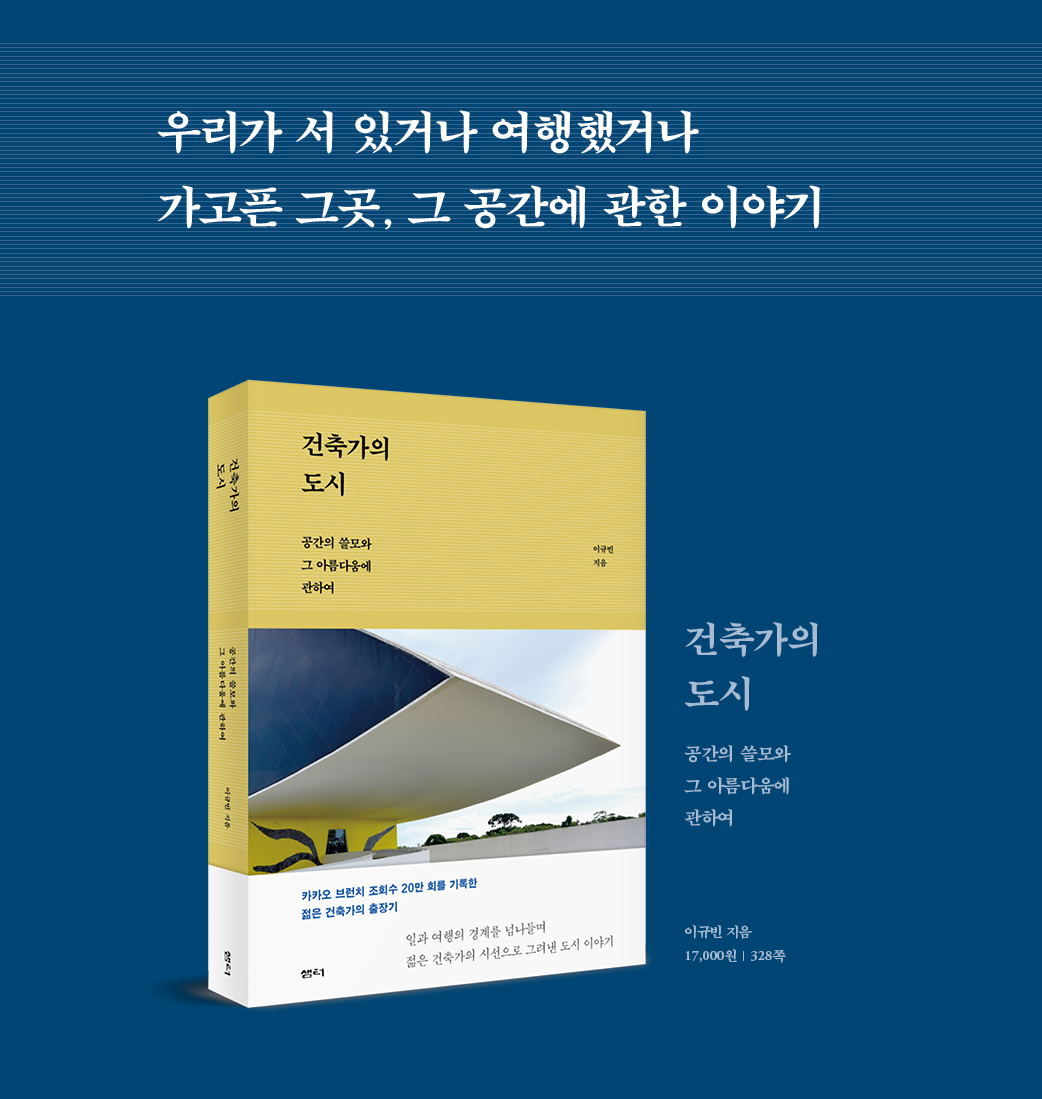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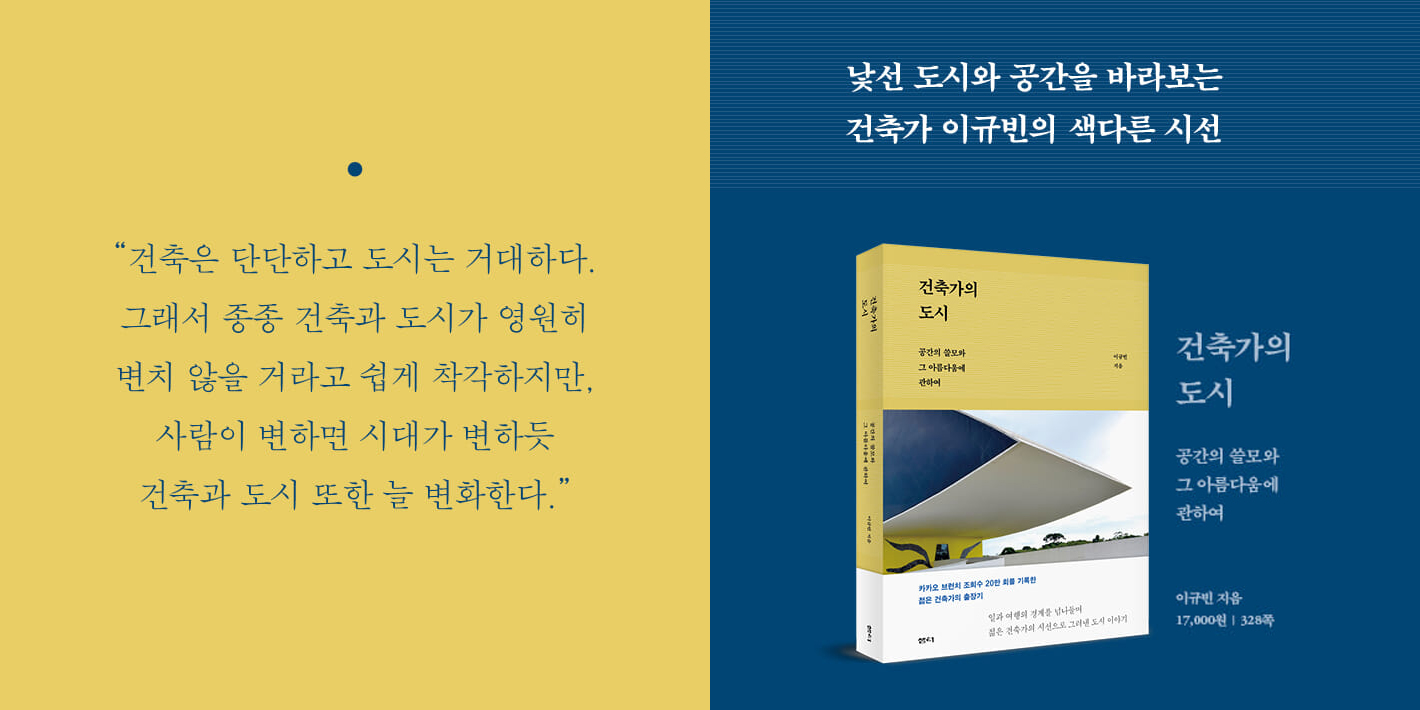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장대비가 쏟아지던 지난 주말, 카메라와 필름 몇개를 주섬주섬 챙기고선 집을 나섰다.
언젠가 한번쯤은 비오는날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사진을 찍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찾아온 셈이다.
오늘은 상도동 밤골로 향한다.
오래전부터 밤나무가 많이 자라서 '밤골'이라 불렸다는 이곳은 지금, 서울에 남아있는 몇안되는 판자촌중 한곳이다. 밤나무가 언덕을 따라 옹기종기 모여있던 밤골 언덕에는 어느샌가부터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살기시작했지만 그 언덕은 지금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재개발이 모두 끝나면, '밤골'이라는 이름은 그냥 이름만으로 남게된다. 모두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더 많이 사진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판자지붕 너머 뿌연 빗줄기속으로 아파트단지가 보인다
언제부턴가 서울의 오밀조밀한 골목길들은 '재개발', '정비'라는 이름하에 무식하게 파헤쳐지고있다. 더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것이라면 분명 뭔가 나아져야 할테지만, 반듯하고 깨끗한 아파트 단지가 차지해버린 그 자리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사라진듯한 허전함이 밀려온다.
밤나무가 자라나듯 밤골 언덕을 타고 하나 둘씩 생겨나던 작은 집들은, 그 모양새는 초라했을지 몰라도 사람이 '살기위한 집'이었다. '사는'사람들이 있었기에 이웃간에 정도있었고 사람사는 냄새도 났을지 모른다.

지붕위로 초록빛 식물들도 자라나고 있었다
하지만 허름한 판자지붕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에선 더이상 그런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곳은 더이상 '살기위한 집'이 아닌것만 같았다.
지하철 7호선 상도역에서 내려, 터널왼쪽으로 조그만 언덕길을 따라 걸으며 밤골에 들어선다.
비가 억수로 내리던 날이라 그런지 길거리에는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아, 더 쓸쓸했다.

그날따라 참 비가 많이 왔었다
뉴스에서는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상도동 지역 재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듯했다. 언젠간 내가 밟았던 이 골목길도 사라지고 네모반듯한 아파트만이 들어서게 되겠지. 마치 난곡에서 그랬던것 처럼 말이다.

완만한 언덕에 놓인 집들은 저멀리 풍경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상도동 한가운데 솟은 조그만 국사봉 언덕에 걸터앉은 밤골의 집들은, 사방으로 빽빽한 아파트단지 속에 고립되어있는 느낌이 들 정도다.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빼곡한 아파트 숲 한가운데서 마치 시위하듯,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굽이굽이 골목을 따라 걷다보면 길을 잃기도 한다
행여나 카메라가 물에 젖을까 커다란 우산을 쓰고 낑낑대며 사진을 찍다보니, 좁은 골목에서는 우산이 양 옆에 끼어서 지나가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좁고 조용한 골목에서 옆집 이웃을 마주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게 될것만 같았다. 겹겹이 포개진 담과 길, 그리고 집들은, 어디까지가 너의 집, 나의 집 이런 구분을 만들려하지 않는다. 옆집과 우리집 담사이에 생겨난 좁은 골목길은 옆집과 우리집이 함께 사용하고 만나는 또하나의 이웃집인 셈이다.
이웃간의 정이라는게 꼭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지는건 분명 아닌가보다.
살아가는 모습, 그 동네, 그 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사람냄새나는 정감있는 마을을 만들어낸다.

새로만든 도로팻말과 허름한 골목길의 아이러니한 만남
사진속에서 처럼, 서울시에서는 새주소 켐페인을 벌이면서 이곳 밤골에는 '신상도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골목골목마다 반질반질한 팻말을 붙여놓았다. 골목은 옛모습 그대로인데 길 이름만 새걸로 바뀌었다. 그 아이러니한 조화가 묘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밤골상회, 사장님은 요즘세상에 '상회'라는 이름의 가게는 여기뿐일거라고 말씀하신다
옆동네로 넘어가기 위해서 길을 묻기위해 들렸던 '밤골 상회'에서는 동네 아저씨 두분이 막걸리를 한잔씩 하고 계셨다. 비오는 날이라 그런지 막걸리가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다.
처음에는 커다란 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든 우리를 보시더니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신다. 골목길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다보면 이런 일이 종종 있곤 한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고, 카메라를 들고있는 우리들을 재개발과 관련한 사람들로 오해하기도 한다. 이럴땐 기분이 나쁘다기 보단, 마음이 조금 아프다. 착하고 순한 사람들을 누가, 왜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어버린 것일까...
어디서 왔는지 잘 말씀드리고 오해를 풀어드리자, 앉아서 맥주나 한잔 하고 가라고 하시며 우리를 들이셨다.
밤골에서 오래 살아오신 아저씨들 이야기들을 들으며 시원한 맥주를 한잔씩 들이키고 다시 출발했다.
이건 들은 얘긴데, 밤골 언덕 꼭대기에는 처녀만 잡아가는 총각귀신이 산단다. 그 앞을 지나갈때 여자들은 조심해야한다고 우스갯소리하듯 말씀해주신다.

밤골에서 만난 귀여운 강아지들
길을 걷던중, 바로 옆 창고같은 조그만 집에 강아지 울음소리가 들린다.
귀여운 강아지들이 무려 일곱마리나 있었는데, 하나같이 작고 앙증맞은 새끼들이었다.
강아지를 좋아하는터라, 사진찍는것도 잠시 잊고 강아지들이랑 놀아주며 신이 났었다.
가끔은, 근심걱정 하나없이 늘 즐겁게 뛰어노는 강아지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다. 사람들도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모두 다같이 잘 살수있다면 좋을텐데... 하면서 말이다.
'너희들도 밤골이 좋지?'

올라가던 언덕을 따라 다시 내려가는 길
밤골을 내려오는 길에 보이는 풍경속에 모든 내 느낌이 다 들어있었다.
가까이 보이는 비탈진 시멘트길과 슬레이트와 타이어로 덮어놓은 허술한 지붕. 금이가고 칠이벗겨진 벽을 타고도 꿋꿋하게 자라나는 이름모를 잡초들. 하늘위로는 전봇대에 엉켜있는 제멋대로인 전깃줄. 그 너머로보이는 빽빽한 아파트 숲과 뿌연 하늘...
같은 하늘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에게 보이는 풍경은 서로 너무나 다를지도 모른다. 언젠간 결국 밤골도 저렇게 아파트단지가 되어버릴거고 더이상 사진속의 풍경은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밤골'의 정겨웠던 삶, 풍경, 사람들을 기억하기나 할까...

밤골을 다 내려와서야 얼굴을 보이는 파란 하늘
밤골을 거의 다 내려올때 쯤, 하나 가지고있었던 흑백 필름을 다 써버리고 새 컬러 필름을 감아 넣었다.
하루종일 퍼붓듯이 내리던 비가 그치고 때마침 구름이 걷히며 파란 하늘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낸다.
밤골에서 보이는 하늘은 아까 봤던 뿌연 하늘이 아니라, 늘 이렇게 맑은 파란하늘이면 참 좋겠다.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이웃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작은 마을. 비오는날 걸었던 밤골은 아름다웠다.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누가 내 광장을 옮겼을까? - 광화문 광장에 대한 단상 (12) | 2009.12.10 |
|---|---|
| 법정스님 말씀따라 걸어보는 고즈넉한 사찰, 길상사 (17) | 2009.12.03 |
| 운길산 수종사에 오르면 두물머리가 한눈에... (13) | 2009.12.01 |
| 2:00AM, 노량진 수산시장 그곳에 가면 (24) | 2009.11.16 |
| 두물머리, 나룻배가 있는 풍경 (18) | 2009.11.09 |
| 기억까지 수리해드립니다, 예지동 카메라 골목 (19) | 2009.10.26 |
| 달동네 개미마을,이젠 빛 그린 어울림 마을이라 불러주세요 (24) | 2009.10.20 |
| 철공소거리에서 피어난 예술의 향기, 물레아트페스티벌 개막식을 가다 (8) | 2009.10.19 |
| 마누라없인 살아도 장화없인 못사는 동네, 중계본동 '104마을' (77) | 2008.08.07 |
|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중림동 약현성당 (9) | 2008.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