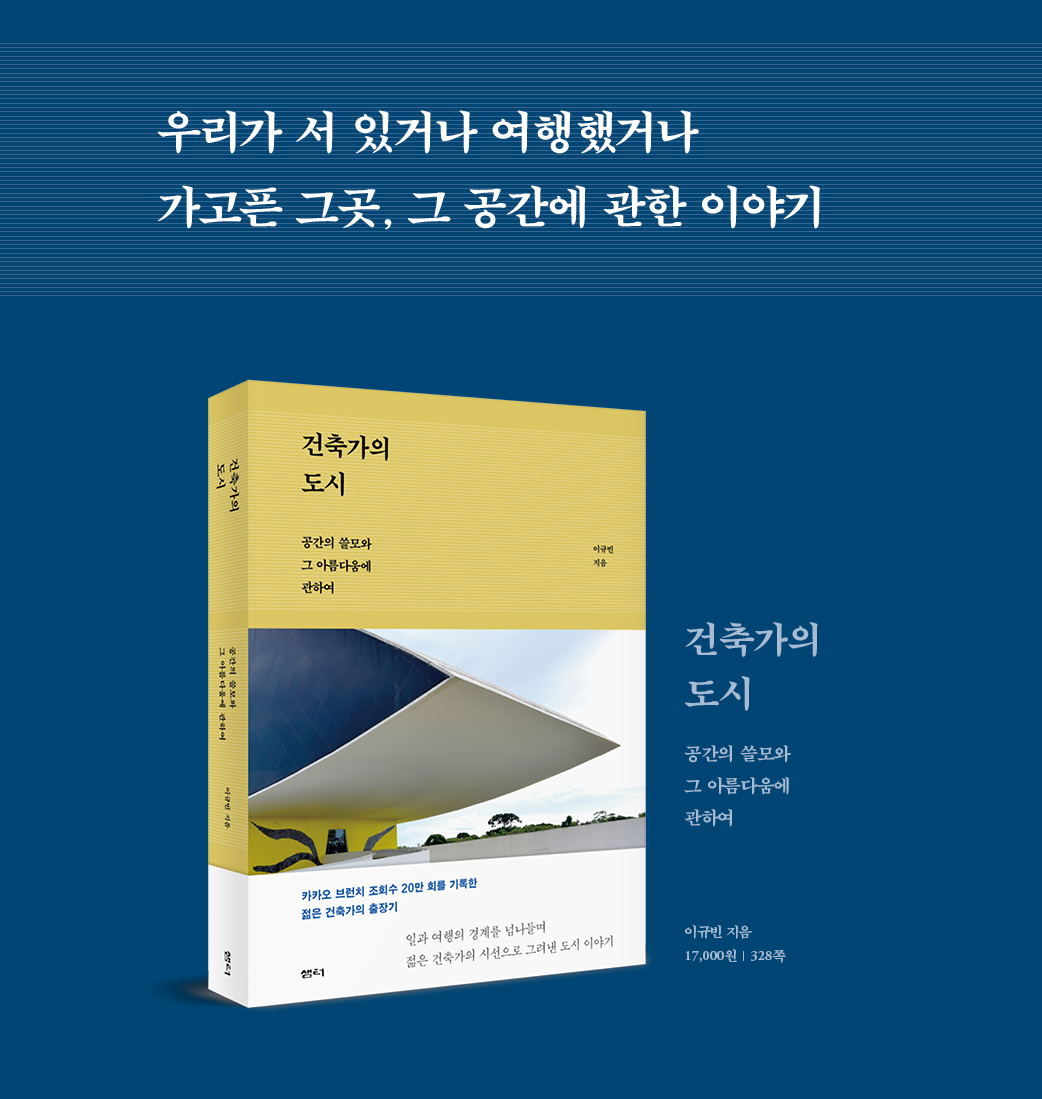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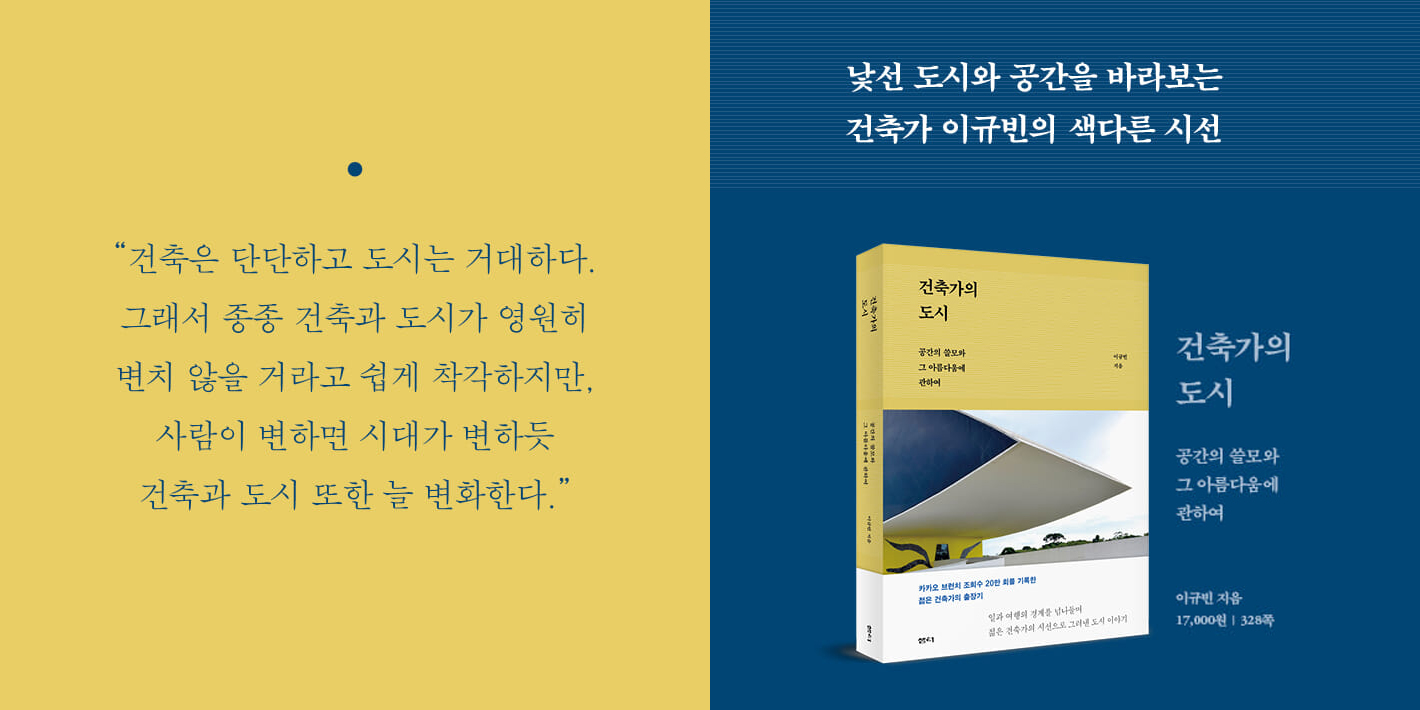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포트와인(Vinho do Porto, Port Wine)은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와인이다. 주요 생산지는 포르투갈 북부의 도우루 강 계곡이며, 중세 시대 포르투갈 제 2의 항구인 포르투(Porto)에서 영국으로 대량 수출되기 시작하며 '포트(Port, 항구) 와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대항해시대에 포르투갈은 포트와인 수출을 통해 막강한 부와 힘을 축적했다. 그리고 그 명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늘날에도 전세계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포트와인의 매력을 찾아 포르투를 방문한다. 와인에 그리 조예가 깊지 않은 우리 둘이지만, 오늘 만큼은 그 매력에 흠뻑 매료되고픈 마음이다.
포르투의 아침이 밝았다. 도우루 강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갑지만 사람들은 분주하게 저마다의 일상을 시작한다. 모두들 일터를 향해 시내 중심으로 향하지만 배낭을 맨 우리 둘만 반대로 강쪽을 향해 걷고 있다. 포트와인을 맛보기 위해 도우루 강변의 와이너리를 찾아가는 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포트와인의 주 생산지는 도우루강 근방이다. 때문에 모든 포트와인은 이곳 포르투의 항구를 통해 수출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도우루 강가에는 크고 작은 포트와인 생산자들이 운영하는 개별 와이너리를 만나볼 수 있다. 포르투를 찾는 관광객들은 이런 개별 와이너리를 방문해 유료 투어에 참가하여 각종 와인들을 맛보고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어제의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촉촉하게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느껴진다. 숙소를 등지고 도우루 강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 작은 내리막 골목을 따라 비슷해 보이지만 제각기 개성을 담은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연속적으로 펼쳐진다.
포르투 시내 한복판에 서 있는 표지판이 내 눈길을 사로 잡았다. 주요 관광지나 시내 중심, 여행자 안내 센터등을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제법 아기자기하고 복잡한 구도심 한복판에서도 시안성이 상당해서 초보 여행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유럽의 표지판들은 전반적으로 표현이 확실하고 눈에 잘 들어오는 편인데, 특히 남부유럽(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의 표지판들이 시원시원하고 좋았다. 지중해 연안의 화창한 날씨와 시원시원한 사람들의 성격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느낌이다.
지도를 보지 않고 중력이 이끄는 방향으로 몸을 맡겼다. 마치 강줄기를 찾아 물이 흐르듯 걷다보니 자연스레 강가에 도착했다. 도우루강을 바라보고 앉은 집들은 유난히 그 색이 화려했다. 문득 이탈리아를 여행하며 들렀던 베네치아 부라노 섬의 형형색색의 집들이 떠올랐다. 부라노 섬의 집들이 강렬한 색으로 칠해진 이유는 뱃사람들이 저녁무렵 섬으로 돌아올때 자기 집을 더 쉽게 찾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었었다. 포르투의 집들도 같은 이유일까.
포트와인을 맛볼 수 있는 개별 롯지(Lodge) 들은 강의 남쪽인 빌라 노바 드 가이아(Vila nova de Gaia) 지구에 밀집해있다.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진에 보이는 '동 루이스 1세 다리'를 건너야 한다. 파리의 에펠탑을 설계한 귀스타프 에펠의 조수가 1886년에 완공한 철교라고 한다. 설명을 읽어보고 나니 과연 에펠탑의 구조와 비슷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다. 두 개의 층으로 되어있는 다리 중 우리는 아랫쪽 보행통로를 따라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 우리가 왔던 곳을 바라보니 풍경이 더욱 좋다. 아까 본 형형색색의 집들이 한데 어우러져 포르투만의 특별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었다. 아직 시간도 이르고 해서 잠시 강가를 산책하며 경치를 마음껏 즐겼다.
강 위에 떠있는 수 많은 배들은 한때 실제로 포트와인을 수송하던 수송선들이라고 한다. 지금도 같은 기능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자세히 보면 각 배들마다 고유한 와이너리의 깃발이나 문양을 달고 있다. 강을 따라 걷다보면 자연스럽게 와인을 맛보고 싶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광고판 역할도 하는 것 같다.
우리는 그저 와인이 먹고싶은 굶주린 배낭 여행자들일 뿐. 별다른 지식이나 조예가 없는 사람들에겐 대중적인 것이 곧 최선의 선택일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수 많은 포트와인 로지중 제일 먼저 '샌드맨(Sandeman)'을 찾았다. 전날 숙소에서 검색을 좀 해본 결과 한국인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브랜드 같았다. 어차피 잘 모를 바에야 사람들 많은데로 가면 손해는 안보겠지 하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안에 들어가보니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보였다. 우리가 유난히 행색이 초라해서 였을까. 정해진 투어시간 외에는 구경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나왔다. 관광객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곳이라 그런지 고압적인 자세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차라리 시간이 안맞길 잘됐다 싶었다.
크게 실망한 우린 작적을 바꿨다. 이번엔 사람이 없고 소규모인 곳에 가보기로 했다. 방법은 무식하게 그냥 터덜터덜 헤매기. 무작정 언덕을 따라 작은 골목을 걷다가 아담한 집에 문이 열려있어 덥썩 들어갔다. 브랜드 이름은 Churchill's. 윈스턴 처칠 수상의 이름을 딴 포트와인 브랜드였다. 포트와인의 주요 수출국이 영국이었다더니 그래서 영국 수상의 이름을 붙인것 같았다. 글을 쓰며 다시 찾아보니 나름 인지도가 있는 포트와인 브랜드인 모양이다.
우리처럼 개별 로지를 찾은 관광객들은 와인 생산 및 저장시설을 돌아보는 투어를 하고 간단하게 서너잔의 와인을 맛볼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맛볼 수 있는 와인의 종류의 따라 가격대 차이가 좀 있는 편인데 우리는 제일 기본인 4유로짜리 프로그램을 선택했다.
와인 생산시설을 돌아보는 투어는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더 재미있었다. 규모가 작은 곳이라 투어 손님은 우리 둘 뿐이었다. 덕분에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하고 설명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흔히 생각하는 광활한 포도밭 한 가운데 있는 와이너리가 아니라, 복잡한 유럽의 구도심과 역사를 함께하는 와이너리라는 점이 인상깊다.
투어를 마치고 나와 이제는 마셔볼 차례. 나름 깨끗하게 잘 갇춰진 방에서 창 밖으로 도우루 방의 풍경을 바라보며 포트와인을 맛보게 된다.
우리가 선택한 4유로짜리 프로그램에는 총 세 종류의 와인이 제공된다. 첫번째로 달콤한 맛의 드라이 화이트(Dry White), 그 다음으로 황갈색의 토니포트 10년산(Tawny Port), 마지막으로 와인색 그대로의 리저브 포트(Reserve Port). 포트와인은 단맛이 좀 있는 편이라 주로 식전 와인으로 제공되거나 디저트와 곁들여 많이 먹는다고 한다. 마침 점심식사 전이라 참 맛있게 세 잔을 음미하며 마셨다. 사진에 보이는 비스킷과 초콜릿, 아몬드는 각각 세 종류의 와인과 잘 어울리는 궁합을 맞춰 제공되는 안주다.
포트와인이 일반적인 와인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는 18~20도에 달하는 '높은 도수'와 '달짝지근한 맛'이 있는데 이는 발효 과정에서 브랜디를 첨가하기 때문이다. 분류상으로는 이렇게 브랜디를 첨가하는 와인을 '강화 와인(Fortified Wine)'이라고 한다. 포트와인 이외에도 프랑스의 세리주, 이탈리아의 베르무트 등이 강화 와인에 속한다.
투어내내 참 열심히 설명해주고 친절했던 우리의 매니저. 테이스팅 하는 중간에도 열심히 설명해주는 모습에 진심으로 감동을 받아 처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 팁을 주고 싶었다. 혹시 결례가 되지는 않을까 조심스레 2유로를 건네며 '당신의 친절에 너무 감사해서 팁을 내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끝내 사양했다.
달콤한 포트와인에 살짝 취해서일까. 다시 나온 강가의 풍경은 아침과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어느새 구름이 걷힌 하늘은 새파랗게 변해 눈이 시릴 정도였다. 식전 와인도 맛봤으니 이제 제대로 된 점심식사를 할 차례였다. 메뉴는 어젯밤부터 진작에 정해놨었다. 바닷가에 왔으니 생선과 해산물을 먹기로!
다시 다리를 건너 강 북쪽으로 넘어왔다. 강가에는 노천 식당들이 즐비하게 들어서있다. 하나같이 멋진 파라솔과 테이블로 손님들을 유혹하는게 어쩐지 바가지 된통 쓸것같은 느낌이지만... 기분도 좋으니 기꺼이 그 바가지 뒤집어 써주기로 했다. 제일 경치가 좋은 곳에 딱 자리잡고 앉아 생선 구이 요리를 시켰다.
잘 기억안나지만 여행하며 먹었던 음식중에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었다. 전채요리로 홍합구이가 나오고 뒤이어 생선 구이가 한접시 가득 나왔다. 생선이 먹고싶었던건 맞지만 막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보니 너무 '구이' 일색이라 조금은 실망했다. 하지만 허기진 배낭여행자에게 음식은 늘 '질 보다는 양'이다. 나름 맛도 좋은 편이라 살 한점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렸다.
식사를 마치고 마드리드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러 공항으로 가는 길. 작은 헤프닝이 있었다. 공항까지 지하철로 한 번에 연결되어있어 별 걱정 안하고 여유를 조금 부렸는데 막상 걷다보니 지하철역이 너무 멀었다. 가까스로 공항으로 가는 열차를 탑승하고 보니 예상 공항 도착시간은 비행기 출발시간과 거의 비슷했다. 노심초사하며 공항에 내려 수속 카운터까지 전속력으로 뛰고, 또 출국장까지 뛰고 또 뛰어 가까스로 탑승 성공. 하마터면 포르투 공항에서 하룻밤 노숙할 뻔 했다.
겨우 반년이 채 못되게 살았지만 그래도 집은 집이다. 바로 옆 나라인 포르투갈이지만 마드리드로 돌아오는 길, 공항에서 다시 만난 스페인어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잠시 집을 비우고 여행을 다녀온 사이 내 방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있었다. 아까 공항에서 너무 뛰어서 였을까. 생선구이는 소화되어 온데간데 없고... 익숙하게 중국슈퍼에서 사온 라면과 맥주 한 캔씩을 저녁으로 먹고 우리는 다시 다음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다.(계속)
'여행 > '12 유럽배낭2'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황금빛 학문과 지성의 도시, 살라망까(Salamanca) (16) | 2015.05.12 |
|---|---|
| 메마른 고원 위의 시간이 멈춘 도시, 아빌라(Ávila) (4) | 2015.04.24 |
| 까사 다 무지카(Casa da Música), 포르투에 불시착한 우주선 (0) | 2015.04.16 |
| '세상의 끝'에서 얻은 작은 깨달음, 호까곶(Cabo da Roca) (4) | 2015.04.14 |
| 리스본(Lisboa) 2편, 비오는 리스본 -아닌 밤 중의 에그타르트 (3) | 2015.03.04 |
| 리스본(Lisboa) 1편, 트램여행과 뜻 밖의 규동 (6) | 2015.01.14 |
| 발렌시아(València) 2편, 칼라트라바와 '예술과 과학의 도시' (4) | 2015.01.12 |
| 발렌시아(València) 1편, 칼라트라바 없는 발렌시아 -프리투어 (4) | 2015.01.05 |
| 절벽 위의 도시, 스페인 꾸엔까(Cuenca) (2) | 2014.11.05 |
| 세계일주여행자 신현재와의 기막힌 동거! (15) | 201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