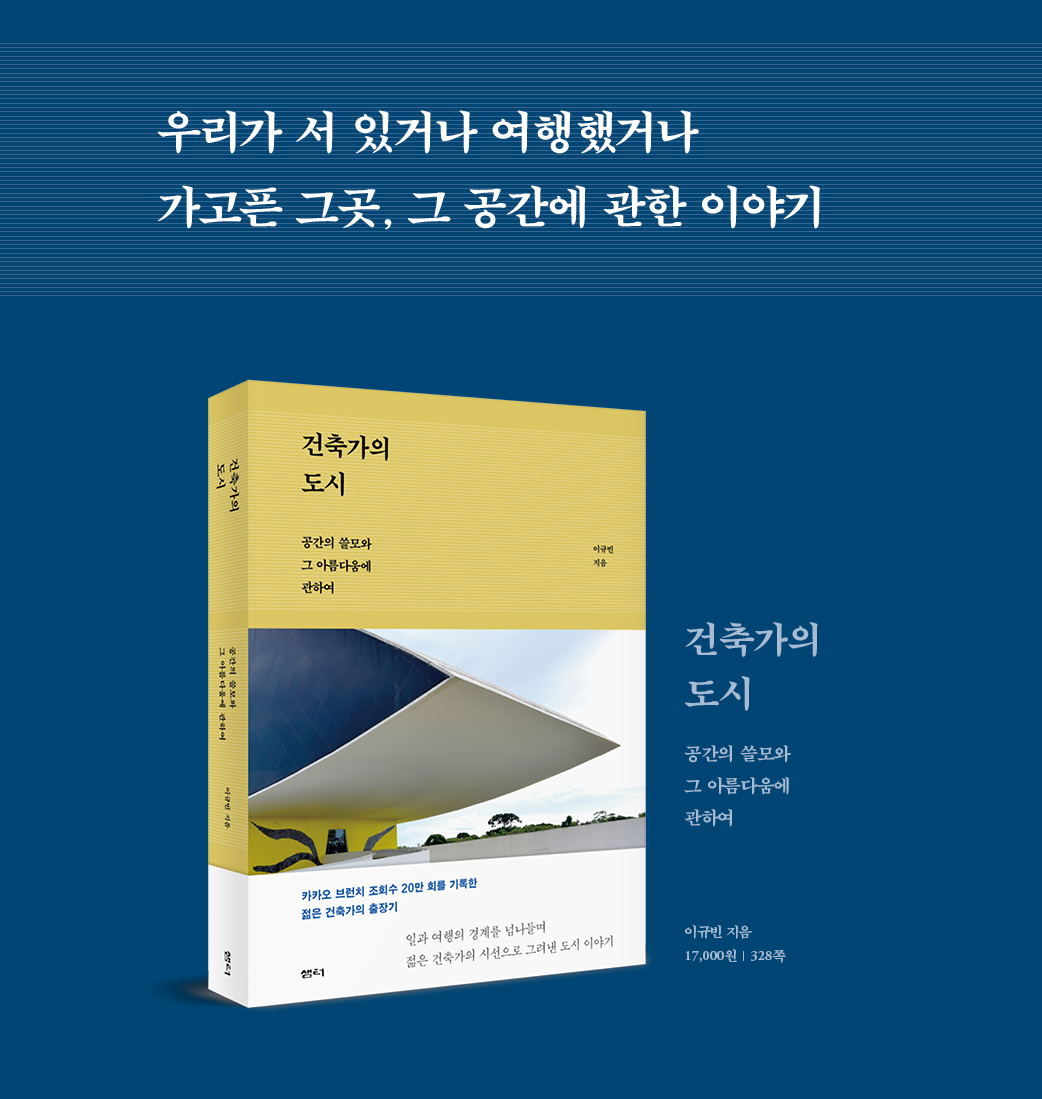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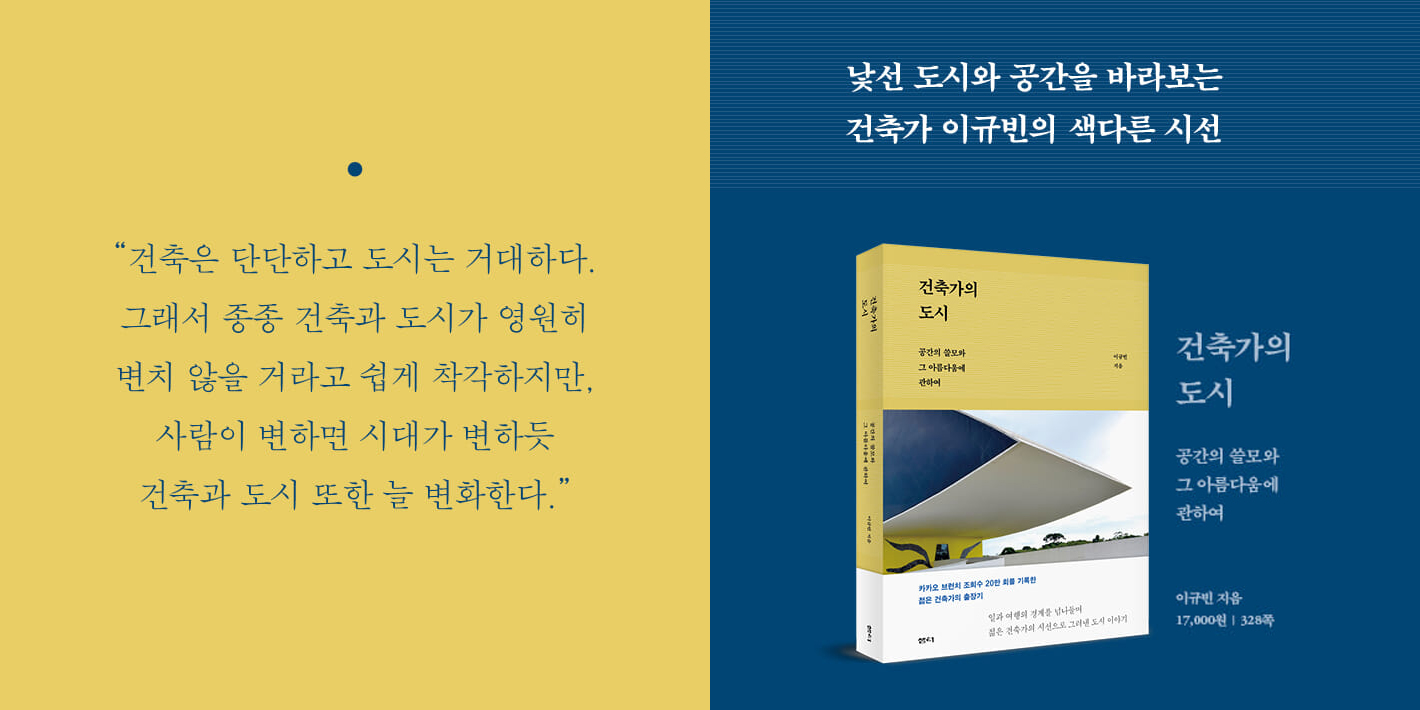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통영에서 남동쪽으로 26km. 시간이 멈춰진 언덕, 고요하다 우리가 묵었던 민박집, 소매물도에서 가장 싼 숙소이지 않았을까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대미를 장식하는 '소매물도'는 이제, 남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꼭 들러야할 명소가 되었다.
차를 타고도 너무나 먼 통영까지 가야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다시 한시간 반을 가야하는 섬중의 섬. 자칫 뱃시간을 잘못 맞추기라도 하면 꼼짝 없이 하룻밤을 묵어 가야하는 신세가 되어버리는곳이 바로 소매물도다.
그렇게 고생할 각오를 하고서라도 꼭 한번 찾아가 보고 싶은 그 곳. 소매물도는 참 특별한 섬이다.

'소매물도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배타고 소매물도까지 가는 길에 스친 풍경들을 포스팅을 했던게 작년 8월이니,
배에서 내려 소매물도에 들어가기 까지 꼬박 8개월이 걸린 셈이다^^;
소매물도에 다녀온지는 이제 꽤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마치 사진 속에서 영원히 정지되어 있는 풍경들 처럼
소매물도의 시간은 나에게 언제나 멈춰있는듯 느껴진다.

5박 6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결국 마지막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소매물도에서 보내기로 결정했다. 그 때 생각에는 모험이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의 하룻밤은 지금도 소중한 추억이 되어 마음속에 남아있다.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점점더 상업화되는 아쉬운 모습은 소매물도 에서도 똑같았다. 산비탈을 깎아 여기저기 팬션을 만드는 공사가 한창이었고, 이미 들어선 팬션들은 소매물도의 아기자기한 경치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보였다.
우리가 하룻밤을 묵은 곳은 머리가 하얀 할머님이 하시는 민박집이다. 말이 민박이지, 사실상 우리가 잤던 방은 거의 창고에 가까웠다. 하지만 외딴 섬에서의 하룻밤이라고 생각해보면 나름 운치도 있고 기분이 괜찮았던것 같다.
 |
 |
자가발전을 통해 낮시간에만 전기가 공급되고, 자정이되어 섬 전체에 전기가 끊어지고나면 깜깜하고 긴 밤이 시작된다.
하필이면 그렇게도 무더웠던 여름에 소매물도를 찾았던 걸까. 불이 들어오지 않는건 문제가 아니지만, 선풍기가 안틀어지는건 정말 참기 힘들었다. 참다참다 못이겨 집 밖으로 나와 빛하나 새나오지않는 깜깜한 섬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앉아있었다.
불켜진 집은 한 채도 없고, 불빛이라곤 배 대는곳 근처에서 밤낚시를 하는 사람들의 랜턴 불빛정도가 전부다.
내가 서울에서만 나고 자라 그런지, 난생 처음해보는 묘한 경험이었다. 달빛이 그렇게 밝은지도 처음 알았다.
여담이지만, 에어컨이 있다며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을 호객했던 팬션들 역시 전기가 끊어지는건 피해갈 수 없었나 보다.
훨씬 더 비싼돈을 주고도 똑같이 비지땀을 흘리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조금 고소하기도 했다^^;
 |
 |
작은 섬이지만 생각보다 등대섬으로 가는 길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험준한 바위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걷다보면 섬 뒷편의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조금씩 코끝을 스쳐오는게 느껴진다.

등대섬으로 가는길은 힘든 트래킹 코스이다
멀리 등대섬이 보이기 시작한다.
배를 타고 소매물도로 들어오는 동안 워낙 날씨가 흐려서 걱정을 많이했었는데, 등대섬에 가까워질수록 하늘이 더 파래진다.
푸른빛의 바다와 하늘, 그리고 물안개가 만들어내는 등대섬의 풍경은 황홀했다.
어디가 물이고 어디가 하늘인지 그 구분도 경계도 없이, 마치 등대섬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광채 같기도 하다.

망태봉에서 내려다본 바람의 언덕

등대섬으로 가는 아찔한 계단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이다. 망태봉을 한참동안 오르고 나면, 바람의 언덕으로 내려가는 나무계단이 나온다.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느즈막히 배를 타고 들어와, 저녁무렵이 되어서야 등대섬에 도착해 보니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귓가에 스치는 바람소리가 전부인 이곳에서 바다와 하늘, 초록빛 언덕을 혼자서 만끽해본다.

하늘로 향하는 길인지, 바다로 향하는 길인지...
간혹 국립공원 같은데에 가보면, 관광객들을 위한답시고 흉물스러운 철제 울타리를 해 놓아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경우가 많다. 소매물도 역시 그러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내심 했었는데, 바람의 언덕에 올라 보니 울타리도 참 예쁘다. 다행이다.
처음엔 길이 아니였지만,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자연스럽게 잔디가 자리를 비켜 만들어진 오솔길.
잘 닦아놓은 길보다 발도 아프고 신발도 더러워지지만 기분이 더 좋은건,
내가 걷는 이 길을 걸었던 다른 사람들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인걸까.

내가 불청객이냐, 네가 불청객이냐
오솔길을 걷다보면 가끔씩 이렇게 커다란 돌들이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자리는 원래 너의 자리였으니, 내가 조용히 비켜가는게 맞겠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의 언덕인지, 바람이 빚어놓은 풍경이라 바람의 언덕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후자이지 않았을까.
바람 부는대로 제멋대로 자란 풀들은 묘하게 기암절벽과 조화를 이루며, 내가 서있는 바로 이곳이 바람의 언덕이라고 작은목소리로 속삭이는 듯하다.

자연이 빚은 풍경앞에서 사람은 작기만 하다

자갈길을 따라 등대섬으로 향한다
등대섬은 원래 소매물도 본섬과는 별개의 작은 무인도다.
하지만 두 섬을 연결하는 70m에 이르는 자갈길은 썰물때면 물이 빠져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소매물도판 모세의 기적이랄까.
대책없이 물때 시간도 안보고 등대섬으로 향했었는데, 다행히 물이 완전히 빠져 있었다.
힘들게 산길을 건너 등대섬 앞에 도착했는데 물이 차서 못건너갔으면 어쩔뻔했어. 어휴

등대에 오르는 길고긴 나무계단
등대섬 꼭대기에는 말 그대로 새하얀 작은 등대 하나가 아담하게 서있다.
아직도 불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소매물도를 지나는 수많은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준 녀석은 이제 이곳을 찾는 이방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있다.
뭐 그리 잘생겼다고 이 등대를 보러 멀리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오는지, 참 행복해 보인다.

반갑게 손님을 맞아주는 꽃들
등대에 오르는 길을 따라가다 보니 노오란 예쁜 꽃들이 보인다. '나리꽃'이다.
하늘을 향해서 피어있는걸 보니 '하늘나리'인가보다.
기특하게도, 그 넓은 들판에서 하필이면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목에 '날좀 봐주세요' 하고 피어있다.

누가 소매물도를 아름답지 않다 할수 있겠는가
등대섬 꼭대기에 올라 뒤를 돌아보니 내가 걸어온 길이 한눈에 들어온다.
아무도 없는 섬에 혼자 있자니 왠지모르게 기분이 좋다. 보는사람도 없는데 괜히 멋있는 포즈도 취해보고 그렇게 등대섬에서의 짧은 시간을 보냈다.
더 오래있고 싶어도 자갈길이 물에 잠기기 전에 섬을 나가야만 한다.

진한 바다색이 참 시원스럽다

왠지모르게 하늘에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든다
아쉽지만 이제는 등대섬과 헤어져야 할 시간.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가면서 힐끔힐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게 된다. 볼때마다 다른 표정을 짓는듯한 등대의 모습이 자꾸만 떠나는 내 옷자락을 잡아 끄는것만 같다.

...
수평선아래로 점점 사라져가는 태양을 보며 자갈길을 다시 걷는다.
돌아가는 길, 망태봉에 올라 자갈길을 돌아보니 어느새 물속으로 거의 잠겨버렸다.
다시 혼자가 되어버린 등대섬의 시간은 오늘밤도 멈춰있겠지.

어제의 고단함을 말하는듯한 빨래들
그렇게 소매물도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가고, 아침이 밝아온다.
여름날 아침의 소매물도는 자욱한 바다안개에 둘러쌓여 마치 물 저쪽과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진다.
이곳에서 보낸 하룻밤은 소매물도에게도, 나에게도 멈춰진 시간이었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서, 느릿느릿 흘러가는 시간속에 내몸을 맡기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이건 소매물도가 나에게 준 큰 선물이 아닐까.
TV도, 인터넷도 없는 소매물도의 아침은 한없이 고요하다.
지저귀는 새소리는 진정한 아침을 맞는게 무언지 새삼 깨닫게 하고,
아침식사로 라면을 끓여먹은 우리들에게 밥을 먹이지 못해 미안해하시는 주인 할머니의 말 한마디는 미소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소매물도에서 난 참 행복했던것 같다.
'여행 > '08 남도기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대한 자연의 숨소리 앞에 심장이 떨린다, 창녕 우포늪 (18) | 2009.10.08 |
|---|---|
| 논개가 마지막으로 본 풍경은 어땠을까, 진주 촉석루 (14) | 2009.04.22 |
| 땅끝에서 만나는 이국적인 풍경, 남해 독일마을 (8) | 2009.04.20 |
| 그녀도 반해버린 쪽빛 바다, 남해 드라이브 코스 (32) | 2009.04.17 |
| 배타고 한시간 반, 소매물도 가는 길에 만난 소소한 풍경들 (10) | 2008.08.20 |
| 벽화로 새롭게 태어난 바닷가 달동네, 동피랑 (20) | 2008.08.16 |
| 시가 꽃이되어 피어나는 곳, 고창 돋음볕마을 (33) | 2008.08.04 |
| 옛 선인의 숨결을 찾아, 고창 고인돌마을로 (9) | 2008.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