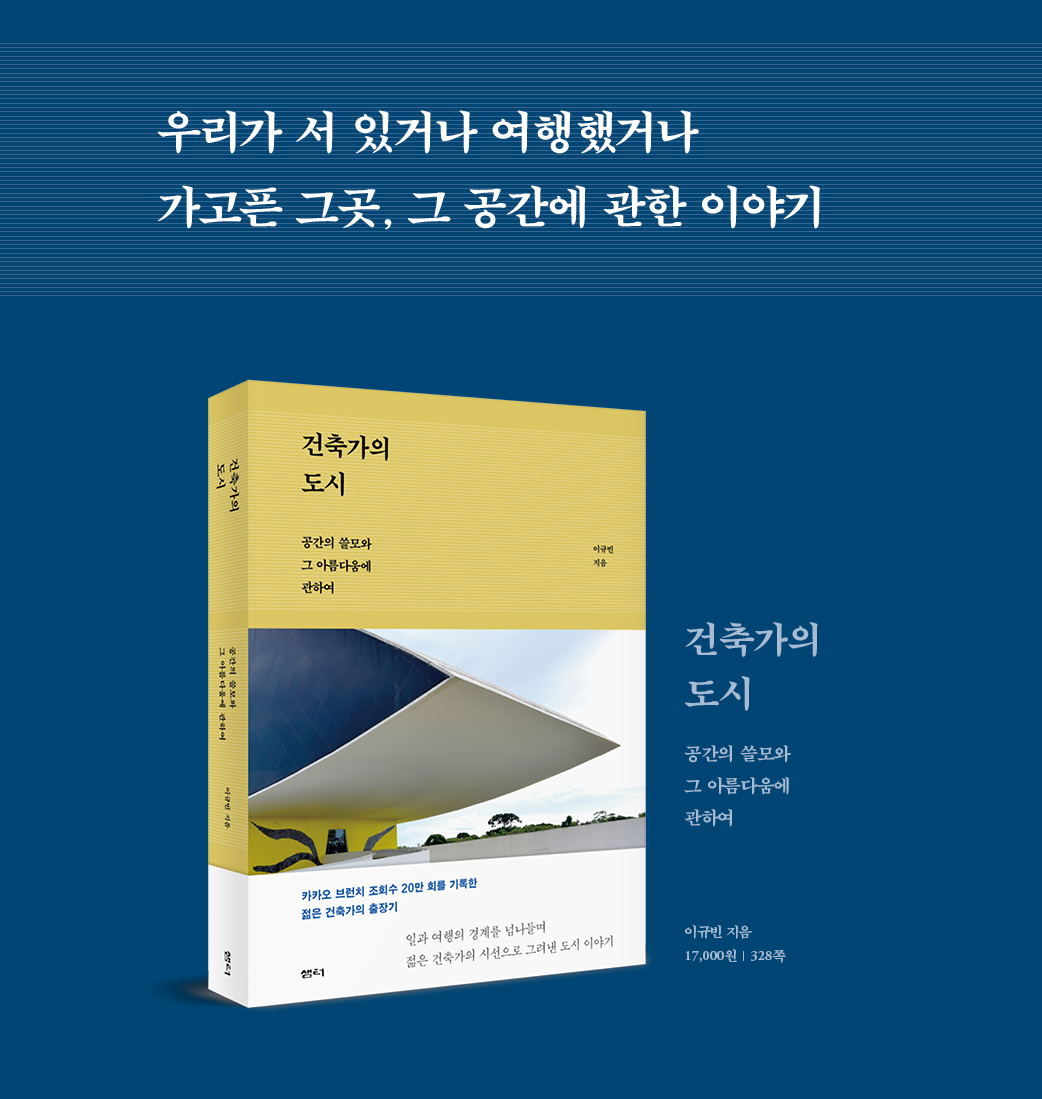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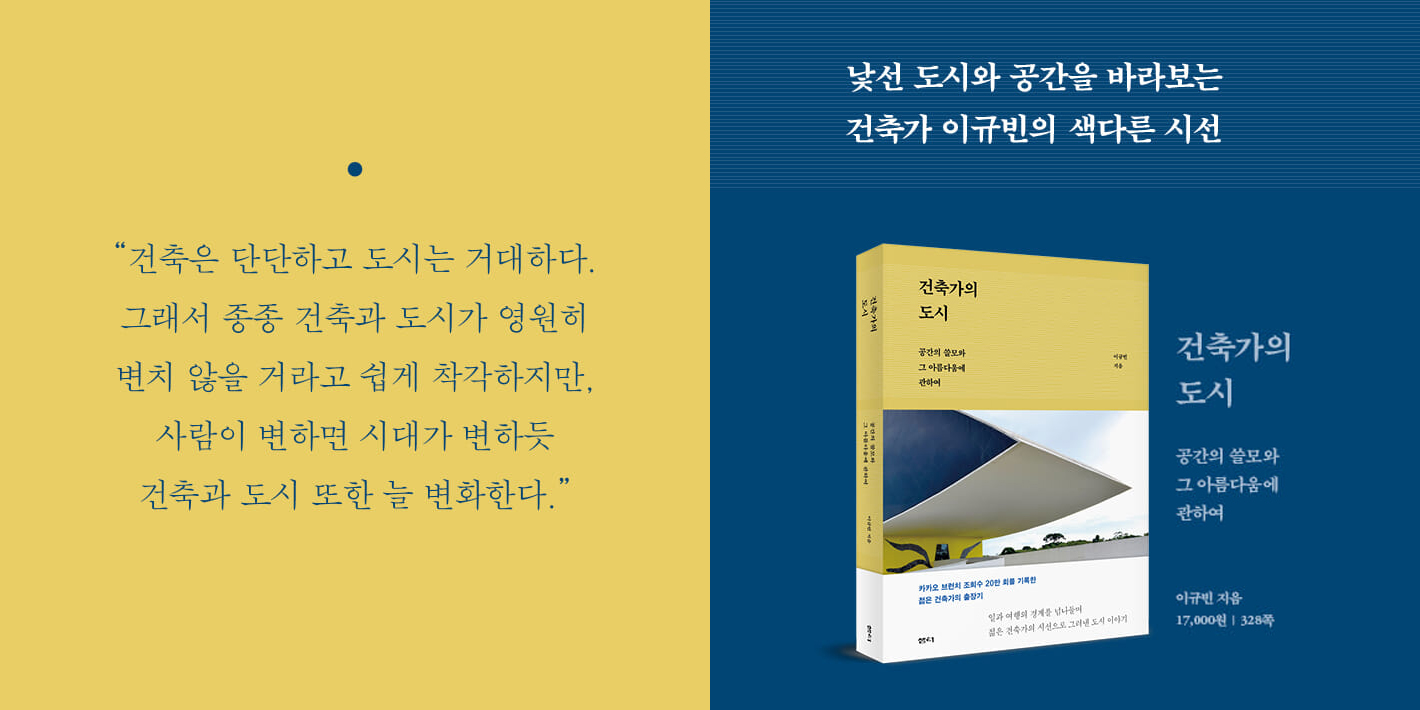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지금시각 아침 8시 35분, 7월 20일.
나는 인터라켄 서역에서 바젤로 가는 intercity 기차에 앉아 창밖의 튠 호수를 바라보며 이 글을 쓰고있다.
그날의 기록은 자기전에 꼭 하고 싶었지만, 피곤에 지친 내 몸은 이내 잠들고 만다. 중간중간 기차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밀린 일기를 쓰듯 어제 하루를 되돌아 보곤 한다.
내가 계획한 유럽 배낭여행 전체 일정에서, 스위스는 꼭 가볼만한, 봐야할만한 관광지도 없는것 같았고 날짜상으로도 중간쯤 위치해 있었기에 그저 마음 편안하게 잠시 쉬어가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스위스에 온 후로 가장 큰 일(?)을 해야하는 날이다. 바로 융프라우요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는 2744m의 백두산을 훌쩍 넘는 해발고도 3271m의 알프스의 정상.
(실제 융프라우요흐의 정상은 4000m를 훨씬 넘으며, 3271m는 전망대가 있는 높이이다.)
놀랍게도 이곳을 기차로 직접 올라간다.
알프스를 오르는 산악기차의 요금은 한화로 약 10만원 정도. 기차를 타고 정상에 올라도, 날씨가 흐리거나 눈보라가 많이 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대로 내려와야 한다는 말을 친구에게 들었던 터라 걱정되는 마음으로 기차표를 구입했다. 날씨가 화창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행하는 내내, 한여름 무더운 날씨속에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이곳저곳 쉬지않고 걸어야 했기에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만년설 위에서 뒹굴어 보며 시원하게 날려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TV속의 융프라우요흐는 하얀 눈보라로 한치 앞도 안보이는 상황이었기에 올라갈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맑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나름 멋진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마도 아침의 그 화면은 너무 이른 시간이라 기온이 낮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서 그랬던게 아닐까.
인터라켄(interlaken)은 두 개의 큰 호수와 알프스의 높은 산봉우리 사이에 위치한 작은 산속 마을이다.
이곳의 지명 interlaken은 뜻 그래도 '호수 사이에'라는 말이 된다.
인터라켄의 동쪽으로는 브리쯔엔 호수, 서쪽으로는 튠 호수를 마주하고 있다. 옆에 큰 호수가 있어서 그런지 이른 아침 인터라켄은 새하얀 안개가 폭신한 솜처럼 마을 전체를 감싸 안고 있었다.
인터라켄의 아침은 안개속에서 희미하게 밝아온다.
너무 고요해서 성스럽기까지 한 아침안개를 헤치고, 강 옆으로 난 조그만 산책로를 따라 걸어간다.
인터라켄 ost 역에서 9시 20분에 출발하는 그린덴발트행 기차를 탔다. 앞서 타는 열차는 일반 열차지만, 이후 산악열차로 갈아타야 한다.
그린델발트까지 가는 내내,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참 아름다웠다.
당장이라도 소리치면 저 멀리서 하이디가 달려나와 반갑게 맞아줄것만 같은 풍경. 한참동안이나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상상을 하다가 이내 잠이 들었다. 눈을떠보니 벌써 그린델발트에 도착해 있었다.
그린덴발트는 산 중턱에 위치한 조그마한 마을이다. 융프라우요흐를 오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지만 관광지라기 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곳에 가깝다.
'이렇게 높은 산악 지대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잠시 마을을 둘러보는데, 병풍처럼 마을 전체를 감싼 하얀 알프스의 절경이 마을과 참 잘 어울려 보인다.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해발 1000m 이상은 올라와 있는것 같았다.
역 앞으로 펼쳦니 웅장한 봉우리들의 꼭대기에는 알프스의 빙하와 만년설로 하얗게 덮여 있었다.
푸른 초목으로 덮인 낮은 산들과, 거대한 바위로 된 봉우리, 그리고 하얗게 덮인 만년설이 만들어내는 알프스의 풍경은 파란 하늘 아래서 더욱더 아름다워 보였다.
인터라켄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한참을 올라온 높은 곳이었지만, 걸어서 이곳까지 하이킹을 하시는 분들도 주위에 많이 보였다.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된 사람은 바로 사진속 '자전거 아저씨'
웃통을 벗어던진 터프한 모습으로, 맨몸에 배낭하나 달랑 메고 자전거로 알프스를 오르던 모습은 너무나 멋지게 보였다. 언젠간 꼭 자전거로 유럽을 다시 찾고픈 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걸까, 나도 모르게 환호를 보내며 있는 힘껏 박수로 응원을 해 드렸다.
융프라우를 다니는 산악열차는, 보통열차는 다닐 수 없는 20도 이상의 급한 경사를 잘도 올라다닌다.
구불구불 깊은 산속을 다니는 열차도 신기하지만, 이 험한 산속에 철로를 놓을 생각을 어떻게 했던걸까...
열차를 갈아타고 어느정도 오르다보니 창밖에 멋진 풍경과는 안녕이고, 7km나 계속되는 컴컴한 산속 동굴로 들어선다. 이 동굴이 바로 산 아래와 정상의 날씨를 구분짓는 경계선인것 같다. 동굴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추울줄 알고 입고있었던 긴팔 후드티가 너무 더워서 후회하고 있었는데, 막상 동굴안에 들어오고 나니 담요를 뒤집어 써도 몸이 후들후들 떨린다.
동굴을 따라 정상에 오르는 도중에는 간이 정거장이 두 군데에 있다. 열차는 간이역에서 5분씩 정차하게 되고, 역 내부에는 밖을 볼 수 있는 커다란 창문이 있어서 지금 내가 어디쯤 왔는지 알게 해준다.
궁금해서 창문밖을 살짝 바라보니, 동굴에 들어오기 전 푸른 목장들은 온데간데 없이 눈보라가 세차게 부는 하얀 설원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만년설 위에 올라와 있었던 거였다.
드디어 3271m, 융프라우요흐에 올랐다.
전망대에서 문을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매서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내 볼을 스친다. 순간 나도모르게 깜짝 놀라 문을 다시 닫아 버렸다. 바깥 날씨는 생각보다 많이 추웠다.
몇일전까지만 해도 반팔티를 입고도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던걸 생각하면, 한여름에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겨울이 신기하기만 할 뿐이다.
전망대에 오르니, 발 아래로는 천길 낭떠러지인데다가 어딜 둘러봐도 하얀 만년설이다.
생각보다 훨씬 추운 날씨에 카메라마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버렸다. 만년설이란 이런 느낌이었다.
융프라우요흐에 오르기 전, 바로전날 산을 다녀온 친구들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친구들 말로는 기차를 타기전 역앞에서 맥주를 한캔씩 사서 올라가라서 정상에 도착하거든 만년설 속에 맥주를 묻어두었다가 살짝 살얼음이 언 맥주를 꺼내서 마셔보라는 것이었다.
맥주를 참 좋아하는 나는 또 '살얼음'이라는 말에 끌려서 맥주를 두캔 사서 올라갔다.
정상에 오르자마자 눈속에 맥주를 묻어두고, 눈밭에서 사진도 찍고 뛰어 놀았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시 꺼낸 맥주는 정말 살얼음이 살짝 얼어서 차가워져 있었다.
해발 3271m에서 마시는 짜릿한 맥주한모금, 그 맛은 정말 잊을수가 없다.
정상에서 보내는 시간은 즐거웠지만, 이내 고산병으로 고생해야만 했다.
머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조금 빨리 산을 내려오기로 했다.
산악열차를 타고 다시 내려와, 인터라켄으로 가는 다른 길을 택했다.
역시 그린델발트처럼 작고 아담한 마을이었던 라우터브루넨을 거쳐서 저녁시간이 다 되어서야 인터라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자연이 만든 거대한 작품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아져 버린다.
하지만 인간은 그 자연앞에서 무릎꿇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한다.
대 자연을 이기려 하는건 바보같은 짓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치 평행선처럼 자연과 인간이 나란하게 공존하면서 영원히 아름다운 모습이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곳에서 조금은 배운것 같기도 하다.
융프라우요흐 반 기차비 125 chf
저녁 불고기덮밥 15 chf
맥주 4.8 chf
'여행 > '07 유럽배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브 몽땅과 샤갈이 사랑한 마을, 생폴 드 방스 (12) | 2008.07.18 |
|---|---|
| 푸르른 지중해로의 초대, 아름다운 해변 니스 (4) | 2008.07.16 |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롱샹 성당을 아시나요 (16) | 2008.07.15 |
| 스위스 튠호수에서는 멋진 유람선 관광이 공짜? (20) | 2008.07.09 |
| 알프스에서 만난 계란만한 우박세례_스위스 인터라켄 (38) | 2008.07.08 |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 스위스의 도시 이야기 (134) | 2008.07.07 |
| 붉은 지붕이 아름다운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 (10) | 2008.07.06 |
|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의 정체는? (20) | 2008.07.05 |
| 환락과 사치, 유흥으로 물든 고대도시, 폼페이를 찾아 (0) | 2008.07.04 |
|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 로마를 찾아서 (4) | 2008.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