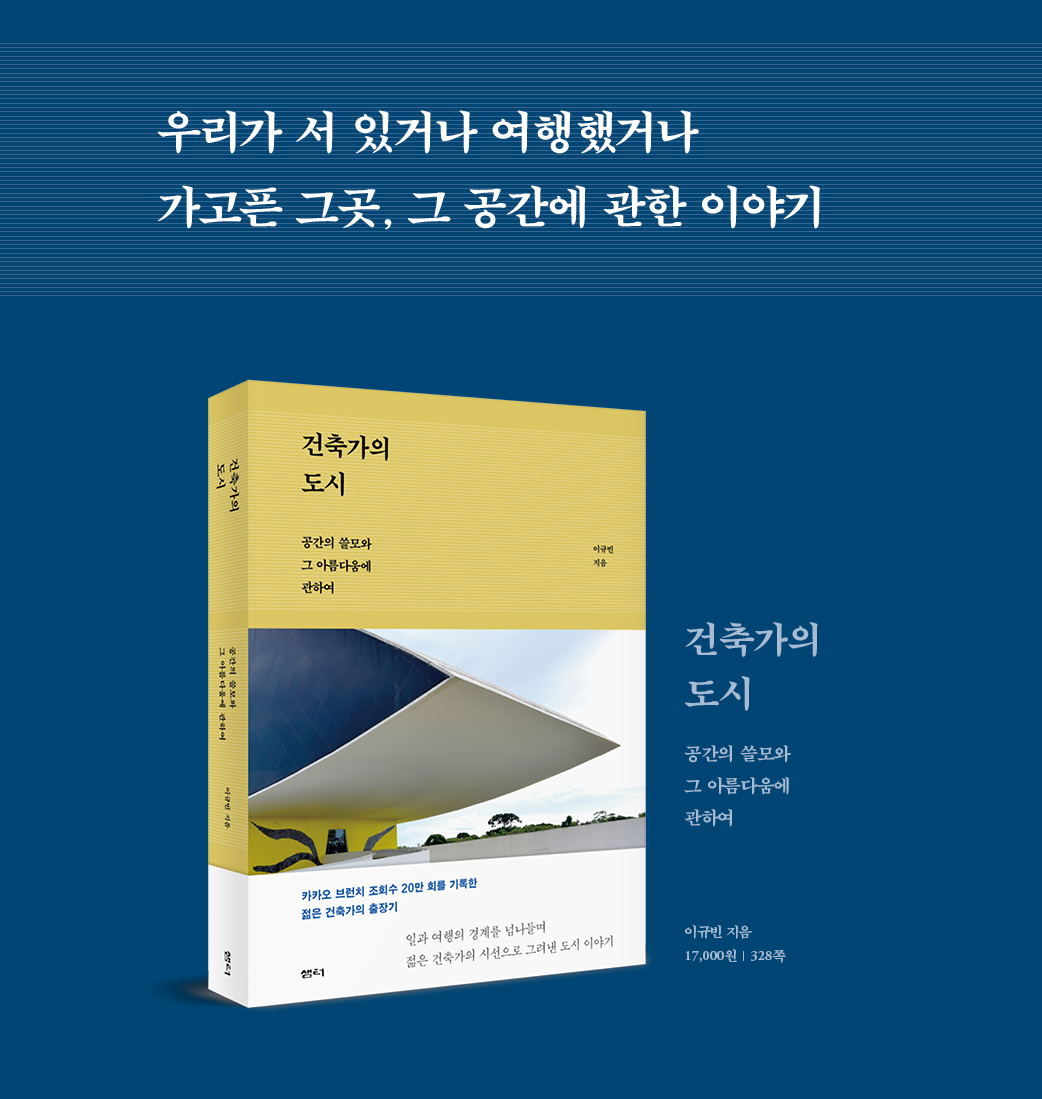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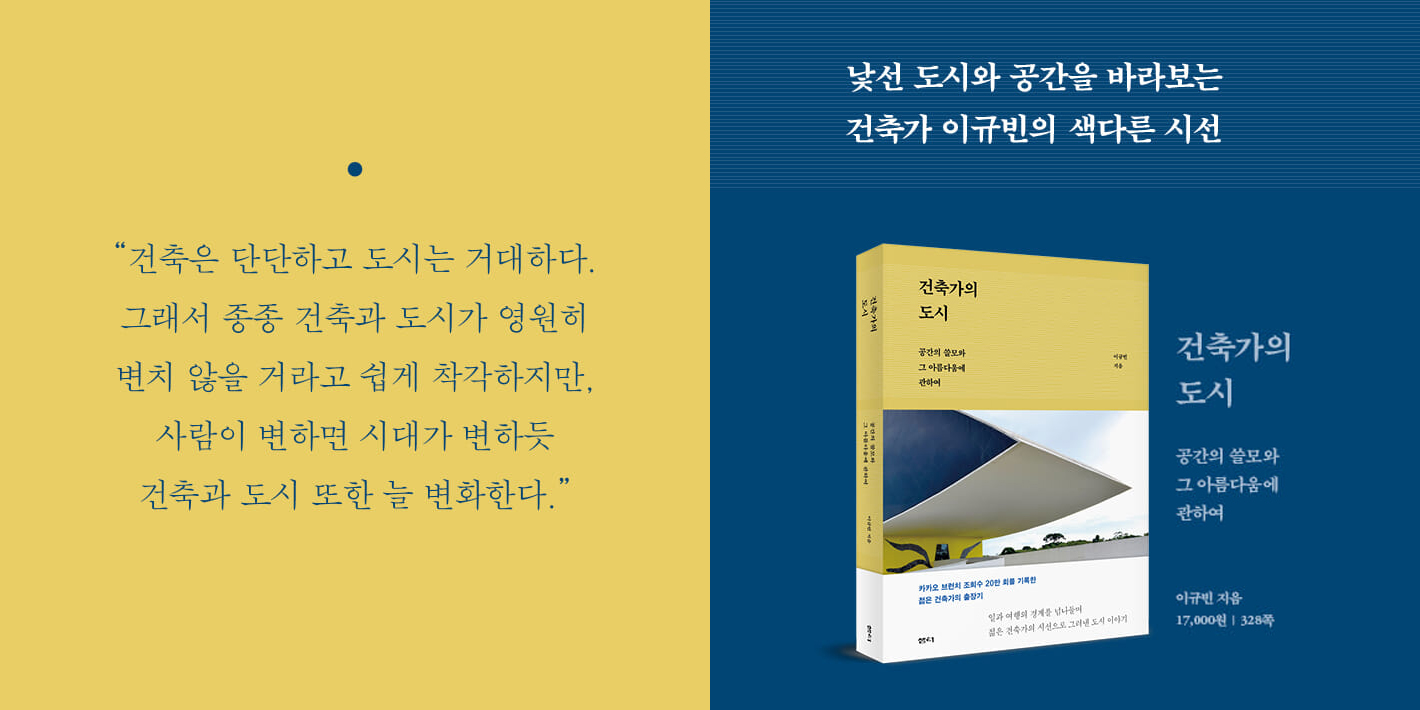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누구나 마음속에 동경하는 나라 하나 쯤은 있기 마련이다. 그 나라에 가보고 싶고, 살아보고 싶고, 보고 싶고...
나에겐 '스위스'가 바로 그 나라였다.
알프스 산악지대에 자릴 잡은 작은 나라지만, 4개의 언어를 쓰는 민족이 26개의 칸톤을 이루어 살고있는 그곳.
한번도 가본적은 없었지만 늘 마음속에 품고있던 그런 나라였다.
드디어 오늘이다.
20년간 동경해온 바로 그곳 스위스를 찾아가는 날이다.
스위스의 일정은 3일을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첫번째 날로 스위스의 정겨운 사람냄새를 맡으러 간다.
생태도시
피렌체에서 야간열차로 밤새 달려와 가장먼저 만난 스위스의 관문은 '취리히'였다.
스위스의 자연 환경은 너무도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다. 커다란 취리히 호수가 도심과 바로 접해있고, 커다란 배들이 호수위를 여유롭게 떠 다닌다.
이른 아침, 우리나라같으면 출근시간 한창 붐빌 때이지만 이곳 사람들은 어찌 그리 여유로운지,
낮선 이방인 여행객인 내가 그곳에서는 제일 바쁜 사람인것만 같았다.
스위스에는 호수가 정말 많다.
대부분의 도시들은 하나쯤 큰 호수를 끼고 있으며, 호수를 이용하는 방법도 가지각색이다.
이곳의 호수 대부분은 에메랄드 빛 초록색을 띠고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다.
빙하 속에 얼어있는 물들은 빙하의 무게때문에 강한 압력을 받아서 중수소나 삼중수소가 결합된 '중수'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녹으면 보이는 것처럼 초록색 빛깔이 나게 된단다.
거리 곳곳마다 걸려있는 스위스 국기와 취리히 칸톤의 문장기.
내가 스위스에 와 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되새겨 준다.
지금 까지 여행했던 여러 도시들 중, 스위스는 가장 그 색깔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곳이다.
스위스가 EU에도 가입되어있지 않고, 오래전부터 '중립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서일까,
화려한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는 도시라기 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색깔을 무난하게 모두 담아줄 수 있는 캔버스 같은 포근한 느낌의 도시였다.
어쩌면 이런 스위스의 모습때문에 중립국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걸지도 모르겠다.
소박했다. 도심을 걸어보아도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용한 도시였다.
거리의 모습도, 차들도, 건물도 모두 소박하다. 하지만 소박한게 나쁜건 아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스위스를 찾는 나같은 이방인에게 마저도, 마치 친근한 얼굴로 다가오는 친구같은 곳이었다.
스위스는 예로부터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던 곳이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자연을 제압하기보다는 자연과 어우러짐으로 서로가 함께 살 길을 찾았던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도 상통하는 점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취리히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정말 많았던 도시다.
국가와 도시차원에서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이 함께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 지금의 우리나라가 배워야할 태도인것 같았다.
루째른으로 가기 전에, 취리히 대학교에 잠시 들러 캠퍼스를 거닐어 보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속에서 학문을 하는 학생들이 참 좋아 보였다.
그냥 하는 말일지도 모르지만, 정말 한번쯤 교환학생으로 와서 공부해보고픈 그런 도시였다, 취리히는.
젊은도시
취리히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루째른으로 넘어왔다.
오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인터라켄, 루째른은 취리히와 인터라켄의 중간쯤에 위치한 도시이다.
취리히보다는 훨씬 활기찬 모습의 도시였다. 길을 걷고있으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관광객들에게는 이곳이 취리히보다 훨씬 더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특정한 스팟이나 유적들 보다는, 도시의 분위기와 정취 그 자체가 관광상품은 스위스의 도시들 중에서는 그나마 루째른에선 볼거리가 많은 편이기 때문이다.
'빈사의 사자상' 루째른의 상징이란다. 사실 그렇게 큰 감흥은 없었지만 루째른에 들렀으면 지나가다가 한번쯤은 들러줘야 할것만 같았다.
저렇게 멋진 돌 조각을 하필이면 화살에 맞고 죽어가는 사자로 만들어야 했을까 궁금했는데,
용맹하게 죽어간 병사들을 기리며 화살을 맞은 사자상을 세웠다고 한다.
루째른의 또하나의 볼거리는 '카펠교'(사진속의 다리는 카펠교가 아니다)
언덕위의 조그만 성에 올랐다가 우리는 다시 카펠교를 보기 위해 산을 내려갔다.
루째른의 강물 역시 초록빛이다.
긴긴 세월동안 알프스의 빙하를 견뎌내며 살아온 스위스인들에게 하늘이 주는 에메랄드빛 선물이 아닐까.
카펠교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다리'라고 한다.
푸른 강을 가로질러 있는 진한 갈색의 다리를 보고 있으면, 잠시 과거로 돌아간듯한 느낌도 든다.
슬로우시티라고나 할까. 왠지모르게 스위스에 있는 동안은 몸도 마음도 편해진것만 같았다.
겨우 3일 쉬어갔을 뿐이지만 3주는 푹 쉬다가 간 느낌.
어딜 둘러봐도 꼬물꼬물 정겨운 도시의 모습.
이들에게는 '회색 빌딩숲속의 도시'라는 말이 멀게만 느껴진다.
마음속으로만 동경해왔던 스위스의 모습은, 직접 눈으로, 가슴으로 느껴보니 더욱더 선명해졌다.
경쟁과 질투, 시기, 미움 처럼 씁쓸한 감정으로 물들기 쉬운 현대 도시인들. 스위스의 모습을 바라보며 언젠간 우리나라의 도시들에서도 여유, 평화, 정겨움 그리고 공존 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길 빌어본다.
'여행 > '07 유럽배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푸르른 지중해로의 초대, 아름다운 해변 니스 (4) | 2008.07.16 |
|---|---|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롱샹 성당을 아시나요 (16) | 2008.07.15 |
| 스위스 튠호수에서는 멋진 유람선 관광이 공짜? (20) | 2008.07.09 |
| 알프스에서 만난 계란만한 우박세례_스위스 인터라켄 (38) | 2008.07.08 |
| 자연이 만든 지구의 병풍, 알프스 정상에서의 맥주 한잔! (10) | 2008.07.08 |
| 붉은 지붕이 아름다운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 (10) | 2008.07.06 |
|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의 정체는? (20) | 2008.07.05 |
| 환락과 사치, 유흥으로 물든 고대도시, 폼페이를 찾아 (0) | 2008.07.04 |
| 도시 전체가 커다란 박물관, 로마를 찾아서 (4) | 2008.07.03 |
| 물의 도시 베네치아, 알록달록 예쁜 마을 부라노 (8) | 2008.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