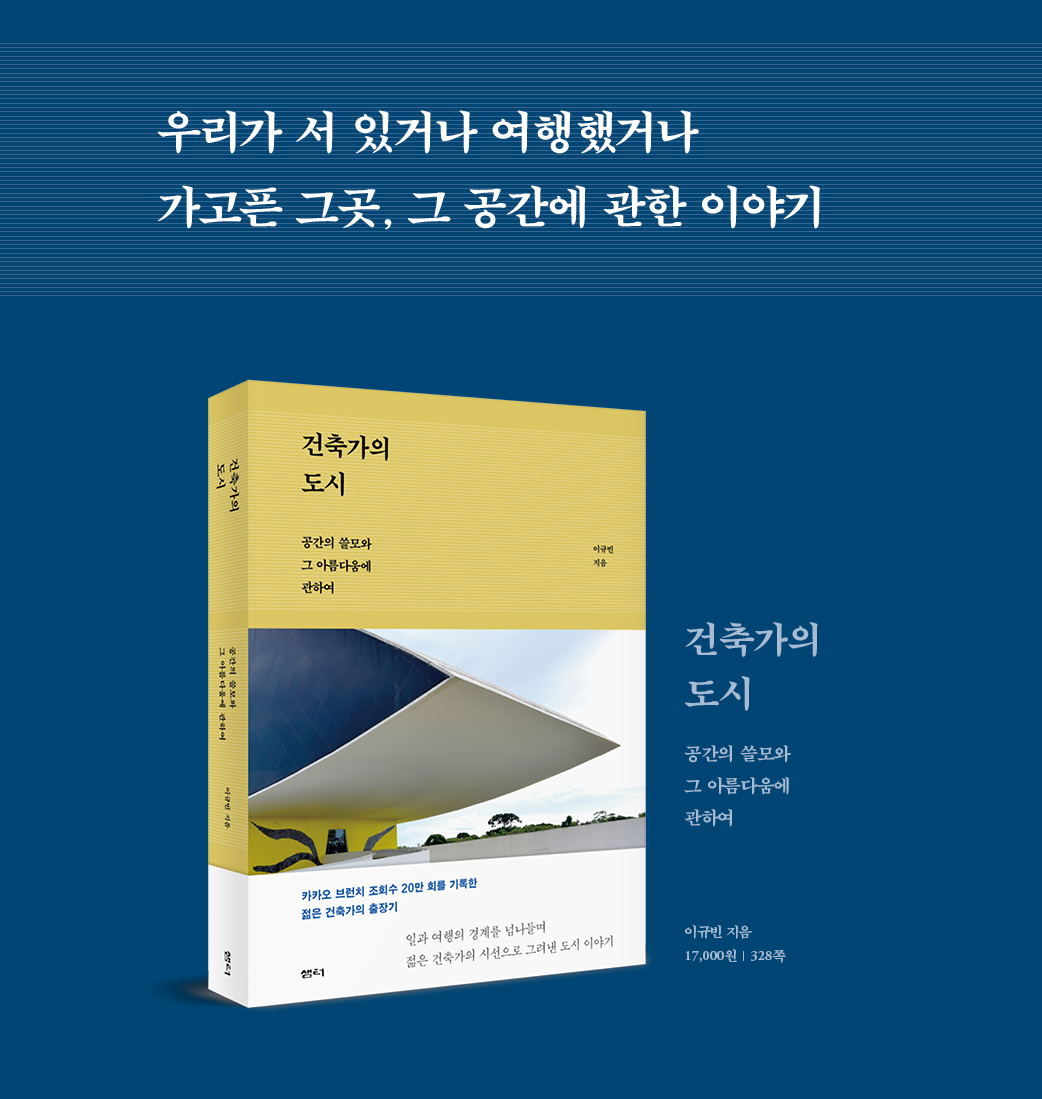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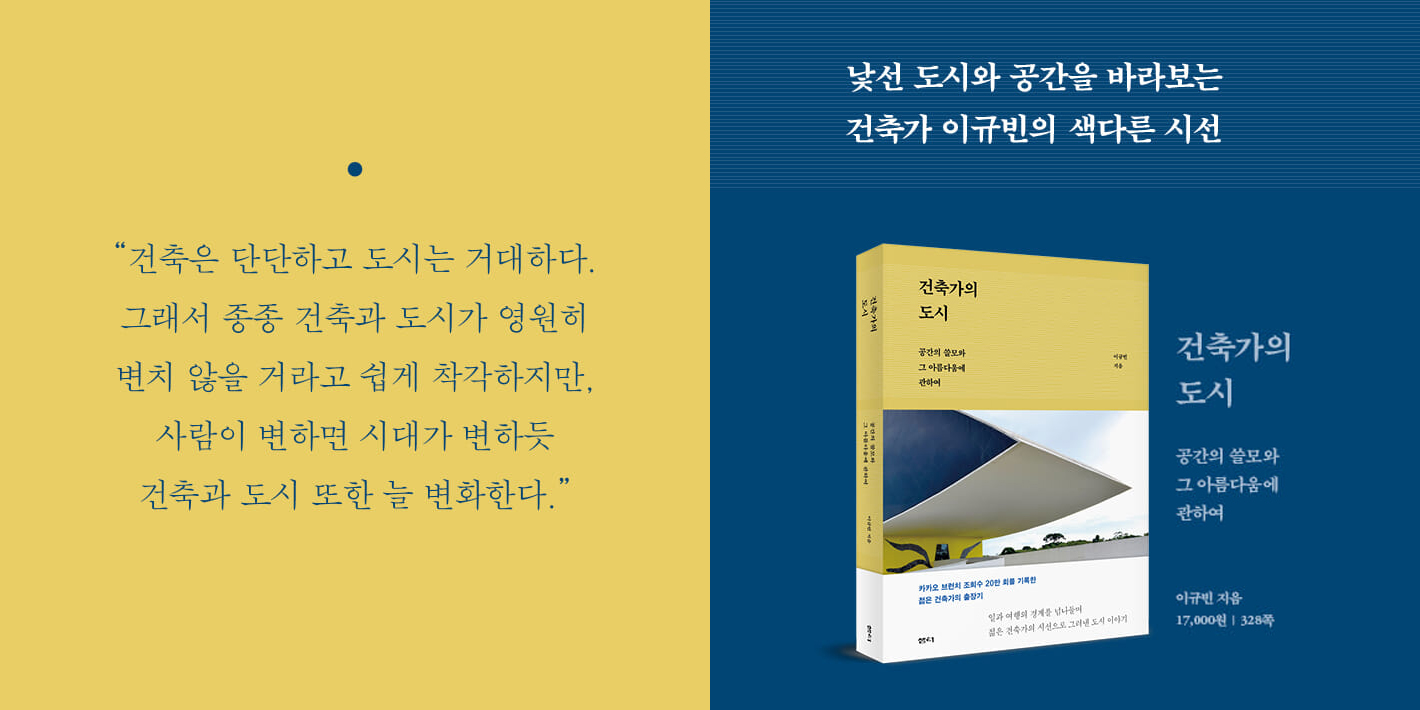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우리는 누구나 '시간' 안에서 생을 살아간다. 시간은 그 시작과 끝을 특정할 수 없이 무한히 반복되는 자기 복제적 개념이다. 그럼에도 역사적으로 인류는 시각, 날짜, 계절과 같은 개념으로 시간을 한정하고 통제하며 이를 극복해왔다.
휴가, 여행, 출장, 학기, 방학 … 이처럼 고유한 이름이 붙은 ‘시간들’은 그래서 좀 더 특별하다. 우리가 어떤 시간들의 ‘처음’과 ‘마지막’에 자꾸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또한 분명 그 때문일 게다.

오늘은 이번 출장의 마지막 날이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밤 열 시에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을 이륙할 예정이다. 아직 반나절도 더 남아있지만 공항철도까지 포함해 무려 세 번이나 환승을 해야만 갈 수 있는 먼 거리였다. 못해도 정오 전에는 도비아코를 떠나야만 했다.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한 시간, 마지막을 마지막답게 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에 가고 싶었다.


구스타프 말러(Gustav Mahler, 1860-1911)는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의 일부였던 보헤미아 태생의 후기 낭만파 작곡가다. 생전에는 ‘빈 국립 오페라극장’ 감독을 맡아 지휘자로 명성을 쌓았다. 작곡가로 재평가되며 거장 반열에 오른 건 그의 사후 30년도 더 지난 뒤의 일이었다.
말러는 매년 7~8월이면 ‘여름 오두막’을 찾아 기거하며 작곡에 전념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스스로를 ‘여름 작곡가’라 칭하기도 했다. 평소 지휘자로서 바빴기에 창작을 위해선 속세와 단절하고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수 불가결했으리라. 당장 내 주변의 건축가 중에도 그런 류의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말러는 평생에 걸쳐 총 세 곳의 오두막을 거쳤다. 첫 번째 오두막은 오스트리아 잘츠캄머굿(Salzkammergut), 두 번째 오두막은 클라겐푸르트(Klagenfurt)에 자리했다. 아름다운 호숫가를 바라보는 두 곳의 오두막에서 그는 총 여덟 편의 교향곡을 썼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오두막이 이곳 도비아코(Toblach)에 있다. 9번 교향곡을 완성하고 10번 교향곡의 1악장을 막 완성할 즈음, 그는 50세의 나이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만다. 스케치로만 남은 나머지 네 개 악장을 놓고 후대의 수많은 작곡가들이 저마다의 판본으로 해석을 내놓았다. 그렇게 '미완'은 '전설'로 승화되어 지금의 말러를 있게 했다.


말러의 오두막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들판에 있었다. 진한 녹음의 평화로운 시골길을 따라 한 30여분 정도 걸어 도착했다. 입구에 있는 작은 호텔 레스토랑이 있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다. 뒷문으로 나와 정원 안쪽으로 들어서면 작은 동물원이 있고 그 길의 끝에 말러의 오두막이 있었다.


얼핏 보면 마구간이나 창고처럼 보일 만큼 오두막은 아주 작았다. 주변 지역에서 구한 목재로 지은듯한 소박한 외관의 건물은 기껏해야 네 평이 채 안될 것처럼 보였다. 지금은 없지만 안에 전시해놓은 옛 사진을 보니 안에는 작곡에 필요한 작은 책상과 의자, 피아노 한 대 정도가 전부였던 것 같다.
말러는 교향곡에 대해 '하나의 세계와 같이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했던 사람이다. 그의 음악은 세계를 담을 정도로 광대했지만 그런 곡을 만드는 데에는 그리 큰 공간이 필요하진 않았던 모양이다.

문득 건축가 르 꼬르뷔제의 오두막, 카바농(Cabanon)이 떠올랐다. 그는 64세가 되던 해에 프랑스 남부 해변에 네 평 남짓 오두막을 짓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오두막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건 전 세계의 도시를 그리고 현대 건축을 정초 할 정도의 거장 건축가 또한 한없이 작고 소박한 공간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는 점이다.
꼬르뷔제는 오두막 앞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가 7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말러와 같은 방향을 보고 섰다. 마침 그때가 7월 말이었으니 그가 오두막을 찾았을 계절과도 정확히 일치했다. 가냘픈 나무 살의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것이라곤 그저 풀, 나무, 산 뿐이었다. 이곳은 도시가 아니니 100년 전 그가 보았을 풍경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말러와 꼬르뷔제, 당대의 작곡가와 건축가는 왜 스스로를 그리도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공간으로 내몰았던 걸까.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것을 내려놓고 최소한의 것만을 남긴채 창작혼을 불태웠을 거장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아직 젊고 평범한 내가 그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란 생각은 감히 하지 않는다. 다만 나의 인생 마지막 시간들은 어떤 장소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내게 될지 잠시 상상해봤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아직도 까마득히 멀겠지만 출장의 마지막은 눈앞으로 성큼 다가와 있었다.
오두막을 빠져나와 도비아코 역에서 남쪽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다. 세 번의 기차를 갈아타고 밀라노까지 오는 내내 단잠에 취해있었다. 마치 지난 열흘 간의 모든 피로를 이제야 내려놓기라도 하듯이.

눈을 떠보니 어느새 기차가 속도를 줄이며 플랫폼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노선수가 많고 전형적인 폐쇄형 역사인 밀라노역은 입출고하는 열차가 많아 복잡하기로 유명하다. 창밖으로 선로를 따라 동그랗게 굽어진 기차의 앞쪽 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언젠가 티브이에서 봤던 말이 떠올랐다. '기차 안에서 보면 우리 인생은 직선인데 고개를 내밀고 돌아온 선로를 보면 굽이굽이 굽어 있었다'라고.
굽었던 선로가 다시 곧게 펴지고 기차는 제자리에 멈춰 섰다. 이내 특유의 이탈리아어 억양 가득한 방송이 차내에 흘러나왔고 모두들 분주해졌다.
'... 이 열차는 마지막 역인 밀라노에 도착했습니다.'(끝)
*지금까지 '젊은 건축가의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를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김광현, <세계 유산 ‘4평 오두막’… 女건축가에 대한 ‘질투’로 탄생했다>, 문화일보, 2018.05.23
김영석, <말러와 여름 오두막집>, 한국일보, 2020.07.22
오재원, <구스타프 말러 교향곡 제10번 F#장조>, 2013.09.02
'여행 > '15 이탈리아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알타비아 넷째날, 외로운 백조와 장미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9) (0) | 2020.09.03 |
|---|---|
| 알타비아 셋째날, 나는 여복이 좀 있다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8) (3) | 2020.08.04 |
| 알타비아 둘째날, 해발 2700m에서의 하룻밤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7) (0) | 2020.07.28 |
| 알타비아 첫째날: 지독하게 고독한 길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6) (0) | 2020.07.21 |
| 건축가가 산으로 간 까닭은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5) (4) | 2020.06.22 |
| 잘 먹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4) (2) | 2020.06.16 |
| 한 편의 전시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3) (0) | 2020.06.09 |
| 밀라노의 심장에 소쇄원을 세워라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2) (0) | 2020.06.02 |
| 다시 유럽에 갈 수 있을까? -산으로 가는 이탈리아 출장기 (1) (7) | 2020.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