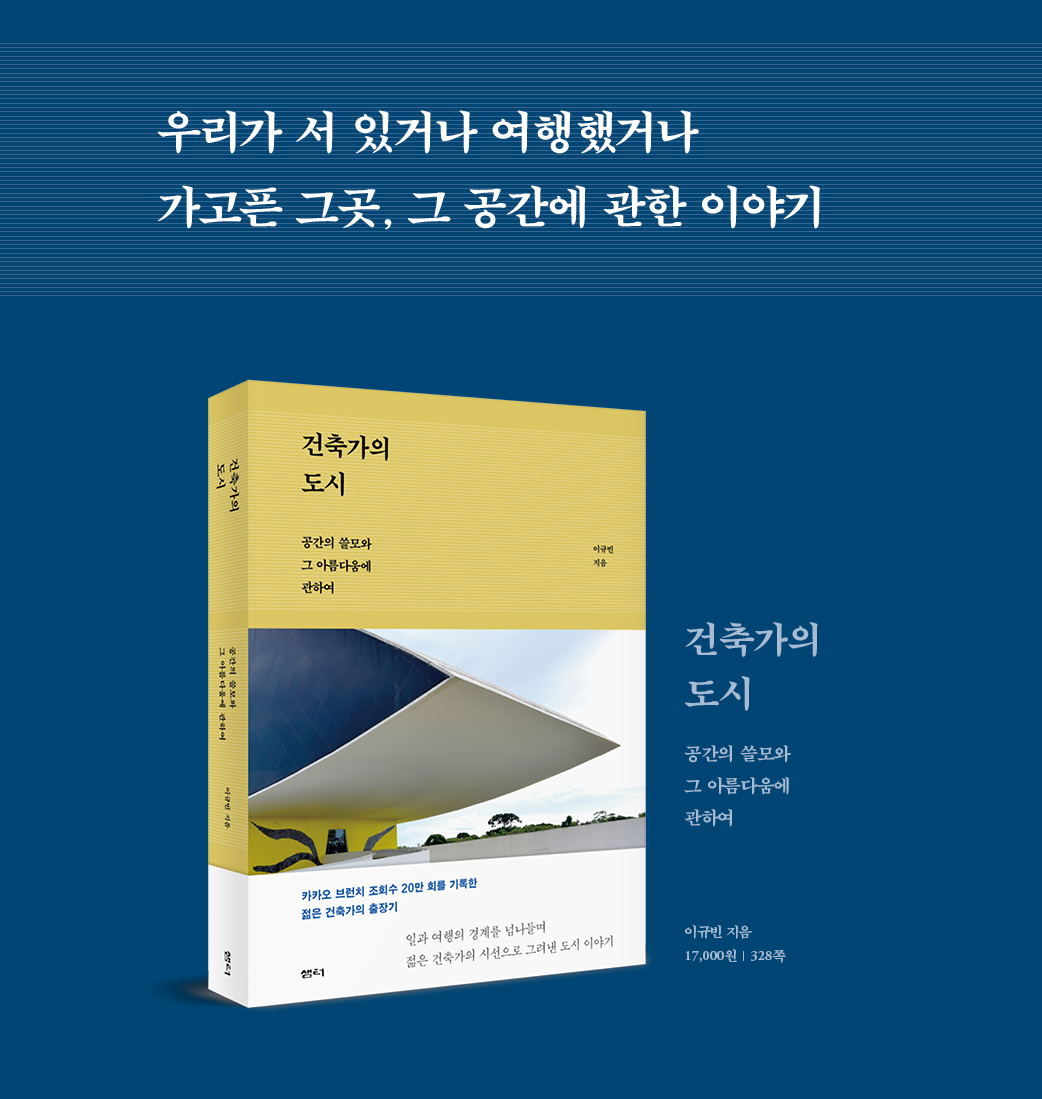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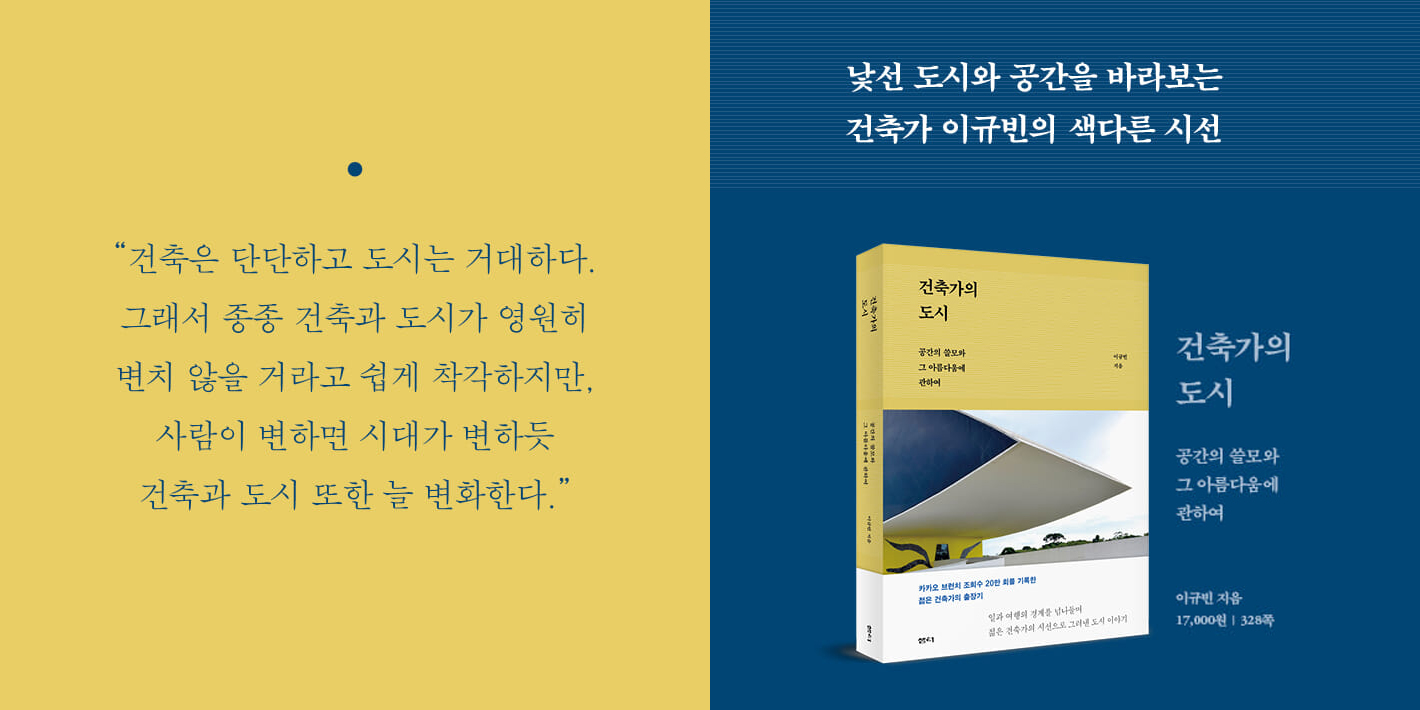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 나는, 근대 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제의 역작 '롱샹성당' 안에서 수많은 촛불들을 뒤로하고 고요한 정적속에 홀로 앉아있다.
오늘 이 경험, 이 느낌, 이 기억은 앞으로 내가 건축가가 되어 활동하는 그 순간까지도 마음속에서 늘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다.
-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
여행을 계획하고 방문할 여행지를 선택하던 그 때부터, 이곳 롱샹성당은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다. 하지만 프랑스 남부의 조그만 마을인 이곳 '롱샹'에는 롱샹성당을 제외하곤 특별한 볼거리도 없거니와 워낙 작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보니 하루를 통째로 투자해야만 들를 수 있는 곳이어서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었다.
하지만 운이 좋았던 걸까, 스위스에서의 마지막 날은 특별한 계획도 없었고 마침 다음 이동지가 프랑스여서 나 혼자 오늘 하루만 빠져나와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다.
인터라켄에서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바젤, 물루즈, 벨포트를 거쳐 무려 4시간을 와야하는 길고도 험한 여정. 행여나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는건 아닐까 불안해하며 거의 뜬눈으로 밤을 지샜다.
아침도 허겁지겁 먹고 세수도 못한 채 호스텔을 빠져나와, 아슬아슬하게 바젤행 INTERCITY 기차를 타고나서야 겨우 마음이 놓였다.
이곳 롱샹까지 오는 동안, 내내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평생 사진으로만 보아야 할 줄 알았던 롱샹성당을 바로 오늘, 내 두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얼마나 떨렸는지, 그동안 늘 기차만 타면 이내 골아 떨어지던 내가 오늘은 한숨도 안자고 4시간을 달려왔다.
혼자서 하루동안 따로 떨어져서 다닌다는게 사실 조금 겁이 나기도 했다. 그동안은 무슨 일이 생겨도 늘 함께 고민해줄 친구들이 항상 옆에 있엇지만, 막상 정말로 혼자 무거운 가방을 메고 헥헥대며 헤메보고 나서야 함께 여행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새삼 느껴진다.
바젤에 내려서는 잠시 방황하기도 했었다. 미리 적어온 열차 시간표 대로라면 BASEL SBB에서 10분을 걸어서 BASEL SNCF로 환승하러 가야하는데, 역이 어디있는진 모르겠고, 남은 시간은 겨우 15분, 짐은 무겁지, 물어볼 사람은 없지, 혼차서 정말 난처했었다. 알고보니 SNCF는 다른 역을 말하는게 아니라, BASEL 역 내의 프랑스 기차들이 들어오는 플랫폼을 말하는 거였다.
이리저리 헤메다가 운좋게 타야할 열차가 있는 플랫폼까지 흘러들어오게 되어서, 평생의 단한번일지도 모르는 기회를 어이없게 날려버리는 일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오랜 시간동안 이리저리 헤메가며 도착한 '롱샹'역에 막상 내려보니, 여긴 정말 기차역이라 하기도 애매했다.
기차가 다니는 왕복 레일 두개와, 비를 간신히 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공간 하나, 그리고 육교가 전부인 간이역. 내가 유럽에서 본 역중에선 아마 가장 작은 역이었던것 같았다. 주변으로는 건물하나 보이지 않고 잡초만 무성한 말그대로 황량한 곳이었다.
정말 이런 한적한 시골마을에 '롱샹성당'이 있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했었지만, 마지막 기차를 같이 타고왔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역을 빠져나와, 여기저기 물어가며 드디어 길을 알아냈다.
나와 마찬가지로, 롱샹성당을 보기위해 이 작은 시골마을까지 기차를 타고온 다른 사람들은 두명의 한국 여학생들과 두명의 일본 남학생들이었는데, 한국 여학생들은 실내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었고 두명의 일본 남학생과 나는 건축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건축사 강의시간에 잠깐 들었던 것 처럼, 롱샹성당까지는 나무가 우거진 숲 사이로 꼬불꼬불한 언덕길을 한참이나 올라야 한다. 무거운 배낭에 긴팔옷까지 입고있는 바람에 땀을 비오듯 흘리며 올라가야 했다.
십 분쯤 걸었을까, 저 멀리 언덕에 나무들 사이로 불쑥 솟은 롱샹성당 꼭대기가 보인다.
구름사이로 해가 비치면서 새하얀 성당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그 순간 내가 느낀 감정이 참 묘했다.
'책속에만 있던게 아니라, 진짜 있었구나' 하는 마음에 살짝 웃음이 나오기도 하면서, 왠지모르게 엄숙해지고 경건해지는 마음이 교차했다. 오분쯤 더 걸어 올라가서야 성당으로 들어가는 매표소가 보였다.
아직은 건축을 처음 공부하는 새내기인 내가 지금 롱샹을 보며 쓰는 이 글을, 30년이 지나 정말 건축가로 활동하고 있는 내가 다시 읽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 상상해보며 내 머리와 마음이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롱샹을 묘사해보고 싶다.
롱샹을 본 나의 첫 느낌은 스스로 조금은 실망스러웠다. 기대가 너무 커서 였을까.
건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언덕을 올라와 롱샹을 처음 본 순간 아름다움에 울음을 떠뜨렸다는 관광객,
안으로 들어간 그 순간 아름다움에 취해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자리에 얼어버려다는 선배,
이곳을 다녀간 많은 사람들의 반응(대부분은 건축을 전공하는 내 주변 사람들이었지만)과 내가느낀 첫인상은 많이 달랐다.
물론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랬던 걸수도 있다. 정말 아름다운 건축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니...
하지만 내가 느낀 롱샹의 진정한 힘은 그 자체의 아름다움 보다도, 성당이 자리잡은 언덕과 주변의 자연환경, 그곳에서 미사를 드리는 신도들과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화되고 있는 모습에 있었다.
롱샹성당은 정말 징그러울정도로 군더더기가 없는 건물이다. 르 꼬르뷔제라는 거장의 꼬리표를 가려놓았다 할지라도, 누군들 이 작은 성당을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까...
넓은 잔디로 된 광장과 언덕아래로 펼쳐진 작고 아기자기한 마을, 그리고 아름다운 프랑스 남부의 파란 하늘을 향해 열려있는 야외 제단.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이 위대한 공간에 앉아있는 내 모습에 다시한번 기분이 묘해진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곳.
몇시간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앉아있고 싶은 곳.
롱샹만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힘에 감탄, 또 감탄을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축을 공부하며 지친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하고파 찾아온 유럽에서
오히려 난 다시한번 건축에 대한 나의 열정을 재확인하고 있었다.
 |
 |
작은 마을 규모에 비해, 이곳 롱샹성당에는 생각보다 관광객들이 많았다.
꼭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이나 책을 통해 이곳을 알게된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고 있었다.
 |
 |
생각해보면, 롱샹성당이 어떤곳인지 보통은 잘 모르는게 당연하다. 그래서 결국 함께 여행하던 친구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나 혼자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니.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럽여행하면서 늘 보아오는 비슷비슷한 생김새의 성당에 질려갈때 쯤, 독특하게 생긴 롱샹성당을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쯤 들려보는것도 나름대로의 재미가 될수도 있겠다고 생각해본다.
처음에는 저녁 6시까지 천천히 롱샹을 둘러보다가 물루즈로 가려 했지만, 하지만 3시가 조금 넘으니 배도 고프고 덥기도 해서 아쉽지만 롱샹성당을 뒤로한채 다시 기차역으로 천천히 걸어내려가야만 했다.
언젠간 다시 너를 볼 수 있길 바라며, 아듀 롱샹!
-
어느덧 이제 스위스와 롱샹에서의 일정도 끝나고 우리는 프랑스 남부 해안 니스로 향한다.
여행이 서서히 중후반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도 가야할곳은 너무나 많다!
힘내서 마지막까지 계속 달려볼란다.
내일이면 눈앞에 펼쳐질 파아란 지중해를 상상하며 달콤한 꿈나라로...
롱샹성당 입장료 2 €
저녁 서브웨이 샌드위치 6 €
'여행 > '07 유럽배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두가지 매력, 아름다운 항구의 나라 모나코 (9) | 2008.07.28 |
|---|---|
| 이브 몽땅과 샤갈이 사랑한 마을, 생폴 드 방스 (12) | 2008.07.18 |
| 푸르른 지중해로의 초대, 아름다운 해변 니스 (4) | 2008.07.16 |
| 스위스 튠호수에서는 멋진 유람선 관광이 공짜? (20) | 2008.07.09 |
| 알프스에서 만난 계란만한 우박세례_스위스 인터라켄 (38) | 2008.07.08 |
| 자연이 만든 지구의 병풍, 알프스 정상에서의 맥주 한잔! (10) | 2008.07.08 |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 스위스의 도시 이야기 (134) | 2008.07.07 |
| 붉은 지붕이 아름다운 르네상스의 발상지, 피렌체 (10) | 2008.07.06 |
|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 바티칸의 정체는? (20) | 2008.07.05 |
| 환락과 사치, 유흥으로 물든 고대도시, 폼페이를 찾아 (0) | 2008.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