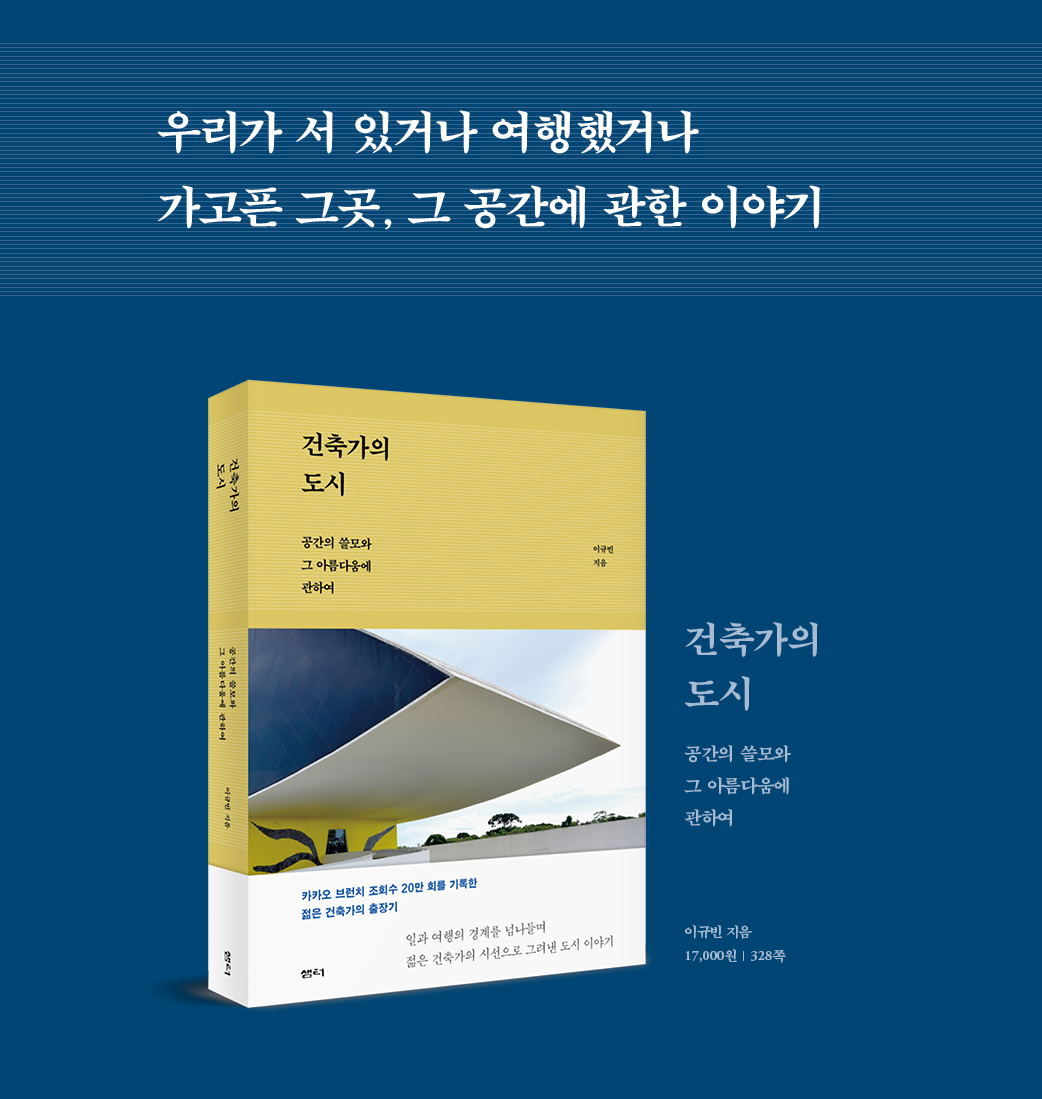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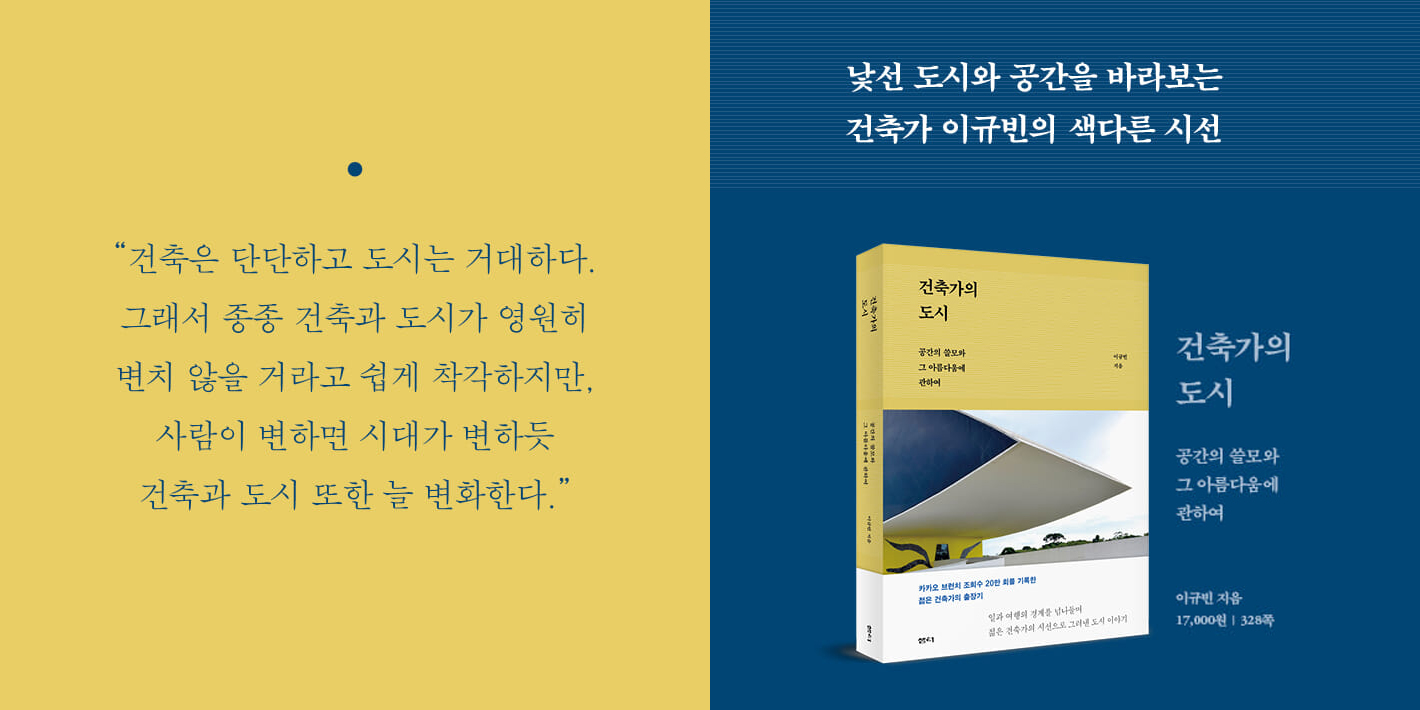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요즘 들어 자꾸만 인도가 그립다. 다른 사람들이 다녀온 사진만 봐도 움찔움찔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게 올라오고, 내가 만났던 이야기 했던 인도 친구들의 사진을 다른 곳에서 발견하면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인사를 건네본다. 누가 그랬던가. 인도에 처음 다녀오면 언젠가 반드시 다시 찾게되는 일명 '인도병'에 걸리게 된다는데, 어느새 나도 인도병 환자가 되어버린 것 같다.
물론 인도 여행이 그렇게 마냥 유쾌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밤이면 뜨거운 열기에 늦게까지 잠을 못이룬 기억도 많았다. 진심으로 호의를 베풀고 도와주었던 친구들이 있었는가 하면, 능글맞은 얼굴을 하고 된통 바가지를 씌우던 나쁜 사람들도 많았다. 그래도 인도가 늘 그리운건 왜일까.

한달 조금 넘는 여행동안 꽤 많은 도시를 돌아 다녔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지역마다, 또 도시마다 사람들도 다르고 풍경도 조금씩 다른게 재미있다. 한 나라 안에서 여행하고 있지만 주를 옮겨 갈 때 마다 국경을 넘어가는 느낌이 들 정도다. 대부분의 도시들의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매력이 있었지만 유난히 '아그라'만큼은 내 기억속에서 그리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여행자들에게 최악의 도시로 악명 높은건 괜한 소리가 아니었을테지.
일 년 중에 단 삼일 뿐인 타지마할 무료 입장의 기회. 샤 자한의 축일을 운 좋게(혹은 운 없게) 맞추어 아그라에 도착한 덕분에 700루피라는 거금을 아꼈지만, 미어터지는 인파 속에서 제대로 감상할 여유조차 가질 수 없었다. 하도 줄이 길어서 타지마할 안으로는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입장료 700루피가 비싸긴 하지만, 유유자적하며 느긋하게 타지마할을 감상하는 댓가라면 기꺼이 지불 할 수 있겠다는 생각마저 해본다.

파테푸르 시크리는 아그라에서 남동쪽으로 40km정도 떨어진 곳이다.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대표적인 인도의 문화 유산이지만 반나절이면 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라서 대부분의 여행자들은 아그라와 함께 돌아보는 일정으로 방문하게 된다. 아니면 델리에서 당일치기로 다녀갈 수도 있다. 사람들이 모두들 공짜로 타지마할을 보러가 버린건지 선선한 정오의 파테푸르 시크리는 너무나 고요해서 쓸쓸하게 느껴졌다.
인도의 무굴제국의 비운의 수도였던 파테푸르 시크리. 겨우 14년 동안만 수도로 이용되었던 곳이지만, 붉은 빛의 사암을 깎아 만든 어마어마한 궁전은 찬란했던 과거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사람이 없는 건축물은 죽은 건축물이다. 어쩌면 구조물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언덕위에 홀로 쓸쓸히 남은 파테푸르 시크리의 폐허는 아름답기 보다는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인다. 시크리 지역 궁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건, 바로 붉은 건물들. 피로 물들어 버린듯한 새빨간 건물들은 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사암을 사용해 건축했기 때문이다.
나무나 다른 재료를 쓰지않고 순수하게 돌을 깎아 쌓아올린 건축물들은 생각보다 그 높이가 꽤 높았다. 부러질듯 앙상한 돌기둥으로 받혀진 정교한 조각들은 조금은 뿌연 하늘과 어우러져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사암이 무른 돌이라서 비교적 쉽게 깎인다고는 하지만, 인간의 솜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고 섬세한 조각들이 건물을 가득 뒤덮고 있었다. 우리를 안내해주는 가이드가 열심히 무굴제국의 역사와 이곳에 서려있는 이야기들을 말해주지만 귀에 잘 들어오질 않는다. 아그라에서의 어딘가 음침하고 무거운 공기를 벗어난 자유를 이곳에서 마음껏 만끽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적당히 필요한 말만 골라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무굴 제국의 규모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게 만드는 인간 체스판이다. 사진속의 평상 위에 왕과 왕비가 앉아서 하녀들을 말 삼아, 바닥의 패턴을 체스판 삼아 인간 체스를 즐겼다고 하니 그 위엄이 어느정도였을지 알만 하다. 관광객들은 어김없이 이곳 평상에 앉아서 기념 사진을 찍고 간다던데, 우리도 똑같이 넓은 중정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 앉았다. 오래 전 이곳을 가득 메웠을 함성 소리, 사람들의 분주한 움직임, 그걸 이 자리에서 똑같이 보고 있었을 왕과 왕비. 아무리 길고 자세한 설명보다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게 왠지 더 오래 기억되고 좋다.

오전부터 날이 우중충 하더니만, 이내 소나기가 쏟아져 내린다. 얼른 자리를 피해 처마 밑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나마 보이던 사람들마저 실내로 들어가버리니 텅 비어버린 중정이 더 황량하게만 느껴진다. 이때다 싶어 얼른 펜과 노트를 꺼냈다. 가이드 아저씨에게는 잠시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열심히 그린다고 그렸는데 막상 완성된 그림을 보니 영 마음에 들지를 않는다. 색깔도, 질감도 표현 못하고 섬세한 조각들이 주는 느낌마저 생략해 버리니 그림이 많이 허전해져버렸다. 타지마할에서 못그린 그림을 여기서라도 좀 그려보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다시 일어나 파테푸르 지역으로 향했다.

시크리 지역과는 달리, 파테푸르 사원군 내에서는 신발을 신을 수 없게 되어있다. 비가와서 바닥이 차가울 줄 알았는데, 맨발로 축축한 돌판을 디뎌보니 왠지 따뜻한 느낌이 좋다. 한국에 있을때는 맨발로 밖을 돌아다닐 일이 전혀 없었지만, 인도에 오면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처음에는 왠지 불편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살갗으로 느껴지는 감촉이 썩 나쁘진 않다. 다음에 인도에 또 가게 될 일이 생기면 아예 여행 내내 신발을 신지 않고 돌아다녀 볼까 한다. 위생 상태도 나쁘고 위험할 수도 있어서 가이드북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언급하지만 그래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는건 왜일까.

온통 붉은 빛이지만 유난히도 반짝거리는 하얀 대리석 모스크가 중정 가운데 떡하니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빨간 투각 창에 빨간 실을 묶고 소원을 비는게 이곳의 통과의례라는데 여기서도 또 바가지를 씌우려고 든다. 무슨 꽃을 바치고 천을 덮는 의식을 꼭 해야하는데 가격을 들어보니 가당치도 않은 높은 가격. 아그라의 안좋은 기억이 떠올라 그냥 무시하고 모스크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꼭 해야 하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가격도 원래 아니란다. 대신 지갑을 열어 약간의 기부금을 내고 나도 소원을 빌었다.

파테푸르 시크리에서의 짧은 시간을 뒤로하고, 아그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신발을 신었다. 맨발로 축축한 바닥을 딛고 서 있다가 신발을 신으니 마치 꿈속을 유영하다가 잠에서 깨어난 것만 같다. 몽환적인 폐허, 찬란했던 무굴제국의 영광을 다시금 떠올리며 파테푸르 시크리 밖으로 걸어 나와 릭샤에 올랐다.
'여행 > '09 인도배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르차 이야기, 인도 간즈빌리지 아이들과의 마지막 영어수업 (12) | 2011.06.20 |
|---|---|
| 오르차 이야기, 인도의 지상낙원 아래 낚시와 수영을 즐기다 (8) | 2011.06.17 |
| 오르차 이야기, 간즈 빌리지에서 진짜 인도를 만나다 (12) | 2011.06.13 |
| 오르차 이야기, 인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느끼는 여유...그리고 (12) | 2011.06.10 |
| 밀린 인도 여행기를 다시 시작하며... (8) | 2011.06.09 |
| 여행과 사진, 그 미묘한 관계에 대하여 (26) | 2010.01.13 |
| 조금은 색다른 인도의 버스여행 문화? (16) | 2010.01.04 |
| 그림을 그릴줄만 알던 나, 인도 소녀에게 그림을 선물받다 (32) | 2009.12.23 |
| 인도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까? (18) | 2009.12.22 |
| 나는 두 발을 사진에 담아 여행을 기억한다 (18) | 200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