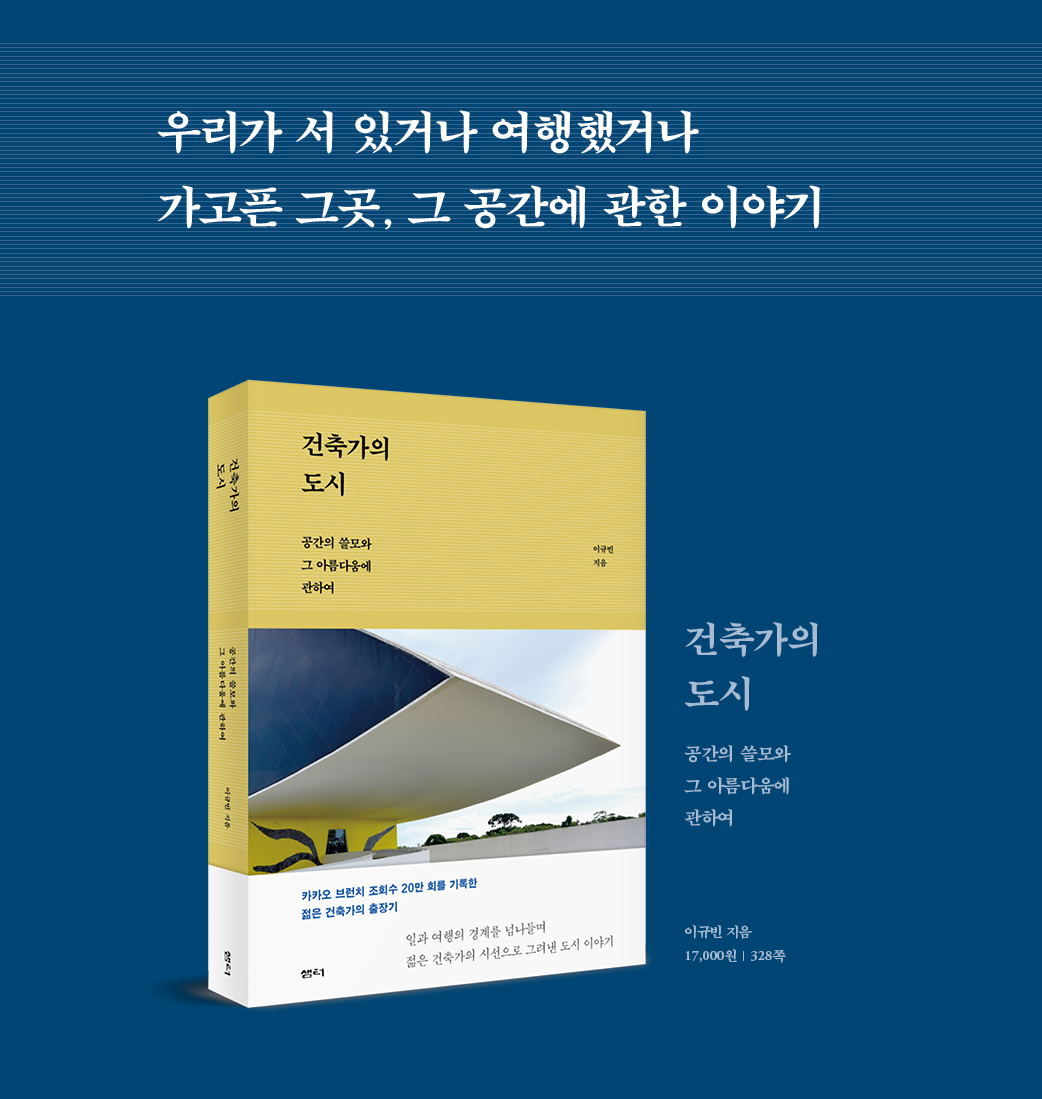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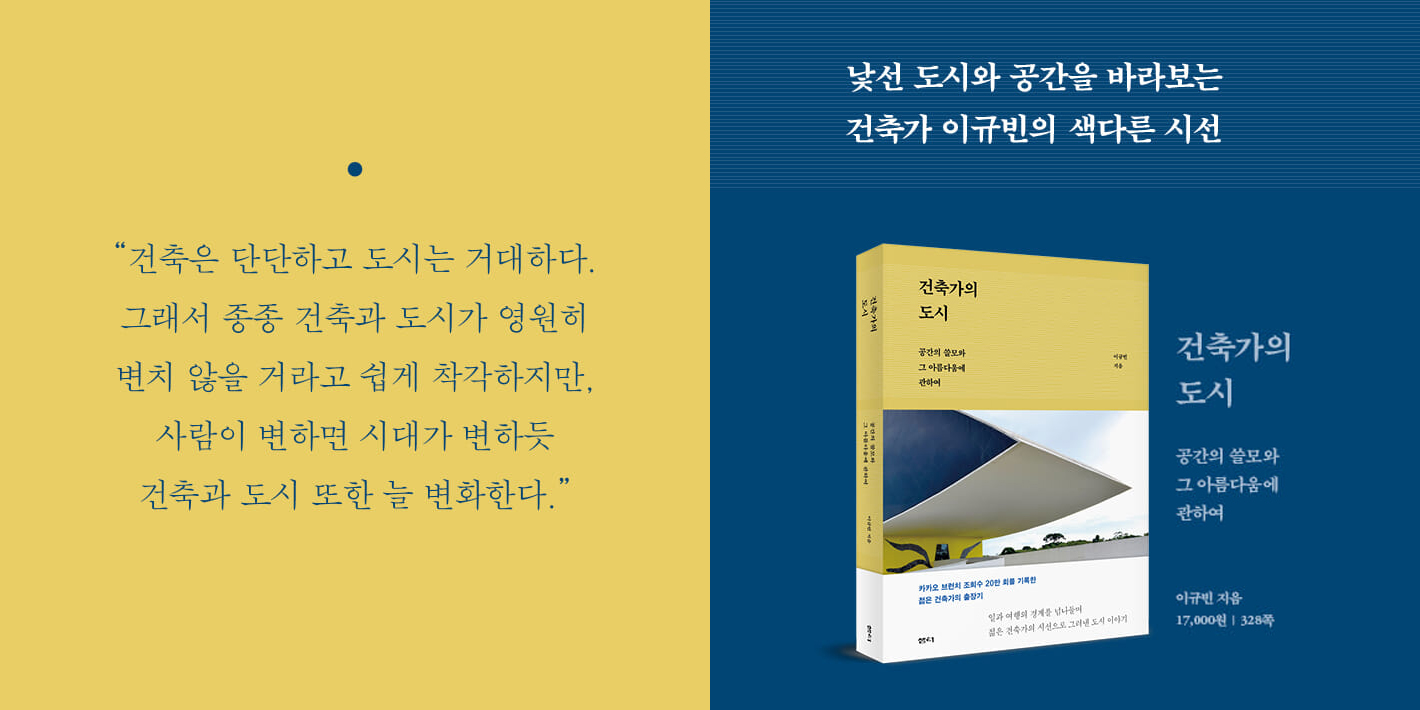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스무살, 내 인생의 첫 배낭여행지는 유럽이었다. 아직 어린 나의 눈에는 모든 도시가 마냥 신기하고 멋지게 느껴지던 그때였지만 그 어느곳 보다도 모나코에서의 하루는 아직도 잊을수가 없다. 푸른 지중해위에 수평선 위로 높게 돛을 올린 요트의 향연.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닷물보다 더욱 아름다웠고, 시내를 유유히 질주하는 빨간 페라리보다 더욱 역동적이었다. 요트를 타고 길도 이정표도 없는 망망대해를 달리는 상상만으로도 나의 가슴은 쿵쾅거렸다. 바다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을까. 그때부터 나는 늘 요트를 한 척 가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면 언젠간 이룰 수 있는게 '목표'라면, '꿈'은 조금 다르다. 손을 뻗어 잡기에는 아득히 멀리 있지만 마음에 담아두는 것만으로도 가슴뛰게 만들어주는 그것. 어쩌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주는건 목표가 아니라 꿈은 아닐까.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말이다.

하지만 꿈은 꿈이고, 현실은 또 현실이다. 3년 넘게 마음속에 품어온 바다와 요트에 대한 환상은 페리를 타고 잔지바르에 들어가는 고작 3시간만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 나도 몰랐다. 내가 이렇게 배멀미가 심할 줄이야.
잔지바르 섬으로 들어가는 고속 페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달린다. 항해한다는 말 보다는 물위를 '날아'간다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다. 갑판 위에 가만히 서있기가 힘들 정도로 흔들리는 선체. 조타실에 올라가 선장 아저씨 손을 잡으며 좀 멈춰달라고 하고만 싶었다.

탄자니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배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보다 현지인이 많다. 맨 처음 1층 실내 객실에는 온통 현지인들 뿐이다. 알고보니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3층 야외 객실을 사용한단다. 잠깐 올라가 봤는데 손잡이를 잡고있지 않으면 서있기가 힘들 정도로 출렁거린다. 처음에는 웃고 떠들며 열심히 사진을 찍던 서양 사람들도 이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는 울렁거리는 속을 다스리는데에 정신이 없다.
배멀미도 배멀미지만, 수면과 멀리 떨어져 3층에 있으려니 어째 배를 타는 흥이 나질 않는다. 물도 많이 튀기고 엔진소리도 더 시끄럽지만 다시 1층으로 짐을 챙겨서 내려왔다.

멀미가 날때는 약도 필요없다. 그저 바닷 바람을 맞으며 멀리 창밖을 바라보는게 제일이다. 선체 앞쪽 갑판으로 올라가니 여기에도 사람들이 너댓명 나와서 앉아있었다. 저마다 나름의 방식으로 멀미를 이겨내는 모습이 재미있다. 물론 나도 난간에 몸을 의지하고 아무말없이 수평선만 바라보고 있었다.
바람이 어찌나 불던지 귀를 스치는 바람소리 때문에 옆사람이 말하는 소리도 잘 들리질 않는다. 몇번이고 말을 걸어봤지만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서 결국 포기. 옆에 붙어 앉아있으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서로 다른곳을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얼른 잔지바르에 도착하길 바라며 말이다.
 |  |
그렇게 배를 탄지 한 시간쯤 지났을까. 계속 힘들어하던 후배 녀석은 겨우 잠이들었다. 그나마 이제는 출렁거림이 조금 익숙해져서 배 안을 여기저기 둘러보고 다녔다. 갑판 한쪽에서 정성스럽게 메카를 향해 절을 올리는 무슬림도 보인다. 하지만 역시나 배멀미를 피해갈수는 없었다보다. 절 한번 올리고는 난간을 잡고 다시 숨을 고르고, 또 다시 절을 올리고.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성스러운 의식을 올리고 있었다.
괴로운 표정으로 잠든 후배 녀석 옆으로, 더욱 괴로워 보이는 사람들도 보인다. 옷차림으로 볼때 마사이족 젊은 청년들 같아 보였는데 항해 초반에는 건들거리며 맥주며 과자며 이것저것 먹어대더니만 금새 저렇게 자리를 깔고 아예 누워버려서는 연신 헛구역질을 해댄다.

어느덧 고통스러웠던 배 위에서의 세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이 저마다 갑판위에 자리를 잡고 서서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멀리 보이는 작은 항구, 드디어 잔지바르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  |

잔지바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입국수속을 거쳐야 한다. 처음 탄자니아 비자를 발급 받을때 single이 아닌 transit으로 받으면 잔지바르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입국카드와 함께 여권을 내미니 또 한번 도장을 찍어준다. 아직 탄자니아에 있지만 어딘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에 마음이 괜히 설레인다.

탄자니아에 도착한 첫 날, 하루 해가 너무 길게만 느껴진다. 한거라고는 공항에서 내려 시내까지, 항구에서 배를 타고 잔지바르까지 계속 이동한것밖에 없는데 온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다. 크고 작은 배들이 떠있는 잔지바르의 바다를 바라보며 한 숨 돌려본다. 손에는 ZANZIBAR 글씨가 선명한 도장이 찍힌 여권이 아직 들려다.
여긴 또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설레이는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서둘러 배낭을 메고 항구를 빠져나간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 아무것도 못 먹어 배는 꼬르륵 거리고, 배낭은 물먹은 솜마냥 축 늘어져서 더욱 무겁게만 느껴진다. 얼른 숙소를 잡고 저녁도 먹어야 할텐데. 다시 힘을내어 발걸음을 재촉해본다. 먹고 자는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걸 보며, 새삼 이제 진짜 여행의 시작임을 다시 느낀다.
(계속)


'여행 > '10 아프리카배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야생 동물의 천국, 세렝게티 응고롱고로 분화구 _사파리 2일차 (10) | 2010.03.22 |
|---|---|
| 세렝게티의 사파리의 시작, 마냐라 호수 _사파리 1일차 (24) | 2010.03.19 |
| 12시간 버스 타기, 아루샤 가는 날 (8) | 2010.03.17 |
| 잔지바르의 보석, 능궤에서의 하룻밤 (10) | 2010.03.16 |
| 스파이스 투어, 아찔한 시나몬의 유혹 (15) | 2010.03.11 |
| 스톤타운 골목길 아침 풍경 (8) | 2010.03.02 |
| 야시장에 가면 있는 것은 (14) | 2010.02.25 |
|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의 첫 느낌 (14) | 2010.02.22 |
| 설렘,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에서 (8) | 2010.02.19 |
| 프롤로그_ 여행하며 사진찍기 (20) | 201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