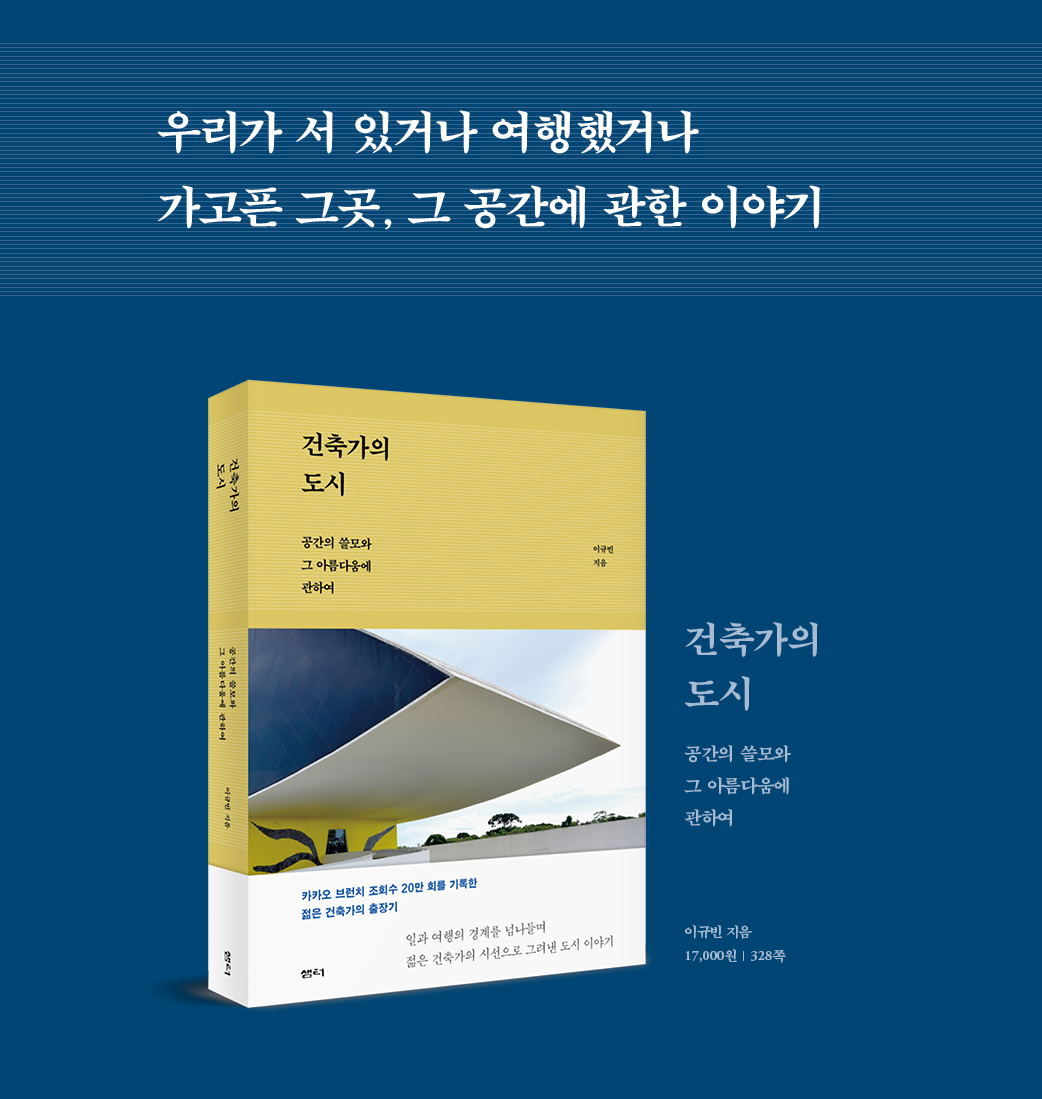티스토리 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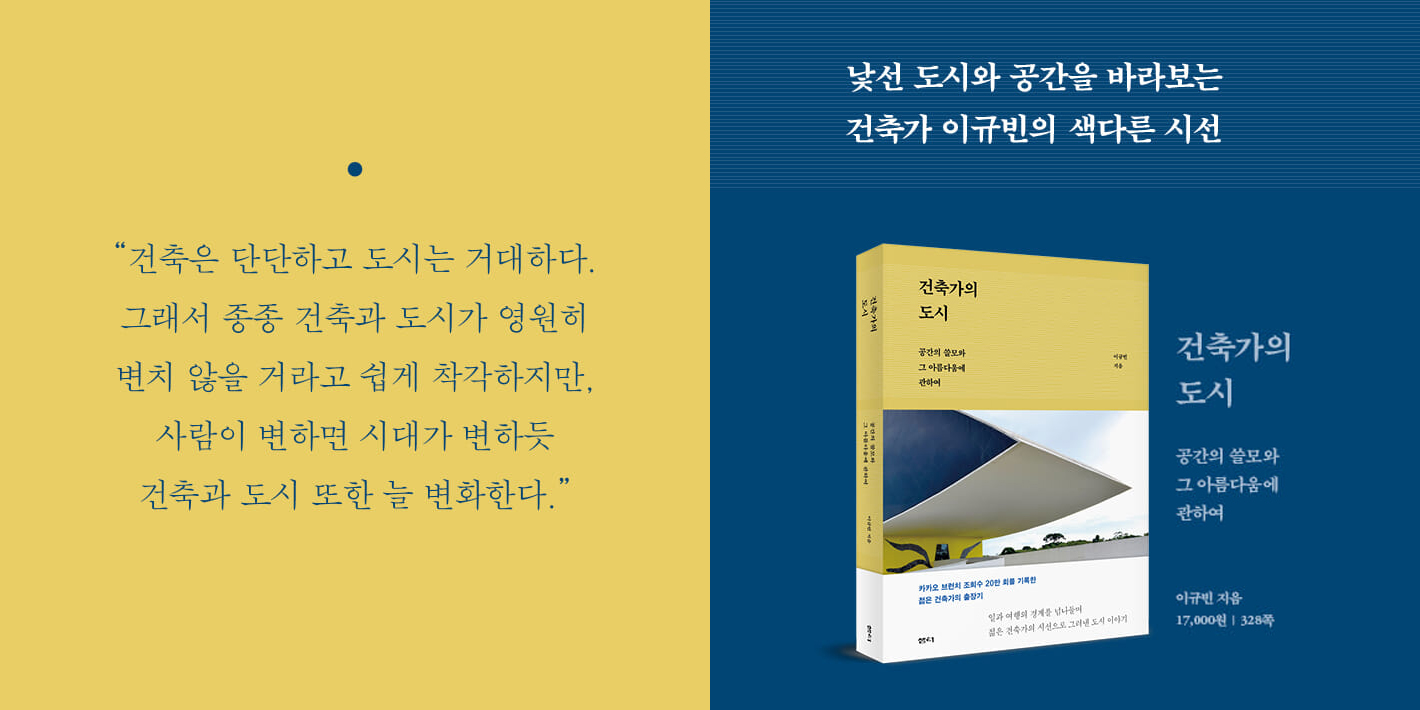
여행은 모름지기 준비할 때가 훨씬 설레이고 즐겁다.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서점을 들락거리며 여러가지 정보를 모으고, 눈이 빨개지도록 밤새 인터넷 카페를 전전하기도 하고... 여행지에 도착한 후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밖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그 짜릿한 설렘. 나는 오히려 공항 밖으로 나와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하면서 부터는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해본적이 그리 많았던것 같지 않다. 그곳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일테고 나는 그 새로운 일상에 잠시 머물렀다 가는 손님이기에. 하지만 나는 이 글을 쓰는 지금,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정도로 떨리고 설렌다. 그렇다. 나는 또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

배낭여행을 하는 나같은 사람들에겐 정보가 생명이다. 물론 대중적인 나라들의 경우엔 잘 나온 가이드북이 꽤 많긴 하지만, 사람사는 곳은 언제나 어디나 시시각각 예측불허로 변화하기 마련. 책 속에 머물러 있는 정보들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건 지금 막 여행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직접 듣는 이야기들이다. 지금 열차 사정은 어떤지, 물가는 어느정도인지, 요즘 제철인 과일은 뭐가 맛있는지 같은 살아있는 이런 이야기. 몰라도 되지만 알면 여행이 더욱 즐거워진다. 때문에 유명한 여행 관련 카페들이나 커뮤니티엔 언제나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들의 질문과 돌아온 사람들의 답변으로 북적거린다.
그런데, 이 질문들이라는걸 유심히 들여다보면 꽤 흥미롭다. 서너 페이지마다 한번씩은 꼭 볼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다름아닌 카메라에 대한 질문이다. 무슨 카메라를 가져가면 좋을지 부터 시작해서, 어떤 화각의 렌즈들을 챙겨야 할지, 가방은 무엇을 쓰면 좋을지, 삼각대는 꼭 필요한지 궁금한 것도 참 많다. 그러고보니 나 역시 여행을 준비하고 있고 카메라를 가져갈 예정이다. 나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알고 있을까...

2004년, 태어나 처음으로 내 카메라를 가져보게 된 건 여행을 가기위해서였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행을 위해서라고 쉽게 생각했으니 고민도 별로 없었다. 당시 40만원이 넘는 큰 돈을 주고 소니 사이버샷 w1이라는 모델을 구입했었다. 그리고 이 카메라와 함께 미국과 일본을 여행했었다. 당시는 카메라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펜탁스라는 브랜드를 알지도 못했다. 그냥 카메라는 소니가 좋다고 하더라, 친구 카메라가 그거라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에 귀가 팔랑거렸던 것 같다. 5년 가까이 나의 유일한 '디지털 바디'였던 w1은, 작년 여름 인도여행을 하며 2층 높이에서 떨어지며 장렬히 전사하고 말았다...
여행을 할때 확실히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컴팩트 디지털카메라는 여러모로 편리하다. 거추장 스러운 짐과 배낭이 뒤엉키는 와중에도 옷 주머니에 쏙 넣어두었다가 필요할때 바로바로 꺼내면 되니깐. 잡지에서나 볼 법 한 멋진 풍경이나 그럴싸한 작품사진을 내 카메라 메모리카드에 '소유'하고 싶다는 욕심만 버리면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 또 여행사진이라고 해서 꼭 여행지의 생경한 풍경들을 담아야만 할 의무도 없다. 함께 한 친구들의 한국에서와는 다른 옷차림, 행동, 표정들마저도 여행의 일부고 소중한 추억이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카메라를 쓴다 해도 빨리 꺼낼 수 없다면 이런 순간들은 영영 붙잡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

대학교에 입학함과 동시에 펜탁스 ME-super로 사진이라는 취미를 처음 가지게 되었다. 그냥 셔터를 누르면 찍히는게 사진이구나 하고만 생각하던 나에게 다이얼과 조리개링을 돌려가며 한장한장을 '만들어내는' 필름 사진은 너무나 매력적이었고, 얼마 후 유럽으로 떠나게 된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진이라는 취미를 가지게 된 뒤로 가장 즐겁게, 가장 행복하게 사진을 찍었던게 아마 그무렵이 아니었을까 하고 떠올려본다. 비싸고 좋은 렌즈에 관심도 없었고, 여러가지 화각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다. 그저 늘 학교다니며 어깨에 걸고 다니던 ME-super에 50mm 단렌즈 하나 끼우고 비행기에 올랐다. 단촐한 구성이니 짐이 될것도 없고, 카메라 가방도 필요없었다. 어깨에 걸고있다가 마음에 드는 장면을 마주치면 그냥 찍으면 되는거였고 그렇게 필름 30통을 다 채우고서야 다시 한국에 돌아왔다.
근대 사진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앙리 브레송이 50mm표준 렌즈로만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물론 내가 그런 이유에서 렌즈를 하나만 들고간건 절대 아니었지만 그때는 부족함도, 불편함도 없었던것 같다. 표준화각이 괜히 표준 화각이 아니다. 사람의 눈이랑 가장 비슷하게 왜곡없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화각. 그게 바로 50mm다. (여담이지만 최근 디지털바디를 쓰면서 크롭바디인게 아쉬울때가 많다. 디지털바디에서도 수동렌즈를 즐겨 쓰는 편인데 좋아라하는 50mm 단렌즈들이 전부 75mm가 되어버리면서 좀 답답한 경우가 많아져 버렸다. 펜탁스에서도 풀프레임 바디가 출시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작년에 인도를 여행할때는 욕심이 조금 생겼었다. 그동안 나름 사진을 공부했답시고, 내 카메라는 전자식 셔터였던 ME-super 대신에 기계식 셔터를 쓰는 MX가 되어있고, 19-35mm 광각 줌렌즈를 하나 가방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결국 여행 이틀만에 필름 카메라는 고장이 나버렸고 필름 30통과 카메라와 렌즈들은 3일치 게스트하우스 방값을 들여서 다시 한국으로 포장해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오히려 카메라 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즐기며, 여행에서 사진이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며 시간을 보내곤 했었다.

이번엔 검은 대륙 아프리카다. 세렝게티가 너무 보고싶어 나는 탄자니아로 간다. 아프리카 여행에 관련된 카페 글들을 열심히 읽다보니 적어도 200mm 이상 망원렌즈 하나쯤은 있어야 세렝게티에서 쓸만하단다.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중고 매물을 기다렸다가 구할수도 있고, 핑계삼아 새 제품을 사도 된다.(마음같아서는 내친김에 DA☆ 200을 사고싶지만...) 하지만 나는 그냥 내 손에 제일 익숙하고 늘 쓰던 표준 줌 렌즈 하나만 달랑 들고가려 한다. 아, *ist D 대신에 k-x를 들고갈테니 밝은 단렌즈도 준비물에서 빼야겠다.
사진을 찍기 위해 여행을 하는가, 여행을 하기에 사진을 찍는가.
아무래도 나는 후자에 가까운것 같다. 아직은 여행도 사진도 초보지만, 훗날 뛰어난 여행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휼륭한 사진가는 못될 팔자인가보다. 놀라운 동물들 사진이야 돌아와서도 인터넷만 조금 뒤져보면 얼마든지 감상할 수 있을테니 그 몇장을 위해 거추장스러운 짐과 마음의 부담을 더하고 싶지는 않다. 초원 위 동물들의 표정, 몸짓은 마음에 담아두기로 하고 나는 나의 친구, 나의 동행들의 모습을 한국에서 늘 그랬듯 편안하게 담아내고 싶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며 다시 추억에 얼굴가득 웃음 지을 수 있기를 바랄 뿐.
사람이라는게 참 간사해서 무엇하나 놓치고 싶지도, 잃고 싶지도 않아한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면 비울수록 더 많이 보이는게 바로 여행이다. 누가 그랬던가, 여행의 짐의 무게는 속세에서의 번뇌의 무게와 같다고...
'여행 > '09 인도배낭'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르차 이야기, 인도의 지상낙원 아래 낚시와 수영을 즐기다 (8) | 2011.06.17 |
|---|---|
| 오르차 이야기, 간즈 빌리지에서 진짜 인도를 만나다 (12) | 2011.06.13 |
| 오르차 이야기, 인도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느끼는 여유...그리고 (12) | 2011.06.10 |
| 밀린 인도 여행기를 다시 시작하며... (8) | 2011.06.09 |
| 파테푸르 시크리, 무굴 제국이 남긴 찬란한 폐허에 앉아서 (6) | 2010.05.18 |
| 조금은 색다른 인도의 버스여행 문화? (16) | 2010.01.04 |
| 그림을 그릴줄만 알던 나, 인도 소녀에게 그림을 선물받다 (32) | 2009.12.23 |
| 인도 아이들은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할까? (18) | 2009.12.22 |
| 나는 두 발을 사진에 담아 여행을 기억한다 (18) | 2009.12.16 |
| 인도에서 온 편지, 행복을 주는 가게의 민수씨? (14) | 2009.12.09 |